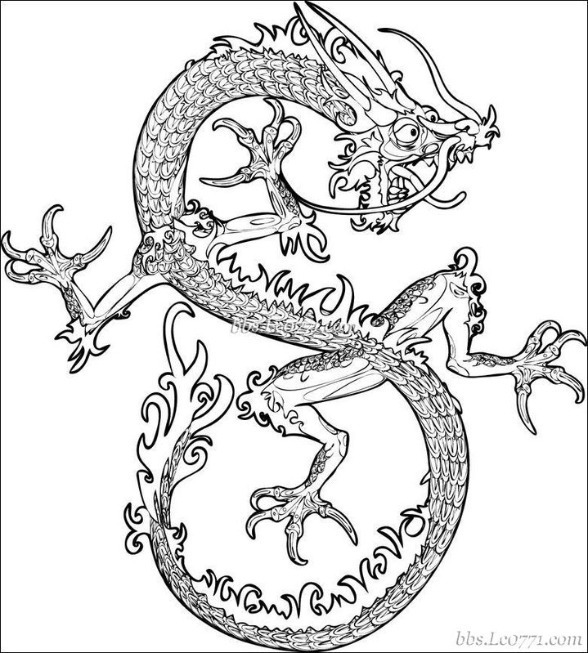
글: 고평(高平)
중국문화는 역대이래로 두 부분이 있다. 혹은 두 개의 갈래가 있다: 하나는 황실의 것인데, 그 내용과 성질은 멍청하고, 허위적이며, 위협적이고, 유혹적인 것이 많다; 다른 하나는 민간의 것인데, 진정과 선량과 지혜가 충만한 우수한 전통문화가 많다. 용(龍)문화도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용의 이미지는 과장되고, 상상적이고, 종합적이고, 허구적인 예술적 창조물이다. 바로 고대중국인들의 정신적 토템이자 지혜의 결정이다. 그들은 물고기의 비늘(鱗)을 이용하여 물속에서 노닐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사슴의 뿔(角)을 이용하여 땅 위를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매의 발톱(爪)을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용에게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리고 물속을 노닐 수 있는 재주를 부여해서, 전지전능의 신성(神性)을 가진 영물(靈物)이 된 것이다.
봉건황제들은 정신적으로 인민을 겁주고, 자신의 지고무상한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군권신수(君權神授, 임금의 권력은 신이 내린 것이다)"라는 수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기 위하여 "천자(天子)"라고 하는데,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질할 만한 전형적인 것을 찾지 못하자, 민간에서 창조한 용의 이미지를 도용하고, 뛰어한 화가들을 불러서 용의 조형을 완성한다. 이렇게 하여 용은 황제의 상징이 된다. 그리하여, 황제의 얼굴은 용안(龍顔), 황제의 걸음은 용행(龍行), 그들의 의자는 용의(龍椅), 그들의 가마는 용거(龍車), 그들의 의복은 용포(龍袍), 그들의 자녀를 용종(龍種)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원래 거짓용(假龍)이다. 그러다니, 용노ㅇ릇을 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래서 계속 자신이 "진용천자(眞龍天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저런 이유를 찾아냈다.
'황실의 용'은 시종 중국인의 머리 위에서 맴돌았다.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서 3천년간을 맴돌았다. 이 용은 황실과 그의 추종자, 후혜자, 앙모자로부터만 인정을 받았다. 즉, 그것은 상층이익집단의 정신적 지주였다. '황실의 용'은 중국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두렵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흉악하고 잔혹한 것이었다. 만일 경외(敬畏)라고 한다면, 외(畏, 두려움)가 경(敬, 공경함)보다 많았다. 어떤 외국인들은 무지에서인지, 편견에서인지, 오해에서인지, '황실의 용'이 중국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느낌을 갖게 한다. 사실, 진정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국인민자신의 용, 즉 '민간의 용'이다.
'민간의 용'은 완전히 다른 자태와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화민족의 용이다. 중화문화의 진짜용(眞龍)인 것이다. 광대한 보통인민의 마음 속에서 '민간의 용'은 황제의 상징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문화적인 내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품격과 이상추구를 대표하고 드러낸다. 내 생각에 민간의 용은 최소한 아래의 다섯가지 방면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정의(正義)를 대표한다. 주로 죄악을 징계한다. 악인과 요괴는 천둥번개(용의 목소리와 동작)를 맞는다. 민간전설에는 심지어 불효하거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이에 들어간다고 본다. 민간의 용이 악인에 대하여 무정한 부호는 바로 예리한 매의 발톱(鷹爪)이다.
제곤(濟困, 가난구제)를 대표한다. 하늘에 의지하여 밥을 먹던 농업사회에서 빗물이 충분해야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날씨가 가뭄이 들면, 먹을 곡식을 거둘 수 없다. 그러면 용에게 기원한다(祈雨). 그러면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린다. 그리하여 과거의 음력달력에는 용이 치수하는 것을 새겨두었다. 민간의 용은 마음이 선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는 바로 둥글고 방망이처럼 생긴 녹각(鹿角)이다.
건미(健美, 건강한 아름다움)를 대표한다. 민간의 용은 위무가 당당하고 건장하다. 풍운을 질타할 수 있다. 일련의 고사성어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어, 용양호보(龍驤虎步), 용반호거(龍盤虎距), 호소용음(虎嘯龍吟), 용비봉무(龍飛鳳舞)등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백과 정신풍모를 지니고 있다. 용의 몸이 실하고 유연한 것을 대표하는 부후는 바로 뱀과 같은 몸이다.
규율(規律)을 대표한다. 중국인은 역대이래로 규율을 중시했다. <<역경>>의 첫번째 괘인 <<건괘(乾卦)>>는 전체 편이 '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잠룡물용(潛龍勿用, 계절이나 시기가 되지 않았으니 함부로 움직이지말라)"에서 "항룡유회(亢龍有悔, 용이 극한까지 오르면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에서 "견군룡무수길(見群龍無首吉, 여러마리의 용이 함께 있지만 아무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다투지 않으니 위험하지 않다)"는 것까지, 용의 활동으로 사물의 발전규율을 설명하고 있다. 용의 규율을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부호는 바로 겨울에는 동면하고, 봄에는 일어나고, 여름에는 일하는 충성(蟲性)이다.
흥왕(興旺)을 대표한다. 흥왕의 첫번째 의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사람과 재물이 모두 왕성하다고 말할 때도 사람이 먼저이다. 사람이 있고나서야 비로소 재물이 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다자다손(多子多孫)이다. 그래서 용생구자(龍生九子)라고 한다. 중국인은 "구(九)"라는 숫자는 가장 많다는 것을 표시하는 숫자이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기본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송자기린-送子麒麟-도 있다. 나중에 중국은 인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인구가 세계제일이 되었는데, 이런 '문화'는 계속 승계해가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은 혈통상으로 스스로 염황자손(炎黃子孫)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스스로를 "용의 전인(龍的傳人)"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인이 용을 좋아하는 것은, 황제의 신민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들은 1년동안 용등(龍燈)을 가지고 놀고, 용벽(龍壁)을 그리며, 용선(龍船)을 젓고, 용주(龍舟)시합을 하며, 용풍쟁(龍風箏, 연)을 날린다. 용두괴장(龍頭拐杖), 용두이호(龍頭二胡)....내내 용을 가지고 놀아도 지칠 줄을 모르고 좋아한다.
중국황실의 용은 황제를 따라 가버렸다. 중국민간의 용은 진정한 중국용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민간의 용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더불어 세계의 동방에서 등비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인민과 함께 춤추고 함께 승리할 것이다.
출처 : https://shanghaicrab.tistory.com/16152473
용(龍)은 어떻게 신격화되었는가?
글: 종춘계(宗春啓)
용은 중국 원고(遠古)시대에 아주 신비한 것이었으나, 아직 신격화되지는 않았었다. 동한(東漢)때 사람이 쓴 <설문(說文)>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용은 어둡기도 하며 밝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춘분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추분에 못에 들어간다" 이때까지 용은 기껏해야 신인이 타는 것이었다. "전욱은 용을 타고 사해를 갔다". 한유의 글에서도 용은 구름을 뿜고 안개를 토하는 외에 신기할 것이 따로 없는 것이었다. 한유는 이렇게 의문을 나타낸다: 고대인들은 구름이 용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구름이 없으면 용은 날지를 못한다. 도대체 용이 대단한 것인가? 아니면 구름이 대단한 것인가? 나중에, 용은 강하호해(江河湖海)의 주재자가 된다. 심지어 청한우로(晴旱雨澇, 맑고 가물고, 비오고, 홍수나는 것)를 관장하기 시작하며, 중국농민들이 절을 하며 모시는 신이 된다. 이것은 진당(晋唐)이후의 일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진(晋)나라때 간보(干寶)가 쓴 <수신기(搜神記)>에서 이미 "농부가 용동(龍洞)에 기도하여 비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국의 한(漢)족은 여러 신을 숭배하는 민족이다. 자연숭배의 고대에 강,하,호,해는 자연히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때 숭배하는 것은 용왕이 아니었다. 해신(海神)은 "약(若)"이라 부르고, 하신(河神)은 "백(伯)"이라 부르고, 강신(江神)은 "기상(奇相)"이라 부르고, 호신(湖神)은 "상군(湘君)"이라 불렀다. 어쨌든 용왕이 아니었다. 중국고대에, 강하호해의 신은 기실 죽은 사람이 맡았다. 용이 언제부터 물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되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 진(晋)나라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물 속에는 용왕이 있다. 이는 불교의 <화엄경>에 나온다: 다시 무량제대용왕이 있고, 소위 비루박차용왕, 사갈라용왕, 운음묘동용왕...그 수가 무량하고, 열심히 힘쓰지 않는 것이 없으며,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서 여러 중생의 번뇌를 소멸시킨다." 이 경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용왕이 아주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왕의 직책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것(興雲布雨)"이라는 것이다. <화엄경>이 한자로 번역된 것은 제1차가 동진때이고, 제2차는 당나라때이다. 그래서, '용왕'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은 진당이후이다.
용왕,용궁의 신화에 관하여,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당나라이다. <태평어람>에 땨르면, 당나라때 사람인 양재언이 쓴 <양사공기>에서 동해용왕과 용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앙무제는 동해용왕의 딸을 만나는 데, 그녀는 진주를 관장했다. 양무제는 용녀에게 그녀가 가장 잘먹는 제비구이를 헌상하니, 용녀가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양무제에게 큰 진주를 많이 보내준다. 그 이후, <유의전서>의 이야기는 당나라때 이조위(李朝威)의 소설에 나온다. 서생 유의가 낙방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경수의 북안을 지날 때, 양을 치는 용녀를 만난다. 원래 그녀는 동정용군(洞庭龍君)의 막내딸이었고, 경하용왕(涇河龍王)의 아들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모욕을 받았다. 유의는 그녀를 위하여 동정용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동정용군의 동생인 전당용군(錢塘龍君)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경하로 간다. 그리고 경하용군의 아들을 먹어버린다. 그리고 용녀를 데리고 동정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용녀는 유의의 처가 된다. 이 이야기는 해방후에 월극으로 만들어져 은막에 올라간다.
당나라때의 문인은 용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낸다. 오랫동안 용녀숭배의 붐을 불러일으킨다. <영응전>, <심이기>, <박이지>등의 책에는 모두 용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시인 잠참(岑參)의 <용녀사>는 증명한다. 당나라 중후기, 사천에는 이미 용녀를 모시는 사묘(祠廟)가 있었다.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용녀하처래(龍女何處來)
내시승풍우(來時乘風雨)
사당청림하(祠堂靑林下)
완완여상어(宛宛如相語)
촉인경기사(蜀人竟祈思)
봉주잉격고(捧酒仍擊鼓)
출처 : https://shanghaicrab.tistory.com/16154093

용봉정상(龍鳳呈祥)
글: 중천비홍(中天飛鴻)
전해지는 바로는 자희릉(慈禧陵)의 월대망주(月臺望柱)에 한쌍한쌍의 '봉인룡(鳳引龍)'의 도안을 조각했다. 전체 조란(雕欄)에 모두 240마리의 봉(鳳)과 308마리의 용(龍)을 조각했다. 이같은 우의를 지닌 조각은 세상에 보기 드물고 감히 일절(一絶)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황실에서 나온 유일무이한 "일봉압양룡(一鳳壓兩龍)"의 조형은 전통적인 용과 봉이 나란히 두는 국면을 타파했고, 새롭고 독특한 '봉재상용재하(鳳在上龍在下)'도안을 드러낸다. 지고무상의 황권의 성별을 강조하는 것이 극치에 달했다. 다만, 서태후는 아무 큰 성별 착오를 일으켰다. 그녀는 '봉'이 숫놈 동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서태후의 착오는 그녀가 천년이래 전해져 내려온 "용봉정상"의 뜻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용봉정상"은 <공총자.기문>에 나온다: "천자포덕(天子布德), 장치태평(將致太平), 즉인봉귀룡선위지정상(則麟鳳龜龍先爲之呈祥)" 전통적인 우의로 말하자면 용은 물을 좋아하고(喜水), 날기를 좋아하며(好飛), 하늘에 통하고(通天), 잘 변화하며(善變), 영이(靈異), 정서(征瑞), 조화(兆禍), 위력을 보이는(示威)등 신성(神性)을 지니고 있다. 봉은 불을 좋아하고(喜火), 해를 향하며(向陽), 덕을 지니고(秉德), 상서로움을 나타내며(兆瑞), 숭고(崇高), 상결(尙潔), 아름다움을 보이고(示美), 정을 나타내는(喩情)등의 신성을 지니고 있다. 신성이 상호보완되고 대응되니 용과 봉을 함께 두면; 하나는 뭇 짐승들의 왕이고, 하나는 백가지 새의 왕이다. 하나는 변화하고 비등하는 영이이고, 하나는 고아하고 선미한 상서이다. 양자간에는 아름다운 상호협력관계를 건립하는 것이어서 '용봉정상'이 되는 것이다. '용봉정상'의 뜻은 상화지기(祥和之氣)를 나타낸다.
"용봉정상"의 내력은 더욱 신기하다. 전설에 따르면 우순(虞舜) 즉, 우(禹)임금이 즉위한 후, 널리 의견을 듣고 현명한 자들을 구해서 정무를 본다.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널리 교육을 보급하며 예의를 창도하고, 개선한다. 기(夔)를 악관(樂官)으로 임명하여, 곡을 만들고 악을 제정하게 했다. 3년후,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 기도 <구초(九招)라는 곡을 만들어 바친다. 우순은 크게 기뻐하며, 백관을 모아서 친히 연주한다. 구초를 연주할 때, 금룡채봉(金龍彩鳳)이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고 오는 것이 보였다. 일찌기 당요의 노신 창서(蒼舒)가 흥분하여 소리친다: 이것은 용봉정상이다. 용이 오면 비바람이 순조로워지고, 오곡이 풍성해지며, 봉이 오면 국가가 아정되고 만민에게 복을 내린다. 반고가 천지개벽할 이래로 용비봉무(龍飛鳳舞)는 역대이래로 소문이 있었다. 다만 용과 봉이 함께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다. 이를 보면, 용봉정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국가안녕, 만민유복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후세인들이 '용봉정상'을 남녀의 혼인문화에 끌어들인다. 남녀가 결혼할 때 '용봉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서 부창부수, 길상여의, 백년호합을 표시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극에 "용봉정상"이라는 극명이 있다. 오랫동안 불리지만 인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내용은 유비가 형주를 빌린 후 돌려주지 않자, 노숙이 여러번 달라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바로 이 때, 유비의 처인 감부인이 사망한다. 그래서 주유는 미인계를 쓰기로 하고, 거짓으로 손권의 여동생 손상향을 유비에게 처로 주기로 한다. 그렇게 유비를 동오로 와서 결혼하도록 부른다. 유비가 오면 다시 유비를 붙잡아 형주와 맞바꿀 생각이었다. 공명은 그 계책을 눈치채고 장계취계로 주유의 장인 교국노에게 손권이 모친 오태후에게 얘기하게 한다. 오태후는 감로사에서 유비를 보고, 아주 만족한다. 그래서 정말 유비를 사위로 맞이한다. 이렇게 하여 유비와 손상향은 화촉동방을 보내고 부부가 된다. 이 농가성진(弄假成眞)의 미인계에 관한 극은 사람들의 마음에 '용봉정상'이라는 뜻을 잘못 이해하도록 더욱 강화시킨다.
의문의 여지없이, "용봉정상"은 천년간 오인된 말이다. 봉은 처음에 초(楚)나라사람의 원시토템이다. 지진(至眞), 지선(至善), 지미(至美)의 상징이고, 사람의 영혼을 "비등구천(飛登九天), 주유팔극(周遊八極)"의 화신이다. 토템숭배로서, 봉은 원래 성별이 없는 것이다. 후인들은 봉을 황(凰)과 조합하여 '봉황'으로 부르며 자웅을 구분했다. 황은 암컷이고 봉은 수컷이 된다.
고대중국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동물은 주로 새(鳥), 용(龍), 견(犬), 호(虎)의 네종류이다. 조령(鳥靈)은 남방의 도작(稻作)문화를 대표한다, 용령(龍靈)은 북방초원의 유목문화를 대표한다. 견령(犬靈)은 산지의 순양(馴養)문화를 대표한다. 호령(虎靈)은 산지의 수렵문화를 대표한다. 사대동물령 중에서 특히 조령과 용령이 가장 두드러진다. 최종적으로 남북의 양대토템이 된다. 즉 소위 "용등봉저(龍騰鳳翥)"이다. 북방은 용을 받들고, 이를 용등이라 하고, 남방은 봉을 숭상하고 이를 봉저라고 한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남북의 양대토템인 '용봉정상'은 화하대지에서 나란히 유행했고, 일종의 상서의 기운을 나타낸다. 이것이 원래의 '용봉정상'의 본뜻이다.
고대 남방제국이 점차 쇠락하고 결국에 멸망하면서, 북방이 정치 및 문화의 중심이 된다. 용은 유아독존이 되고, 황권의 상징이 된다. 봉은 그저 용에 종속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극에서 용포를 입고 용상에 앉은 황제를 보고, 머리에 봉관을 쓴 황후를 보게 되는 것이다. 봉은 용의 부속이 되고, 점차 황후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리저리하여 여성의 대명사가 된다. 음양이 전도되고, 자웅이 불분명하게 수천년간 이어온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딸을 낳으면 이름을 '봉아(鳳兒)', '소봉(小鳳)'같은 아명을 붙이곤 한다. 고대명저 <홍루몽>에 나오는 가부의 사람중에 '봉저(鳳姐)'라고 불리는 왕희봉(王熙鳳)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보면 문학대가 조설근도 서태후와 같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https://shanghaicrab.tistory.com/16155310
용(龍)의 기원에 관한 몇가지 견해
용은 여러 동물의 특징을 같이 지니고 있다. 발도 있으면서 발톱도 있고, 뿔도 있으면서 비늘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으면서, 수염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의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기원을 논하기도 하여, 용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의 기원이 뱀이라는 견해.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문일다(聞一多)는 1940년대에 용의 원형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으며, 용의 몸통부분이 기본적으로 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소위 용이라는 것은 단지 큰 뱀에 불과하다. 이 큰 뱀의 이름을 용이라고 부른 것이다. 나중에는 이 큰 뱀을 토템으로 하는 족속이 다른 많은 족속을 흡수하고 합치면서, 형형색색의 다른 족의 토템들도 합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큰 뱀은 짐승의 발도 갖게 되고, 말의 머리를 갖게 되고, 꼬리도 갖게 되고, 사슴의 뿔도 갖게 되고, 개의 발톱도 갖게 되고, 물고기의 비늘과 수염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용이 되었다."
손작운(孫作雲)도 용을 연구했다. 그는 문일다의 관점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용은 뱀이 신비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의 원시사회에 중원지역에는 수중동물 또는 양서동물을 토템으로 하는 몇몇의 가까운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의 연맹을 결성하였고, 그 중에 가장 주요한 부족이 뱀을 토템으로 하는 씨족이었다. 그래서 뱀이 신비화되고 토템신물로 바뀌었는데 바로 용인 것이다. 그래서 뱀씨족이 바로 용씨족인 것이다"
유돈원(劉敦願)도 용의 최초의 형상은 뱀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의 학자들과는 또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는 "용은 중국고대 신화전설에서 자주 보이는 신물이다. 전설의 기원도 매우 빠르고, 전파도 매우 넓게 되어 있으며, 내용도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파행동물에 대한 윈시종교에서의 숭배가 연장되고 발전된 것일 뿐이다. 최초의 형상은 뱀이었고, 그가 대표하는 자연의 힘은 토지였다" "뿔이 달린 용은 바로 뱀인데, 뿔로서 그의 신이성을 표시하였다. 갑골문과 금문에 나타나는 용이라는 글자는 모두 이렇다"
대만학자인 원덕성(袁德星)도 용의 진상은 뱀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1978년에 쓴 논문에서 "종교상 문화에서 뱀이 바로 용이다. 뱀이 용으로 진급한 것은 완전히 문화행위로 인한 것이다"라고 썼다.
둘째, 뱀이 원형이 악어라는 설
중국고대사 전문가 위취현(衛聚賢)은 가장 먼저 용의 원형이 악어라는 설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1934년에 출판한 저작에서 "용은 악어이다"라고 썼다.
일부 외국학자들도 악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L. Hodous는 "용은 일종의 신화적인 것이며, 어떤 때에는 악어와 같다"고 하였다. E. 리치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용은 전갈, 도마뱀 형태의 어류"라고 보았다.
1980년대이후, 용의 원형이 악어라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났다. 왕명달(王明達)은 "용의 형상의 기조는 악어이다"라고 하였다.
주본유(周本維)는 1981년에 양가강의 악어를 연구할 때, 용과 양자강악어의 관계를 연구했고, 그는 양자강의 악어가 뿔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얼굴 모습도 용을 많이 닮았으며, 아마도 용은 양자강의 악어에서 나온 것일 거라고 보았다.
왕대유(王大有)는 용은 뱀에서 나오지 않았고, 악어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가장 원시적인 용은 만악(灣鰐), 양자악(揚子鰐)이다....갑골문, 금문에 나오는 상형자인 용과 뱀은 서로 명백히 다르다. 이로써 볼 때, 용과 뱀은 서로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상형글자를 가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카나다에 거주하는 고대사학자인 허진웅(許進雄) 역시 용의 원형은 악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는 "용의 특징은 얼굴부분이 크고 편평하지 않으며, 입이 작고 길다는 것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고 있는데, 악어외에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양자강의 악어는 천둥비가 내리기 전에 나타나며, 가을에는 숨어버리고, 봄에는 다시 나타나며 동면의 습관을 지니고 있다. 옛 사람들은 매번 양자악을 볼 때마다 천둥비가 내릴 것을 예견했고, 비가 내리면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이 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말했다.
셋째, 용의 원형에 대한 다른 주장
위의 두가지는 비교적 영향력이 큰 주장들인데, 이외에도 몇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다.
(1) 용의 골격의 기본형태는 뱀, 도마뱀, 말이라는 설.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성회(劉城淮)이다. 그는 용의 일부 주요한 특징은 뱀과 비슷한 외에, 도마뱀종류와 유사하고, 심지어 도마뱀류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용은 길다란 몸, 비늘, 알을 낳고, 동면하며, 물에서 생활하며, 동굴에 숨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은 뱀류에 비슷하지만 도마뱀에 더 비슷하다. 또한 도마뱀은 네 발을 지니고 있고, 모두 구부러진 발톱을 지니고 있는데, 용도 마찬가지이며, 뱀에는 없다. 뱀류와 용을 비교하면, 도마뱀이 용과 더욱 닮았다. 이외에 그는 또한 "뱀류와 도마뱀류외에 용의 또 하나의 주요 기본형태는 바로 말류이다" 만일 근원을 따져본다면 말류중에서 하마가 더욱 용의 최초의 모델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2) 용은 번개라는 설. 주천순(朱天順)은 용의 기원을 번개로 보았다. 그는 "용의 환상을 가지고 동물신으로 보게 된 계기나 시작은 아마도 옛 사람들이 용과 비슷한 동물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ㅣ려 하늘의 번개를 보고 생각해낸 것일 것이다. 그래서, 만일 번개를 기초로 그를 하나의 동물로 상상해서 그린다면, 아마도 길다랗고 다리가 네개 달린 동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3) 용은 구름이라는 설. 하신(何新)은 "구름, 및 구름과 비의 기능은 성관계를 의미하고, 이로서 용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는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최초의 용의 형상은 추상적인 나선형의 구름무늬였다. 나중에 점점 구체화되고, 생물화되었으며 현실생물계에 있는 양서류와 파충류동물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4) 용은 무지개라는 설. 호창건(胡昌健)은 "용의 원형은 봄날의 자연경관이다. 즉 하늘의 번개의 굽은 모습, 봄날에 잠을 깬 겨울벌레, 구부러져서 생명을 싹틔우는 초목, 삼월에 나타나는 비온후의 무지개. 그 중에 무지개는 용의 가장 직접적인 원형이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아름답고 가시화, 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5) 용은 나무신(樹神)이라는 설. 윤영방(尹榮方)은 "용은 나무신이다. 즉, 식물의 신이다. 용의 원형은 사계절의 "송" "백"류의 교목이다. "소나무는 용의 외부형상과 매우 닮아있을 뿐아니라, 용의 다른 특색도 소나무와 많이 닮아 있다"고 말한다.
(6) 용머리는 돼지머리에서 기원했다는 설. 손수도(孫守道)는 용의 기원은 원시사회이고, 용머리의 형상의 최초의 기원은 돼지머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용의 기원과 탄생은 원시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https://shanghaicrab.tistory.com/9344277
용(龍)과 드레곤(Dragon)
보통 중국의 용(龍)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drag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용적전인(龍的傳人, 용의 후예)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Descendants of the Dragon으로 번역하곤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용의 개념과 서방에서의 Dragon의 개념은 틀린 점이 많다. 몇가지 다른 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은 주로 상서롭고 길조를 상징하나, Dragon은 사악함의 상징이다.
둘째, 용은 날개가 없으나, Dragon은 거대한 박쥐와 비슷한 날개가 있다.
셋째, 용의 몸통은 뱀처럼 길지만, Dragon은 몸이 두껍다.
넷째, 용은 사람을 먹지 않으나, Dragon은 사람과 동물을 먹어치운다.
다섯째, 용의 색깔은 금황색이나 다른 색이지만, Dragon의 색깔은 주로 검은색이다.
서양에서 용은 사악함의 상징인데,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용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악마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도 한다. 런 점때문에 중국사람들 중에서는 용을 Dragon으로 번역하는데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고 다른 영어단어를 쓰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학자(대만학자 몽천상등)은 용에 대하여 Loong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저 Chinese Dragon이라고 쓰는 것이 낫겠다고 한다.
용의 병음발음은 Long인데, long을 영어로 발음하면 중국사람들이 듣기에는 용보다는 늑대(狼)의 발음에 비슷하고, 차라리 loong를 발음하면 중국의 용(龍)의 발음에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용에는 독안룡(獨眼龍, 눈이 하나 달린 용)과 눈이 두개인 용이 있는데, 중국의 용은 눈이 두 개달린 용이므로 loong의 가운데 두개의 o는 눈이 두개임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소룡(李小龍)이 영어로 이름을 적을 때 Lee Siu Loong으로 표기한 바 있고, 싱가포르의 총리인 이현룡(李顯龍)도 영어로 이름을 적을 때 Lee Hsien Loong으로 적고 있다. 그리고 발음에서도 길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용이 길다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사르 켄체 린포체님의 의식 영상과 귀한 가르침 (0) | 2025.04.05 |
|---|---|
| 대현공 애성수와 기문둔갑의 천봉구성 (0) | 2025.04.03 |
| 호조류 기문둔갑의 운용방식중 하나인 일월교합법(日月交合法) (0) | 2025.03.29 |
| 구루 린포체(파드마삼바바) 관정식 by 드리쿵 까규의 갈첸 린포체님 (0) | 2025.03.28 |
| 현공대괘 64괘 24산 분금 명기(分金 命忌) (0) | 2025.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