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희이 선생 일대기(陳希夷 先生 一代記)
|
예서원 간략해설 : 대학관상 서적의 부록에 수록된 진희이 선생 일대기입니다. 역학, 역술을 공부하면서 한번쯤 정독해봐야할 내용이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특히 제게 자미두수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넓게는 하늘과 땅을 硏究하고 높고 밝음은 古今을 꿰뚫더라 !
道는 책과 밖에 있고 모든 성인의 마음을 배우더라.
하늘과 땅이 합쳐진 높은 곳에 누워 새로운 세상의 운세(運勢)를 미리 알더라.
玄妙한 일을 논하지 않으니 만년의 젊음을 절로 알더라.
1. 화산의 만고에 드문 초인
진희이 선생의 이름은 박(搏)이고 자(字)는 도남(圖南)으로 안휘성(安徽省) 박주( 州) 진원(眞源)사람이었다. 송나라 열전(列傳)이 있긴 하지만 자세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이분은 한 평생 경사(經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문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易學에 정통하고 깊은 조예를 쌓은 바 복희씨(伏羲氏)가 괘(卦)를 그려낸 이래로 선천역학(先天易學)의 창시자(創始者)이며 세상에서 진박역학(陳搏易學)이란 그 상수학(象數學)은 소요부(邵堯夫)에 이르러 크게 빛난 바가 크다.
선천역학(先天易學)의 좋기는 이 한 가닥에 지나지 않는데 세상에서 대합천(大合天)이란 공부법도 이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진결(眞訣)은 이미 실전(失傳)되었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가짜인 것이다.
선생은 또한 선천무극도(先天無極圖)와 태극도(太極圖)도 전했는데 현문(玄門)에서는 진박도학 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대로 전해지다가 주렴계에 이르러 유학(儒學)에 인용되어서는 송나라 명리학(命理學)의 효시가 되었다.
선생의 인품과 기골 그리고 서법(書法)은 더욱 천고에 걸쳐 으뜸이었다.
선생의 발자취는 천하의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두루 남겨졌고, 처음에는 무당산(武當山)에 은거하셨다가 나중에 화산(華山)으로 옮겨 은둔 생활을 보내셨다.
화산에서는 남긴 일화도 가장 많거니와 가장 오래 머물렀으며, 또한 마지막 우화(羽化)한 곳도 화산이라 화산처사(華山處士)로 불려지기도 했다. 더욱이 남송(南宋)의 현진자(玄眞子)는 화산만고일초인(華山萬古一超人)이라 칭송하였다.
선생의 한 평생 행적을 더듬어 보면 그 학문이나 수양에 쌓은 지극한 조예가 玄妙하다고 논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진자는 현천비요(玄天秘要)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희이(希夷)선생의 학문은 유학에서 도학으로 전환한 후에 더욱 넓고 깊어졌으며 멀리 앞일을 내다보는 등 현묘하기 이를 데 없다."
老子의 하상공(河上公) 일맥(一脈)에서는 전수되지 않는 비결(秘訣)을 홀로 취득했다.
거기다가 단가(丹家)와 위백양(魏伯陽)의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서 따로히 전수되는 학문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이고도 오묘한 이치(理致)를 창제하는 등의 능력은 결코 주자(朱子)따위나 여느 단가(丹家)에 비할 수가 없다.
주역(周易)에 정통(正統)하고 유학(儒學)을 도학(道學)에 융화시키는 등 백가(百家)의 학문을 하나로 포괄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고 매끄러우면서 적절했다. 상(象)밖으로 놓여지지 않고 또한 상 안으로 구애를 받지 않음으로써 초연하고 자유로우며 형체에서 해탈(解脫)하여 범속하지 않기에 세상 밖에서 유유자적 할 수 있는 것이다.
故로 이 분은 하늘을 이고 땅 위에 우뚝 솟을 수 있으며 이 분의 도(道)는 과거에서 미래로 면면히 이어지리라! 지키는 바가 크고 보는 바가 멀어 하는 일이 드높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뻗쳐 날 수 있으며 오행(五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며, 인간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우뚝 서서 홀로 행하는 은사(隱士)이다. 희이 선생은 도가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 가장 전기(傳奇)적인 색채가 많은 인물의 하나이다.
기우가 헌앙하면서도 청수한 풍모에 한 평생 꾸밈없이 사람을 대했으며 언제나 소박한 가운데 찬연한 빛이 나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점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선생의 성품은 담백하면서도 순수하여 작위를 가볍게 여기고 명리를 바라지 않았으며 천자나 왕후장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높다랗게 화산 위에 누워서 세상일에 초연했으며 한사코 산야에 묻혀 떠도는 구름처럼 자유스런 삶을 누리니 마음은 청풍명월 같고 정처가 없는 몸이라서 어디서든 터득하는 바가 있고, 어디서든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가 있었다.
선생이 자명(自冥)이라고 한 바와 똑같다.
이는 진리이다. 만대(萬代)에 걸쳐 선인을 기다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다.
사람이 부귀공명이나 요절 또는 장수에 느낌이 없다면 조용하니 한 가닥 잡념도 없을 것이고 티끌 하나 묻지 않을 것이라 마음속에는 자연히 다른 천지(天地)가 있을 것이고 속됨에서 초월 할 수 있으니 절로 자유로워 질 것이다.
마음속에 별천지가 있으면 충분히 별천지에서, 따로히 세상이 있으면 충분히 바깥 세상에서 홀로 우주적인 정신과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生死는 내 스스로 통하고 天地는 내 스스로 만들고 내 명(命)은 내 스스로 세우며 세상과는 내 스스로 초연해져야 한다"
이 말씀에는 무한한 철리(哲理)와 현기(玄機)를 담고 있어서 결코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가에서는 장수와 요절을 바로잡고, 생사를 통하게 하고 나를 하나의 사물로 보며 천명을 이겨서 세상을 초월하여 천지밖에 있는 것을 중시하였다.
선생이 갈고 닦은 오묘한 도는 그 스스로 말했듯이 그 가운데로 곧장 파고들었기 때문에 박대고명하고 견줄 수 없는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화산의 구실암(九室巖)에 남긴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볼 수가 있다.
"해와 달은 두 화덕의 불이고 天地는 하나의 구멍이더라"
"팔괘의 아궁이에는 해와 달을 삷고 음양의 솥에서는 산천이 삶어지네"
"단(丹)은 천지밖에 있고 도는 비어 있는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와 같은 유명한 구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하나같이 청신하며 읊으면 속세의 먼지가 씻겨지는 느낌이 들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늘을 여는 언덕의 말이오, 기이하고도 빼어난 사람들 가운데용이로다."하는 유명한 대련 역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마음속에 따로히 천지가 있는 사람은 작고 가까운 곳에서 착안하지 않고 천지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서 도(道)만 쫓으며 홀로 그 뜻을 행하게 된다.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속됨에 따라 부침 하지 않는다.
뭇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 홀로 천하게 여기고 뭇 사람들이 쫓는 것을 나 홀로 버린다. 이는 하늘가의 말처럼 구름 속의 용처럼 이 천지 사이에서 한 격을 독광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은 가득승(賈得昇)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요순우탕(堯舜禹湯)에게 그들의 천지가 있고 소부(巢父) 허유(許由)에게 그의 천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시황과 한무제에게 그들의 천지가 있고 적송(赤松) 왕교(王喬)에게는 그의 천지가 있다. 다만 부귀공명 가운데서 행하는 바는 기척도 없이 행하는 바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모든 것을 하나로 나눌 때 만 가지의 다른 것이 모두 똑 같으며 길고 짧은 것이나 감추어지고 드러난 것들 가운데 같지 않은 것이 없으니 成敗도 없고 得失도 없다. 따라서 저쪽을 버리고 이 쪽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이태백이 詩에서 말하는 바와 같다.
"화사한 머리칼이 가을을 견디지 못해 하나 하나 시들어 푸석푸석해지고 古來로 성현들 가운데 그 누가 일일이 성공했는가! 군자는 잔나비와 학으로 변하고 소인은 별 벌레로 변하니 기러기처럼 구름을 타는 광성자(廣成子)를 따를 수 없더라."
이는 광성자나 신선의 천지를 왕후장상의 천지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선생의 위인 됨은 또한 광성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 이태백은 다른 시인 회선가(懷仙歌)에서 천고 이래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와 바램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을 代表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한 마리 학이 동쪽 푸른 바다를 날아 건너나 산만해진 마음으로 어디에 있는 줄 알겠는가!신선이 크게 노래 부르며 날 보러 오니 마땅히 옥나무에 기어올라 오래 기다릴지어다. 요순의 일은 충분히 놀라운 일이 못되고 자기들끼리 떠들썩하니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더라. 커다란 나무는 삼산(三山)을 지고 가지 말지니 내가 봉래산 꼭대기로 오르고자 하노라.]
요순의 일이 놀라울 바가 못되면 진시황이나 한무제의 일은 더 논할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선생은 어느 날 가득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공명이나 이익에 얽매이거나 생로병사에 꼼짝 못해서는 안된다. 천지 밖으로 뻗쳐 나 태허(太虛)와 하나가 되어야 무극의 참 경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선생은 화산에서 가진 것이 없었기에 일시에 이름이 알려져 천고의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었고 또한 천지 밖으로 뻗쳐 날 수 있었다. 희이는 화산만고일초인(華山萬古一超人)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으나 사실은 화산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출생지는 박주인데 북주(北周)때는 초군( 郡)에 속했었다. 송나라 때에는 박주초군이라 했고 청나라 때에는 안휘성(安徽省) 영주부(穎州府)에 속했으며 부양현(阜陽縣) 서북쪽에 위치했다. 그러다가 민국(民國)이 되어서야 박주가 박현으로 바꾸어졌다.
민풍은 순박하고 강직한 편으로 꾀를 부리지 않았으며 성격들은 중후하여 거짓이 없었다. 무릇 선생이 찾아간 다른 곳의 사람일지라도 대체로 그런 편인데 이 또한 선생의 기풍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희이의 출생 년월은 고증할 길이 없다.
송나라 역사의 진박 열전과 역세진선체도통감(歷世眞仙體道通鑑) 그리고 기타의 역사책 전기에서도 하나같이 기록이 없는데 다만 시화총귀(詩話總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은 당나라 덕종(德宗)때에 태어났으며 희종(僖宗)때에 이르러 청허처사(靑虛處士)에 봉해졌다" 명도은일전(明道隱逸傳)에서는 겨우 다음과 같은 한 마디가 있을 뿐이다.
"진박은 당나라 이씨가 제왕일 때 태어났다"
사원(辭源)에서도 마찬가지로 열거한 바가 없다. 그런데 그가 한 일들이 대부분 송나라 때에 행해진 것을 볼 때 중간에 梁唐晉漢周 오대(五代)를 겪은 것 같다. 시간상으로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니 오직 남겨두었다가 고증을 할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도가의 인물들 가운데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 나이가 백세 혹은 이백여 세가 되는 사람은 어디서든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었다. 무릇 도가의 사람들은 평소 양성(養性) 양수(養壽)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역사에서 "양성하여 수를 더 누렸다"는 노자(老子)에 관해서 사마천은 "노자는 백육십여세이거나 또는 이백여 세가 된 것은 도를 닦고 양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전기에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당 덕종 때에 태어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송나라 태종 때까지 수를 누렸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당나라 덕종은 서기 780년에 즉위하여 25년간 재위했으며 바로 서기 804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선생이 송 태종을 배알하게 되었을 때가 태평흥국(太平興國)년간으로 서기 976년에서 977까지였다. 만약에 덕종의 만년에 태어났다면 197세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도가 단종(丹宗)의 사람이나 노자가 어쩌면 2백여 세가 된다고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실로 많은 것이라 할 수 없었다.
2. 놀라운 출현
희이 선생의 출생 년월은 고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다. 당나라와 오대의 사전(史傳) 그리고 송나라 역사의 진박 열전에도 똑같이 기록이 없다.
군담채여록(群談採餘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진도남의 출생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어부가 그물로 자색 옷에 싸이고 고깃덩어리에 공같은 모양의 큼지막한 깃을 끌어올리게 되어 집으로 가져가 솥 안에 넣고 삶아 먹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집안에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부는 깜짝 놀라 그 물건을 꺼내 땅바닥에 내동댕이치자 옷이 갈라지면서 이이가 나타나매 어부의 성인 진씨로 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혼돈을 깨뜨리고 경천 동지의 소리를 내며 나타난 것이니 출생부터 여느 사람과 달랐던 것이다. 그 후 고금을 진동시키고 유일무이한 인물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다 현진자(玄眞子)는 다음과 같이 칭송한 바가 있다.
'올적에 모습을 감추고 세상에 살면서 이름을 감추니 살아서는 숨겨진 성인이고 죽어서는 숨겨진 신이더라.'
이와 같은 칭송은 선생에게 과한 것은 아니다.
둥근 고깃덩어리라는 것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대의 성승(聖僧)인 허운(虛雲)대사만 하더라도 태어날 때 둥근 고깃덩어리라서 그 어머니가 놀라 눈을 감은 바가 있다. 이는 그가 스스로 기술한 연보(年譜)에서 볼 수 있으니 결코 허구가
아닐 것이다. 체도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진박은 태어나서 말을 하지 못했는데 너댓살이 되어 와수(渦水)가에서 놀고 있을 때 한 청의의 노파가 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자 그제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총명하기 이를 데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경사(經史)를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다.
태어나서 말을 못했다는 한 마디는 명나라의 洪自誠이 저술한 선불기종(仙佛奇踪)에 '갓 태어나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한 마디가 있을 뿐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옥호청(玉壺淸)은 이 일에 살짝 비친 적이 있다. "진박이 너댓살이 되어 와수 가에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한 청의의 노파가 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너로 하여금 다른 기호(嗜好)없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마, 고 하였다"
그 후 그는 하나를 배워 백가지를 깨우치고 한 번 읽으면 잊지 않는 등 여느 사람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니 이와 같은 일화는 결코 허구가 아닐 것이다.
송나라 역사의 진박열전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댓살이 되어 와수가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을 때 한 청의 노파가 그에게 젖을 먹였다. 그런 후에 날로 총명해져 경사와 백가(百家)의 말씀을 읽었고 한 번 보면 외울 수 있었으며 잊어 먹는 법이 없었다."
이와 같이 태어나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두 권의 책에서만 볼 수 있는데 청의의 노파가 젖을 먹인 이후 총기가 크게 뛰어나게 되었다는 사연은 여러 책이 똑 같았다.
왕양명(王陽明)의 전기를 보면 양명이 태어났을 무렵에 운(雲)이라 불렀는데 다섯 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승(異僧)이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고 수인(守仁)이라 이름을 바꾸자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전기성의 인물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와수는 와하(渦河)라고도 불렀다. 옛날에 흐름이 일정치 않은데다가 나중에 고갈되어 제대로 고증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부구현(扶溝縣)에 아직도 한 가닥 자취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오늘의 와하는 수원(水源)을 통허현(通許縣)에 두고 있는데 기현(杞縣) 태강(太康) 녹읍(鹿邑)을 지나 박현에 이르고 다시 과양(過陽)을 지나 회수(淮水)로 들어서게 된다.
희이는 박주 진량(眞諒)사람이다. 따라서 와수 가에서 놀았다 함은 바로 박주를 지나간 와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서술한 향리와 일화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희이는 어릴 적에 처음 유학을 공부했으며 읽지 않은 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사와 제자백가의 말씀에 정통했다. 아니 터득한 바가 깊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취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거기다가 슬기롭고 재주가 절세적이라 일찍부터 천하를 깨끗하게 할 큰 뜻을 품고 과거를 봐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소씨견문록(邵氏見聞錄)에서는 선생을「당나라 장흥(長興)년간에 진사가 되어 사방을 유람하다가 큰 뜻을 품고 무당산에 은거했는데 시에서 훗날 남쪽으로 가면 이 산 이름을 기억할지어다.」라고 하였다고 했는데 도남(圖南)이란 이름은 바로 그런 뜻에서 취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송나라 열전에 기록된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후당(後唐) 중흥 년간에 진사의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하자 벼슬길을 쫒지않고 산천 구경을 즐겼다 그는 손군방(孫君 )과 녹피처사(鹿皮處士)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 두 사람은 고상한 사람인데 진박에게『무당산의 구실암(九室巖)에서는 은거 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진박은 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산천의 정기를 들여 마시느라고 20년간 곡식을 입에 넣지 않았으나 매일 몇 잔의 술을 마셨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원일서(類苑一書)에서 증명하고 있다. 즉 '과거를 보아 진사가 되고자 했으나 낙방하여 무당산에 은거하고 곡식을 입에 넣지 않으면서 기(氣)를 수련했다,' 고 하는 말과 부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과거에 낙방하여 이인의 가르침을 받아 무당산에 은거하여 조용히 현묘한 도를 갈고 닦았다는 것이 비교적 믿을 만 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유학에서 도학으로 전환의 시작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쯤 되자 "봉래산의 불로초만 구하려 할 뿐으로 어찌 봄철의 농사를 생각하겠는가" 하는 심사가 크게 일었다.
희이는 본성이 담백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과거에 낙방을 한데다가 부친상까지 당하게 되었다. 때마침 소군방과 녹피처사를 만나 서로 역리와 노자 및 장자(莊子)에 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레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결과『마음이 천지 밖으로 떠돌고 오행 가운데서 벗어나야 겠다』는 마음이 굴뚝처럼 일었다 (선적총귀에서 인용)
그런가 하면 홍자성 선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생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운데 부친상을 당하게 되자 감회에 젖어 말했다.『배우는 것은 그저 자기 이름이나 충분히 쓸 줄을 알고 공명을 얻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천하의 사람들보다 귀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 멀리 무당산 꼭대기에 올라 안기(安期)와 황석(黃石)과 같은 인물과 은세법(隱世法)을 논하며 허무도(虛無道)를 닦고 왕교(王喬)와 백양(白陽)등과는 장생법을 논하고 죽지 않는 즐거움을 거두고자 한다. 어찌 세속적인 도배들과 썩어 문드러져 생사윤회 사이를 오락가락 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집안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겨우 하나의 돌솥만 가지고 떠나갔다.
양나라나 당나라의 사대부들이 그의 청고함에 이끌려 그를 신주처럼 받들며 서로 모시고자 했다.그러나 선생은 그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아직도 자기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지 못한 탓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산을 내려가는 일이 없이 뜻을 세워 수도에만 전념하고 다년간 증도(證道)에만 힘썼다,"
홍선생의 이와 같은 기록은 역세진선, 체도통감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가 무당산에 올라 도를 닦게 된 것은 부친상을 당한 우울함과 그의 타고난 성격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고 진사의 과거에 낙방한 사실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조그만 일인 것이다.
무당산은 태화산(太和山)이라고도 하며 대파산맥(大巴山脈)에 속한다. 위치는 호북성 균현(均縣) 남쪽이고 모두 27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봉우리를 천주봉(天柱峯) 또는 자소봉(紫 峯)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맞닿았다고 해서 금정(金頂)이라고도 한다. 그야말로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가의 성지였다.
산에는 일천문(一天門), 이천문, 삼천문, 그리고 동천문 및 서천문이 있다. 전각으로는 남암(南巖)과 조천(朝天)이라는 이궁(二宮)이 가장 유명한데 서로 이쪽과 저쪽 봉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형국에 금실이 찬연하여 멀리서 볼 때 안개와 구름이 감실거려 마치 신기루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현제전(玄帝殿)은 금전(金殿)이라고도 하는 데 대들보나 기둥 등을 구리로 주조를 하고 도금을 하여 그 찬란한 황금빛에 눈이 부실 지경이다. 그 외에 회선루(會仙樓) 인위관(仁威觀) 자소궁(紫 宮) 등도 하나같이 볼만하다. 그리고 왕자교(王子喬) 음장생(陰長生) 여순양(呂純陽) 장삼봉(張三峰) 주전 등의 유적이 있는데 옛날 진무(眞武)는 이 곳에서 수도를 했다.
또한 명나라 영락(永樂)년간에 진무를 황제로 모셨기 때문에 또 태악(泰嶽)과 현악(玄嶽)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중국의 권술로 해외까지 이름이 잘 알려진 무당파는 바로 동현진인(洞玄眞人) 장삼봉이 이 산에서 세웠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다. 무당의 권법은 내가권(內家拳)에 속하며 입도(入道)에 도움이 큰 권법이기도 하다.
희이는 무당산에 20년간 머물면서 위백양(魏伯陽)의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래서 그의 모음 집(集)에 참동계를 바로 이 산 속에서 조금 터득했노라, 하는 말을 남겼다.
또 나이가 많은 복희씨(伏羲氏)가 장수를 한 것이 아니고 남화(南華)에 대한 깨달음도 역시 수수께끼로다.' 하는 유명한 한 마디를 남겼다. 이는 또한 여동빈(呂洞賓)에게 한 말이기도 한데 20년이란 세월은 결코 허송한 것이 아니었다.
희이는 무당산에서 현문비요(玄門秘要)라는 책을 지었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나의 이 현문(玄門)은 문이 없음이 도문(道門)이고 현묘함이 지도(至道)이고 갈고 닦지 않음이 대수(大修)이며, 비밀이 없음이 지비(至秘)로다. 대도(大道)의 요체는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버리는데 있고 도덕을 존귀하게 여기며 초범입성(超凡入聖)을 시발과 기초로 한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도(僊道)는 인도(人道)를 기점으로 하고 성도(聖道)를 중정(中程)으로 한다. 크게 변화하는 것을 성(聖)이라 하고 거룩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하고 영검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선(僊)이라 하며, 선은 해와 달과 같은 빛이면서 천지와 함께 흐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또 허정도인(虛靜道人)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道)는 도 일수 없으며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닌데 이는 노자의 뜻이로다. 도는 전수할 수 없으며 전수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닌데 이는 장자의 취지로다. 노자는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되 도는 자연을 본 받느니라' 하고 말했다.
이 네 구절에 다섯 층으로 깊이 파고드는 공부가 바로 현문의 다시없는 비결이니라."
故로 가덕승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께서 평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대체로 '자연에 맡기고 닦음도 행함도 없는 것'을 첫 번째 진리로 삼았고 철두철미하게 '사람이 되려면 성인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을 도입 방법으로 삼아서 '마음과 성품을 완전히 갈고 닦아 의(意)와 염(念)을 비우는 것'을 다시없는 요령으로 삼았죠."
이로써 희이 선생의 가장 평범하고 실질적인 일면을 볼 수 있고 그 가장 평범하고 실질적인 일면이 또한 가장 위대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산(岷山)을 수차 왕래하다.
선생은 무당산에 은거했을 처음부터 사람들을 물리치고 방외(方外)에서 마음을 갈고 닦으매 속된 기운이 깡그리 사라지고 날로 신선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서 종종 천주봉과 구실암을 왕래하시니 선풍도골의 그 모습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조담집(釣談集)에 있는 '무당산 꼭대기는 붉은 해와 가깝고 건곤이란 솥 안에 구중천(九重天)이 있더라' 하는 유명한 구절은 아직도 현문에 몸답고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읊고 있다. 그 현묘한 취지는 도가에 몸담아 본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선생이 무당산에 은거하여 도를 닦으면서 영검스럽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여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멀리까지 퍼지게 된 끝에 후당(後唐)의 명종(明宗)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무당수은기(武當搜隱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희이 선생이 입산 한지 얼마 후 후당 명종이 그 이름을 듣고 손수 글을 내려 불렀다. 명종 앞에 나타난 선생은 읍(揖)만 했을 뿐 큰절을 하지 않았으나 명종의 물음에 고견을 피력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성찰토록 했다.
따라서 명종은 더욱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으며 청허처사라는 호를 내리고 궁녀 세 명을 주어 그를 수발토록 하려고 했다. 선생은 완곡하게 사양하고 무당산 구실암으로 되돌아가 조용히 홀로 도를 갈고 닦으며 등여 마시데 곡기를 끊고 음양을 수련하였다.
전후에 걸쳐 무릇 20여년 동안 그는 하루에 몇 잔의 술만 마셨을 뿐이었다.
선생의 지현편(指玄篇) 81장, 입실환단시(入室還丹詩) 50수, 현문비요 그리고 조담집은 바로 구실암에서 완성되었다.
'그가 산에서 정기를 들여 마시며 곡기를 끊었다' 나 '하루에 몇 잔의 술을 마셨을 뿐이다' 라는 점은 송나라 열전에 실린 바와 같다.다만 체도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무당산에 은거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편찬을 한 조도일(趙道一)이 간과(看過)한 것은 후당의 명종이 부른 것은 입산한 초기라는 점과 작별을 고한 후 여전히 무당산으로 돌아가 은거했기에 돈귀무당산이라는 글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은기와 조담집의 후기에서 서술하는 바도 같으니 비교적 믿음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체도통감에는 폐하에게 사의를 표하는 글월도 실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趙)나라의 유명한 미녀들이자 한(漢)나라 자손인 정숙한 그녀들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라 행동거지도 아름다우니 깊은 궁궐로 들어 갔으면 오랫동안 누려야 할 터인데 그만 어제는 하늘에 살다가 오늘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은 감히 사가(私家)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삼가 별관에다 안치해 두었습니다. 신은 성품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부평초나 닻이 없는 배처럼 구름 따라 흘러 다니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을 다시 궁궐로 되돌려 보내며 아울러 한 수의 시(詩)를 올리나니 굽어 살피시옵소서.
'살결은 눈 처럼 희고 뺨은 옥과 같으니 보내 주신 군왕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사는 무협(巫峽)의 꿈을 꾸지 않으니 구름이 배 되어 양대(陽臺)위에 떨어질까 걱정스럽소이다.'
궁에서 나온 칙사에게 상주문을 올린 이후 그는 즉시 은둔을 해 버렸다. 구절에 가식이 없고 문장이 쉬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한 마음이 절로 사라지고 음란한 마음이 꺼지도록 만들었다.
희이 선생은 밤낮으로 반드시 술을 마셔야 하나 언제나 양껏 마시지 않고 매번 겨우 몇 잔에 지나지 않으며 많아 보았자 열 몇 잔에 불과했다. 결코 취기가 들거나 하지 않고 약간 거나해지다 싶으면 그만 마셨다. 술잔도 금이나 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대체로 반도(蟠桃)의 씨를 조각해서 만든 것인데 지극히 정교하고 멋이 있었으며 오래 묵은 것일수록 명귀하여 구하기가 어려웠다.
선생 자신이 사용하는 잔에는 천년 묵은 반도의 씨에 만고의 술 한잔이란 뜻의 천재반도핵(千載蟠桃核) 만고주일배(萬古酒一杯)라는 열 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무당수은기에서 볼 수 있으며 후촉기사(後蜀記事)가 뒤받쳐 주고 있어서 이런 조그만 일도 거짓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후촉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맹창시(孟昶時)의 하인인 유조(劉祚)가 반도의 씨로 만든 술잔을 바치며 진박에게 얻었다고 말했다."
후촉은 오대(五代)때 10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 시조인 맹지상(孟知祥)은 후당 장종(莊宗)때 검남서천절도사(劍南西川節度使)로 있었고 명종(明宗)때 촉왕(蜀王)에 봉해졌다가 민제(閔帝)시에 국호를 촉이라 했는데 역사에서는 후촉이라 부르는 것이다. 지상이 죽자 아들 맹찬이 뒤를 이었으나 나중에 송태조에게 합병되고 말았다.
수은기에서는 선생이 청성(靑城)과 아미(峨嵋)산 그리고 동정호 및 남악등의 곳을 유람했다고 했는데 그런 말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노학암필(老學庵筆)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주( 州) 천경석(天慶石)에 희이의 시가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나는 뜬구름이 진정 허깨비이고 술을 깨어서 고삐를 던지고 고공(高公)을 배알하였느니 원래 남 모르는 진리의 논함을 듣고자 했으나 깨고 보니 속세의 헛된 꿈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끝에 태세(太歲) 정유(丁酉)라 되어 있는데 이는 맹찬의 시대였다."
글월과 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도위의(都威議) 하창일(河昌一)의 관점이다. 희이가 쇄비술(鎖鼻術)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공을 배알하였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관현(灌縣) 청성산(靑城山)에서도 희이의 선적(仙跡)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천사동(天師洞)에 갈무리된 청성비록(靑城秘錄)에서 적지 않은 어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말들은 도사 왕포일(王抱一)이 말한 것을 예로써 들 수 있다.
"문을 닫아걸고 틀어박혀 말과 생각을 끊고 포원수일(抱元守一)에 신기상합(神氣相合)이 도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힘드는 공부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팔장을 낀 채 말없이 생각이나 의욕을 떨쳐 버리고 지극히 마음을 버리고, 깊은 정적 속에 빠져들면 마음과 호흡은 서로 의지하고 신기(神氣)가 서로 주입되어 금수(金水)가 상생(相生)하고 천지가 서로 합쳐질 것이다. 이는 대도를 현묘하게 갈고 닦은 여덟 가지의 조목(條目)이니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모두 여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이다. 또한 그는 천팽궐(天彭闕)에서 도를 묻는 세심자(洗心子)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온 종일 맨숭맨숭 그저 마음을 안으로 가다듬고 밖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상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며 기(氣)를 사납게 하지 말 것은 물론 신(神)을 흩트려서는 안된다. 마음을 씻고 갈무리하여 조용히 그 하나를 지키면서 암암리에 무(無)로 들어서면 마음은 절로 조용하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조용하니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져 영검하면서, 어둡지 않으면 신명(神明)이 절로 생겨나고, 신명이 절로 생겨나면 이윽고 통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고, 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거침없이 신이 통하게 되면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일이 없고, 맑아지지 않는 도리가 없으며,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꿰뚫어 보지 못하는 뜻이 없는 등 묘용이 무궁해질 것이다."
천팽궐은 팽문(彭門)이라고도 하는데 관현의 관구산(灌口山) 서쪽 영마루에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마주 보고 서 있는 두 바위가 궁궐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것이고 , 선생이 한 평생 종종 선견지명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수양에서 얻어진 것일까. 아니면 바로 그런 점에서 비롯된 것일까?
쇄비술에 관해서 청성비록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다만 무당산 도사로부터 쇄심술(鎖心術)을 배운 적이 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현문(玄門)에서는 폐심술(閉心術)이라는 요결이 있는데 이를 정심술(定心術), 정신술(定神術)이라고도 한다.
장자의 우태정(宇泰定)을 갈고 닦는 사람이 꾸준하다면 그와 같은 대정(大定)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한 사람이 갈고 닦아 우태정의 경지로 들어서게 된다면 선종(禪宗)가운데 선정(禪定)에 도달한 사람이라도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도가나 불문에서 종종 '않은 채 벗어나고 선 채로 죽는 것은 흔한 일이다' 라고 들 하는데 가장 높은 정(定)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언제나 생사를 개의치 않으며 마음대로 넘나드는 법이었다. 선생도 세상에서는 장수선옹(長壽仙翁)이라고 일컬어졌으며 한 번 잠이 들면 몇 달이나 일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 도법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요결로 갈고 닦은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도가 선천도(先天道)의 역사적 사상의 줄기는 선천역학(先天易學)에서 전해 온 것이고 한 가닥으로만 이어져 왔는데 대체적으로 선생이 전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천(四川) 민산(岷山)의 선천도파의 전인(傳人)인 나춘포(羅春浦) 진인의 일파를 세상에서 나문(羅門)이라 하는 바, 그 제자들은 서남 지방의 각 성에 깔려 있어서 유문(劉門) 및 당문(唐門)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였고, 저술의 풍성함은 유문의 창시자인 유지당(劉止唐) 선생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편이었다.
나문에서 전수한 선천도는 철학적으로 논할 때는 선천학(先天學)이고 공부로 말하면 좌공(坐功)과 수공(睡功) 그리고 신공(神功)으로 나누어지는데 선생을 개조(開祖)로 받들며 제사를 모시고 있다.
민산에는 희이 선생의 사당이 있으며 진박노조전(陳搏老祖殿) 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여기서는 노자와 하상공(河上公)의 제자까지 모시고 있다.
진박노조를 들먹이면 북방 각 성에서는 아낙이나 어린애들까지도 알고 있는 정도이다. 성도(成都)에서 도를 포교 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명나라 때의 사람이 그린 선생의 신상(神像)을 맞아 모시는 등 의식이 성대하고 사도(師道)가 존엄성을 띄는가 하면 쏟는 정성이 깍듯하고 지극하였다. 성도에서 대만으로 온 인사들 가운데 연세가 좀 많으시고 입문을 했던 분 들은 모두 그때의 일을 그럴싸하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민산은 사천성 송반현(松潘縣) 북쪽에 위치했다. 줄기는 청해성(靑海省) 파안객라산(巴顔喀喇山)에서 뻗쳐 나 감숙성(甘肅省) 민현(岷縣)을 지나 사천성 경내로 들어서게 되고, 이 곳에서 불쑥 하늘로 치솟아 정상을 이루나 운무에 가려 그 모습을 좀처럼 구경할 수가 없다.
그 자락의 양부령(羊賻嶺)에 선생의 사당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민강이 흐르고 있다. 산맥이 남쪽으로 뻗친 줄기는 민산 산맥인데 이 줄기에는 청성산과 대설산(大雪山)이 있고 그 끝에 아미산(峨嵋山)이 있다. 동쪽으로 뻗친 줄기는 파산산맥(巴山山脈)인데 좌담산(左擔山)과 검산(劍山)이 있고 그 끄트머리에 무산이 솟아 있다. 선생의 제사를 이 곳에서 모시는 것은 역시 천하의 으뜸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춘포는 선생의 직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어릴 적에 한 도사에게 끌려 무당산으로 올라가 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서오경(四書五經)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가역학(丹家易學)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역학 중에서 진박의 역학과 위백양의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진수로 삼았다.
그는 무당산에서 40년을 살았다. 그 동안 그는 역학에 파고들었고, 연단(練丹)을 했으며 정좌를 익히는 동시에 정기를 들여 마시기(服氣)를 20여년만에 선생의 선천무극도(先天無極圖)의 정법(正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다만 벽곡법에 관해서 그의 선사(先師)인 호현자(胡玄子)는 '그 법은 이미 실전되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생의 도법은 선생이 무당산에 거처할 때 이미 서쪽 민산으로, 그것도 화산으로 옮겨져 은둔하기 이전에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사천 역학의 발달은 수많은 은자들에 의해 널리 퍼진 셈인데, 물통을 고쳐 주는 늙은이나 간장을 파는 늙은이들이 하나같이 선생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것이었다. 사천성 중부 지방에서 선생과 사귄 사람들 가운데 진화자(陳花子)라는 사람이 있기는 했으나, 선생의 도를 전수 받은 사람은 없었다.
체도통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화자는 청성산에서 득도했고 저자 거리에서 종이로 꽃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술만 사 마셨다. 진박과는 친구가 되어 청성산을 오락가락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종 종 볼 수 있었다."
그의 일화는 적지 않은 편이다.
사람들과 쉽게 친하는 도사들은 마음이 맑은 편이라. 지금도 선생과 화자의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기는 하지만 그 분들의 도는 이어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다.
4. 사람들과 보낸 화산의 세월
희이 선생이 무당산에서 화산으로 옮겨간 시기는 어떤 책에서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후주(後周) 현덕(顯德) 년간이라고 한 점은 여러 책에서도 똑같았다. 화산은 태화산(太華山)이나 서악(西嶽)으로 일컬어지며 섬서성(陝西省) 화음현(華陰縣)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당산과 더불어 쳐주는 수도(修道)의 명산 승지이다. 위에는 연화봉(蓮花峯)이 있는데 선생은 종종 연화봉에서 묵었다.
화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고 연못에 천개의 잎이 있는 연 꽃이 있다. 이 연꽃을 먹으면 우화등선하기 때문에 화산이라 부른다."
한유(韓愈)도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태화 봉우리 위에 옥정연(玉井蓮)이 있더라. 꽃이 피면 둘레가 십장이나 되고 연 뿌리는 배와 같더라. 차갑기는 서리나 눈에 견줄 수 있고 달기는 벌꿀 같더라. 한 조각 입에 넣으면 해묵은 골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니......"
소위 꼭대기니 봉우리니 하는 것도 연 꽃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연화봉이 화산의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고 또 가장 높기 때문이다.
동시에 화산기의 다른 구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왕원중(王元仲)은 연화봉에 오르고자 절의 승려에게 자기가 꼭대기에 오르게 되면 연기를 피워올려 신호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튿날 그는 불씨를 가지고 연화봉으로 올랐다. 승려가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기가 피어올랐다. 왕원중은 스무날을 보낸 후 산에서 내려왔다. 승려가 묻자 그는 봉우리 위에 연못이 있고 연봉우리가 활짝 피어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깨어진 무쇠의 바위가 있더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화산 연화봉의 색다른 풍경이다.
선생이 이 산으로 은둔처를 바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까닭을 체도통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헤아리고 있다.
"선생이 어느 날 밤에 마당에 서 있으려니 금인(金人)이 검을 들고 나타나 소리쳤다 '당신의 도는 이루어 졌으니 마땅히 귀성(歸成)할 곳이 있어야 하오' 선생은 금인이 말한 귀성의 뜻이 가을이 되면 만물이 시들어 땅으로 되돌아가듯이 자기도 끝내 서방에서 은둔을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헤아렸다. 그리하여 70세 남짓한 나이인데도 화산으로 갑자기 옮겨가 운대관(雲臺觀)을 세울 곳을 얻어 형극을 깎아 내고 귀성이란 말을 실현하고자 살기에 이르렀다. 그때 화산의 경내에 호랑이가 있어서 사람을 잡아먹었지만 선생이 옮겨오자 호랑이는 스스로 떠나갔으며 다시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 종종 문을 닫아걸고 누워서는 몇 달이 지나도록 일어나지를 않았다."
이는 무당수은기에 기록된 바와 비슷하나 나이가 70남짓하다는 것만이 90여세로 되어 있다.
아울러 금(金)이란 서방을 가리킴으로 갑자기 그해 가을에 화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노새의 등에 책을 가득 실은 이외에 한 대의 칠현금과 하나의 돌 솥을 가지고 갔다는 등의 몇 마디가 적혀 있다. 송나라 진박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화산 운대관으로 거처를 옮기고서도 또 소화석실(少華石室)에서 머물기도 하셨는데 한번 잠이 들면 백여일 동안 일어나지를 않았다."
선생이 잘 주무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장수선옹(長睡仙翁)이라 일컬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다.
"앉은자리에 해와 달이 없고, 조용함 속에 건곤이 쉬더라."
"산 속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서 종종 흰 구름을 벗하여 잠을 자노라."
운대관고 소화석실을 살펴 본 결과 한결같이 현문(玄門)에서 대대로 도를 닦던 장소였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우화등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운대에서 저 까마득하고 높은 하늘을 마주하니, 태화에 바람이 몰아쳐 나무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더라. 만약에 달빛이 달의 동굴로 되돌아오면 붉은 노을 빛의 은은한 곳에서 금 자라를 맞더라.'
깊은 현기(玄機)와 도결(道訣)이 바로 위의 구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희이가 화산에 이사온 지 얼마되지 않아 은사(隱士) 충방( 放)이 도를 물으러 와서는 말했다.
"이 곳에서 봉래로 가는 길은 많지 않고 화산의 세월은 여느 사람의 것과 같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했다.
"집집마다 밝은 달은 중천에서 빛나고, 곳곳의 봄철 꽃은 온 누리를 붉게 물들였군요."
무릇 세상 천지가 그러하니 화산 역시 마찬가지고, 화산이 그러하니 온 천지도 그럴 수밖에 없으나, 매일과 같이 사용하고 행하는 가운데 알아보고 손에 넣으면 되는 것이다. 세월은 같으나 거룩과 범속이 다르고 산수(山水)가 같으나 살은 수위(修爲)가 다르고, 스스로 알아서 취하고, 스스로 수위를 쌓는다면 천지간에 성지가 아닌 곳이 없고 도산(道山)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화산의 세월은 세상 사람의 것과 같은 것이다.
희이 선생이 화산에 계실 때 여도사 모녀(毛女)를 만나 서로 내왕을 한적이 있다. 따라서 선생의 모음 집에 모녀의 시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약초의 새 순은 대 바구니에 차지 않고 사람은 더욱 위험한 꼭대기에 올라 돌아갈 길을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앞장을 서서 푸른 산 속으로 들어가려 하네."
그리고 이런 시도 있다..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고운 벗으로 삼고 다시 밤나무 잎을 기워 비단 저고리를 삼아서 때로는 진(秦)나라 궁궐의 일을 물으며 웃으면서 선화를 어루만지며 하늘(太虛)을 바라보네."
모녀는 진나라 시대의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 궁궐의 일을 묻는다는 한마디가 있는 것이다.
과정록(過庭錄) 즉 범문정공(范文正公)의 조부이신 당공께서 희이 선생에게 준 시에 의하면 "모녀를 만나 무슨 일로 이야기를 나누었소"하는 구절이 있다. 열선전(列仙傳)과 체도통감에 똑같이 모녀전이 있다. 이 모녀 역시 스스로 진시황 시대의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포박자(抱朴子) 역시 한(漢)나라 성제(成帝)때 그 누가 종남산(終南山)에서 본 모녀가 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어도초(魚道超)와 어도원(魚道遠)이란 두 여도사 였다는 점을 기술한 적이 있다. 혹자는 진나라 때의 사람이란 후진 즉 진(晋)나라 때16나라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하지만 고증할 길이 없다. 지어낸 이야기 같아서 수록하였다.
모녀는 화산에서 모녀봉에 상주하고 있었으며 희이 선생에게 답한 시도 있다. '옛날이 지금과 다른 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푸른 노을이 발소리를 죽이고 푸른 산을 감도는 것을 듣네. 퉁소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니(奏樓) 적적하기만 하고 오색 구름이 헛되이 벽라의( 蘿衣)를 번거롭게 하네.' 유난히 맑은 정신으로 읊은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시구이다.
모녀가 희이에게 선물한 시 가운데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이 있다.
"제왕(帝王)은 본 받을 수가 없고, 해와 달은 언제나 응대하기가 어렵더라."
시화총귀(詩話總龜)에서는 이 시가 성도의 한 기녀가 선생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한다.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질문을 한 선생외에 그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선가(仙家)에서 오래 살며 멀리 내다본다는 장생구시(長生久視)의 일은 말하는 사람이 모르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있다. "만금으로도 오래 사는 비결과 바꾸지 않고 목숨을 이어줄 사람은 천년에도 만나기 어렵더라," 모녀의 일은 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노릇이고, 혹자는 몸에 털이 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송나라 역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나라 세종(世宗)은 황백술(黃白術)을 좋아하였다. 진박의 이름을 듣고 그는 현덕(顯德) 3년에 화주(華州)에서 대궐까지 데려오도록 하여 한 달포 대궐에 머물게 한 후에 여유 있는 태도로 황백술에 대해 묻자 진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폐하는 사해(四海)의 왕이시니 모름지기 사해를 염두에 두셔야 할 텐데 어이하여 황백술에 대해 신경을 쓰십니까' 세종은 진박을 꾸짖지 않고 간의대부에 임명하고자 했으나 진박은 사양하고 벼슬을 받지 않았다."세종은 재백 50필과 차 30근을 진박에게 내렸다. 이 일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도 기록이 있다. 다만 진박의 대답이 다음과 같이 좀 다를뿐이다.
"폐하는 천자이옵니다. 천하를 다스려야 할 분이 황백술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그 외의 나머지는 차이가 없다. 체도통감에 의하면 세종에게 말씀드린 사람은 화주의 장수인 나언위(羅彦威)라고 한다. 간의대부에 제수코자 했으나 한사코 사양하는 진박에게 세종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영을 내려 재백 50필과 차 30근을 진박에게 하사한 이 외에도 백운선생(白雲先生)이라는 아호를 내렸다."
그리고 진박 선생이 산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세종은 주현(州縣)의 벼슬아치들에게 수시로 소식을 물은 것은 어진 사람을 예우한다는 뜻을 표하는 것이다.
선생은 선천역수(先天易數)에 조예가 깊었다. 송나라의 역사에 실려 있는 열전에도 '진박이 역술을 읽기 좋아하고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욱이 노자와 장자의 오묘한 역술을 이어받아 하락(河洛)에 뛰어나고 술수(術數)와 이기(理氣)에 정통하고 밝으며 사람을 잘 판단하였다.
천현자(天玄子)는 그를 '천지에 통하는 술법이 있고 미리 헤아리지 못하는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거꾸로 된 것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재주가 있고 건곤을 돌려놓는 지략이 있었으나 좀처럼 그 예봉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섯 번이나 국란을 겪었으나 속세의 명성을 누리지 않고, 한 주인도 섬긴 적이 없어서 수없이 바뀐 왕조를 받들어 온 양응식(楊凝式)과는 같이 논할 수가 없다.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 매번 한 왕조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즉시 찌푸려진 미간이 며칠간 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한 시는 다음과 같다.
"십년동안 홍진 세상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고개를 돌려 푸른 산 속으로 돌아가 꿈나라로 들어서네. 자색 옷의 영예로운 벼슬을 마다하고 잠깐 자려 하니 붉은 대문의 귀히 되느니 보다 가난함이 낫더라. 시름에 잠겨 검과 극으로 위태로운 주인을 부축했다는 소식을 듣고 번민에 휩싸여 요란스럽게 사람을 취하게 하는 생(笙)과 노래를 듣네. 헌 책을 찾아서 휴대하고 옛날의 은거처로 되돌아가니 야생화와 노래하는 새들은 똑같은 봄임을 알리네."
그런가 하면 화산취적기(華山吹笛記)에는 그와 현진자가 주고받은 시의 뜻이 다음과 같이 더욱 청신함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움직이는 것으로는 떠가는 구름을 좋아하고, 정지된 것으로는 산을 좋아하니, 풍광에 나른하니 얼이 빠져 매번 끼니마저 잊어버리네. 땅 위에서 움직이는 신선이라 하늘이 목숨을 길게 늘려 주니 잠에 취한 눈으로 안개 속에서 꽃을 보네. 늙은이는 소 등에 탄 채 종적이 요연해지고, 잠자는 새벽꿈에서 본 나비의 흔적을 남기더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하지 않은 채기운의 변화를 오랫동안 잊고 있으니 중천의 밝은 달은 절러 둥글어지더라."
화산은 섬서성 화음현 남쪽에 위치하고 태화산이라 불리기고 하거니와 오악(五嶽) 가운데 서악이다. 앞서 '나는 서방으로 돌아가 은거해야 하나' 하고 말한 후 즉시 화산으로 거처를 옮겨 서악에 귀성(歸成)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태화와 소화는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숭산(嵩山)의 태실(太室)과 비슷하다.
화산의 중봉(中峰)은 연화봉(蓮花峯)이라 하고 동봉(東峯)을 조양봉(朝陽峯:선인장이라고도 함)이며 남봉은 낙안봉(落雁峯)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세상에서는 화악삼봉(華嶽三峯)이라고도 한다. 이들 외에 운대(雲臺) 공주(公主) 모녀(毛女)등의 봉우리들이 중봉을 에워싸듯 하고 있는데 두보가 시에서 '여러 봉우리들이 나열해 있는 모습은 아들과 손자와 같더라' 고 함은 바로 이들을 가르킨 것이다. 운대봉은 바로 북봉이기도 하며 선생이 도를 닦은 곳인 운대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암반으로 이루어진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면 절벽은 만 자가 되고 흰 구름이 가물거리는 것이 정녕 기이한 풍광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입산 쪽의 장초곡(張超谷)과 골짜기 입구의 옥천원(玉泉院) 역시 선생이 간혹 오셔서 쉬는 곳이며, 지금도 선생이 곤히 주무시던 석상(石床)이 남아있다.
'한 번 취하면 천번의 시름이 풀릴꼬 한번 잠들면 만 번의 걱정이 사라진다' 선생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잠으로써 은둔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적게 자면 수개월이고 오래 자면 일 년 남짓하게 자는 것이었다. 사실 그만큼 즐기는 것이었다. 화산에 있는 온갖 명승지는 모두 도관이고 승려가 머무는 절은 없다. 그리고 매년 8월만 되면 온 산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봉해지고 이듬해 늦봄이나 초여름이 되어야 풀리게 된다. 산 속의 도사들은 대다수가 잣과 황정(黃精)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런 만큼 나이가 백세인데도 동안백발의 도사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소화는 길이 험한데다가 개척을 하지 않아 놀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편이었다. 그래서 선생은 소화에 있는 석실에서 머물 때가 많았다. 석벽 사이에도 선생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꼭 살아 있는 것 같다.
초상 아래쪽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천고의 선명(仙名)은 우주에 전해질 것이고, 화산의 신선 같은 풍채는 구름과 연기를 일어 보낸다." 새긴 사람의 이름과 나머지의 글귀들은 모두 침식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연화봉 꼭대기에는 금천묘(金天廟)가 있고 묘 앞에 옥녀세두분(玉女洗頭盆)이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모녀가 이 곳에 올적마다 여기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이름은 대야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천연적인 옹달샘으로 모양새가 옥대야 같고 물은 맑고 시원하면서 미끈거리는가 하면 얼굴을 환히 비쳐 볼 수가 있다. 지금도 산 속의 도사들이나 나무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다.
5. 마음을 비우면 신(神)과 통한다
화산에 거처하면서 희이 선생은 간혹 화음에 나가 보곤 하였다. 동헌필록(東軒筆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느 날 나귀를 타고 화음으로 놀러 갔을 적에 저자의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조점검(趙點檢)이 천자가 되었다' 선생은 놀랍고도 기뻐서 소리내어 웃으며 말하였다. 이번에는 천하가 안정되겠구나. 조점검는 바로 조광윤(趙匡允)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면서 우애가 있고 지용(智勇)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주나라 세종을 따라 회남(淮南) 양주(楊州) 수춘(壽春)등을 정벌하는 데에 공을 세워 벼슬이 검교태위(檢校太尉)에 이르렀고, 절도가 있고 덕망이 높아 병권을 쥐기까지 하였다.
현덕 7년에 출사하여 글안의 군사를 막게 되자 뭇 장수들이 진교역(陳橋驛)에서 그를 옹호하여 주나라 세종의 대위를 선양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대위에 올라 국호를 송이라 하니 곧 송태조(宋太祖)였다. 현덕 3년에 세종이 선생을 불러 만나 본지 4년만의 일이었다. 오대(五代)의 세상이 시끌벅적하니 50여년을 끌어오다가 이제서야 통일이 된 것이었다.
희이 선생은 한때 '마음을 비워 영을 맑도록 하면 절로 신과 통하리라.' 하고 말한 적이 있으며 만년에 세상 사람들은 선생을 '천지에 통하는 술법이 있고 앞일을 모른 적이 없다.' 라고 한 것은 바로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선감기(仙鑑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느 날 나귀를 타고 화음으로 놀러 갔다가 송 태조가 등극했다는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웃으며 천하가 안정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화산으로 돌아가 은둔을 했으며 다시는 나가지 않았고 태조가 불러도 찾아가지 않았다."
선생이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나 태조는 허물로 삼지 않고 도리어 화산 일대의 세금 징수를 면하도록 조처해 주었다.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태조가 등극하기 전에 선생과 마주 앉아 화산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선생이 무엇을 걸겠느냐고 물었을 때 태조는 대수롭지 않게 화산을 거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고 나중에 바둑에서 태조가 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탕감했는데 그 뜻은 화산을 내린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전해지는 '화산을 잃은 한판의 바둑' 은 이 장고(掌故)를 가리키는 것이다.
송 태조는 재위 16년에 붕어하고 그의 동생인 광의(廣義)가 뒤를 이어 등극하니 바로 태종이었다. 태평흥국(太平興國) 초기에 그는 사신을 보내 선생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한 편의 시까지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번 왕조때 흰 구름 속에서 나오더니 나중에 종적이 묘연해져 소식이 없더라..... 이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올 것을 약속한다면 어쨌든 세 봉우리를 그대에게 하사하리라'
이번에 선생은 산을 내려와 부름에 응했는데 송나라 역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태평흥국때 조정으로 찾아오매 태종께서는 무척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
체도통감 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선생은 대궐에 이르자 조용한 방을 내주어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위에서 건륭관(建隆觀)을 내주어 쉬도록 하자 빗장으로 문을 걸고 푹 잠에 빠졌다가 달포 여만에 일어났다. 그리고 우복(羽服)과 화양건에 짚신을 신는 등 예복을 갖추고 손님으로써 연영전(延英殿)에서 태종을 배알했고, 태종은 그에게 자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질문을 하였다. 이 때 태종은 하동을 치려고 하던 참인데 선생은 때가 좋지 않다고 그만 둘 것을 간하였다.
그러나 이미 군사를 일으킨 뒤라 태종은 그 말을 쫓지 않았고, 선생을 어원에서 쉬도록 하였다. 그런데 군사가 귀환했을 때 알아보니 정말 불리했다고 하지 않는가. 백여 일이 지나게 되었을 때 선생은 산에 돌아갈 것을 말씀드리자 태종은 허락을 하였다.
태평흥국 4년에 다시 선생은 부름을 받고 조정에 오게 되었을 때 하동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군사를 이끌고 하동을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첩을 거두게 되어 유계원(劉繼元)과 연병주(年幷州)를 잡고 그곳을 평정하게 되었다."
이로써도 선생이 일을 귀신처럼 헤아린다는 일단을 증명하는 셈이다. 무릇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 맑게 하고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지혜가 빛나면서 공령(空靈)하여 사물에 가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아무런 사물도 없으면, 자연히 이해(利害)의 폐단이 없어지고 남과 나의 구별이 없어져서 신광(神光)이 타오르듯 빛나면서 미리 꿰뚫어 보게 되고, 헤아림에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은 역학에 정통하고 하락이수(河洛理數)에 깊은 조예를 쌓았기 때문에 한번도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사는 천변만화(千變萬化)하고 있어 계산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선생이 가득승에게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마음을 비우면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지면 정적을 떠올리게 되고, 정적을 염두에 두면 기(氣)가 안정되고, 기가 안정되면 신(神)이 한가해지고, 신이 한가해지면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지혜가 생겨나면 모르는 것이 없게 되고, 맞지 않는 헤아림이 없는 것이지 결코 따로히 신의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로다." 그런가 하면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학문은 오로지 한 마음에 있노라. 마음밖에 도(道)가 없고, 도 밖에 마음이 있을 수 없다. 도를 닦는 것은 다만 이 한 마음을 닦아서, 이 한 마음을 성실히 하고, 이 한 마음을 밝게 하는 등 이 한 마음을 다할 뿐이니라."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마음이 성실하고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서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절로 신과 천(天)을 감응할 수 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하늘과 사람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야 한다.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신과 사람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야 한다. 느낌이 없다면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통함이 없고, 통함이 없으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다." 이는 화산취적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치가 지극히 평이하면서도 오묘하기 이를 데 없다.
희이가 산으로 돌아 간지 9년이 되었을 때 황제는 선생이 오랫동안 화산에서 꿈쩍하지 않는지라 재상 송기(宋 )를 보내 안부를 묻도록 하는 한 편으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박은 홀로 깨끗한 몸을 지키려고 시세의 이들에 간여하지 않기에 방외지사(方外之士)라 할 수 있으니 마땅히 예우를 갖추어 대접해야 하오." 송기는 화산에 이르러 조용히 선생에게 물어 보았다
"선생께서 갈고 닦는 현묵지도(玄黙之道)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요.? "
소위 현묵지도는 신선이 되는 황백술을 뜻하는 것이고, 이를 알아보는 것이 태종이 송기를 이곳으로 보낸 주된 목적이었다.
송나라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때 '박이 화산에 산지 어언 40여년이 넘었으며 그 나이를 따지면 이미 오래 전에 백 살을 넘겼다'고 했다.
진박은 말해줄수가 없어서 설명을 했다.
나는 산 속에 사는 야인이라, 이 시대에 쓸모 없는 사람이며 토납(吐納)이나 양생지술(養生之術)도 모르고 신선이 되는 황백의 일에 관해 반드시 전할 수 있는 방술(方術)이 있는 것도 아니오. 설령 환한 해를 중천에 떠오르게 한다 해도 세상을 교화(敎化)하는데 무슨 보탬이 되겠소.? 지금의 성상께서는 용안이 빼어나 천인(天人)의 풍모를 지니고 있고, 고금의 역사에 해박하여 난을 다스리는 데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성쇠지리(盛衰之理)와 성패의 기운에 정통하고, 살피는 능력이 있으니 정녕 인자하고 밝은 군주이오. 군주와 신하가 합심 협력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급선무인 이때에 다른 것을 갈고 닦을 일이 어디 있겠오. 무릇 모든 일에 있어서 천하 백성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뿐 아니라 만대에 걸친 후손들을 위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없는 수행이오. 송기 등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훌륭하다고 했으며, 그대로 주군에게 알렸고 태종은 그를 더욱 존경하여 다시 불렀고, 아울러 희이 선생이란 호를 내렸는데 그 조서는 다음과 같다.
'화산의 은사(隱士) 진박은 산 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온갖 고통을 참고 도를 닦는데만 전념해 왔구려, 과거 주나라 때부터 조용히 은둔 생활만 해 오셨으며 조정의 부름에 응할 만 하겄만 끝내 품은 도심을 저버리지 않았소, 그후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사물 밖에서 초연해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더 청허(淸虛)하구려. 이제 닦는 도가 지극히 현미(玄微)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몸소 조정까지 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청고한 삶의 모범이 되신 데 찬사와 더불어 표창을 하지 않을 수 없구려. 따라서 희이 선생의 호를 내려 여기에 오신데 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자 하오.'
세상에서 진박을 희이 선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만남에 대해 화산수은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잇다.
선생은 아울러 황제에게 '문치(文治)와 성학(聖學)에 좀 더 많은 힘을 쓰십시오.' 하고 권햇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천하를 무(武)로써 취하고, 문(文)으로써 지키고, 법으로써 제압하고, 예로써 안정시키고, 가르침으로써 밝게 하고 군사로써 위엄을 떨치십시오.'
이로써 태종은 언제나 글공부에 열심이었고 매일 이른 아침부터 유시까지 여가만 있으면 책을 놓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대신 악사(樂史)와 이방(李昉)등에게 명하여 태평어람(太平御覽) 태평광기(太平廣記) 태평환우기(太平 宇記) 3부 대작을 편찬하도록 했다.
송나라 시대의 문치는 당나라 시대보다 뛰어난 편이며, 더욱 학풍(學風)이 성행하여 송나라 명리학(明理學)을 새로이 여는 국면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데 선생의 말씀이 또한 큰 힘이 된 것은 물론이다. 나중에 황제는 다시 물었다.
'요순의 사업을 오늘에도 이룰 수가 있겠오? 이에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섬돌을 석자로 높여도 잡초를 잘라 내지 않는다면 그 자취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백성을 사랑하고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삼고, 천하위공(天下爲公)을 마음에 새기고 조용히 하는 것 없이 다스리며, 예의를 밝히고 법을 강화하여 기강을 바로 잡는다면, 천하는 군사 없이 강해질 것이고, 싸우지 않고서 위엄을 세우며, 다스리지 않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요순이죠. 성인의 도는 때에 따라 새로워져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 많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융통성 있는 변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값어치가 있죠. 이럴 수만 있다면 어찌 요순의 사업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겠소이까!
이 말은 뜻이 깊으면서도 적절했고 간단명료하여 힘을 적게 들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따라서 태종은 얼굴 표정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를 더욱 더 존경했는데 예우를 극진히 했다. 이상의 황제에 대한 대답의 말은 화산수은기에 의거한 것인데 체도통감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는 약간 글자가 몇 자 다를 뿐 대체적인 뜻은 다르지 않았다.
통감에서는 태종과 선생이 시를 지었다고 했으나 어느 책에서나 수록된 것을 볼 수 없었다. 선생이 하늘이 내린 예지가 있었고, 재주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높고도 먼 뜻을 품는 동시에 마음을 비우고 있어서 성격은 청고하면서 담백했고 온화하면서 조용했다. 따라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통찰할 수 있었고 현미(玄微)함을 터득하고 깨우칠 수 있었다. 어느 날 재상 송기 등이 선지(先知)의 일로 질문을 한 적이 있고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마음은 저절로 비워질 것이고 무심이면 심경은 자연히 조용해질 것이며, 아는 것이 없으면 신(神)은 자연히 맑아질 것이려니와 염두에 없으면 느낌은 자연히 영검해지는 것이오. 만약에 상(象) 밖으로 초연해질 수 있다면 자연히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오." 그리고 또 "배움을 위해서 반드시 마음이 살도록 해야 할 것이고, 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죽도록 해야 할 것이오. 마음이 죽으면 신이 살고, 마음이 살면 신이 죽게 되는 것이오. 따라서 상념을 일으키면 끊어야, 마음이 생기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오." 했는데 이 일은 나중에 태종이 듣고 매우 감탄했다.
"그와 같은 말씀은 정말 현묘하구료." 사실 그 요지는 깊고 먼 것이리라!
6. 소매 속에 천명(天命)을 감추다
송(宋)은 당나라를 이어 오대의 분란을 마무리짓고 북송과 남송이란 두 송의 320년에 걸친 제업(帝業)을 이루매 문화와 교육이 크게 성하여 학자들이 배출된 데에 태종의 공이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태종이 무형 중에 박학한 희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역시 적지 않다.
희이는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태종의 물음에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소이다'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또 성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며, 덕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길뿐이오이다' 하고 말했다.
태종이 책을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그 영향에 북송의 학풍이 크게 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문답에서 비롯된 것이다. 태종은 희이에 대하여 깊이 믿었으며 그이 말이라면 좇지 않는 것이 없었다. 바로 황실의 후계자 선택과 같은 큰 일이라도 희이에게 들어 결정을 내릴 정도이니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씨견문(邵氏見聞)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황제는 희이가 관상에 뛰어나다고 하여 남아(南衙)로 가서 진종(眞宗)을 봐 달라고 분부하였다. 희이는 대문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묻자 대답했다.
'왕궁의 대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장상이니 왕을 볼 필요가 어디 있겠소이까?'
그리하여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정해지고 말았다."
체도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태종이 여러 아들을 나오게 하여 만나 보게 하였다'고 하였고, 선생은 은밀히 '천명실재장(天命實在章)'을 올리게 되고 후계자를 정하는 일은 그대로 정해지게 되었다.
수은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태종은 천명실재장의 글을 읽은 후에 계승자를 결정했는데 장자를 세우지 않고 셋째 아들인 항(恒)을 태자로 삼았다. 후에 태종이 붕어 하자 선정사(宣政使) 왕원좌(王元佐)는 태종이 영명한 것을 꺼려 이창령(李昌齡), 호단(胡旦)등과 황후의 뜻을 받들어 장자를 계승자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초왕(楚王) 원좌(元佐)를 세우려고 하였다.
다행히 재상 여단(呂端)이 돌아가신 황제의 뜻을 역설하고 태자를 옹립할 날이 오늘인데 어떻게 이의가 있을 수 있느냐에 태자 항을 받들어 복녕전(福寧殿)에서 즉위토록 하니 이 분이 바로 진종인 것이다.
이 모두 선생께서 예측했던 대로였다.
태종에게는 아홉 명의 아들과 일곱 명의 딸이 있었다. 장자인 원좌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고 생김새도 부황을 닮은 편이었다. 진종은 셋째 아들로 자가 항이고 이름은 원간(元侃)인데 영특하기 이를데 없을 뿐만 아니라 침착하면서 지모가 있는 한편으로 과단성도 있는데다가 생김새가 더욱 출중했다.
태조가 동생에게 보위를 전해준 선례와 두태후(杜太后)의 보위에 관한 유언에 따르면 태종은 마땅히 동생이나 태조의 장자인 광미(光美)에게 자리를 내준 후에 다시 광미가 태종의 장자인 원좌나 셋째 아들인 원간에게 보위를 전승토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자 광미가 무척 불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원좌역시 애써 말렸다. 그러나 태종은 듣지 않았고 광미를 내쫒았으며 동생인 덕소(德昭)를 학대하는가 하면 원좌를 폐하고 말았다. 이는 오로지 선생의 말씀을 쫓겠다는 집념이었으니 얼마나 선생을 믿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송실의 아우에게 전해지던 일은 역시 태종에 이르러 끝나고 말았다. 이 가운데의 까닭은 정사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왕선산(王船山) 독통감론(讀通鑑論)에서 그 일에 대해 무척 자세하게 평하고 있으면서도 천명실재장의 내막에 대해선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 내용은 은밀히 비쳐진 것이라 알고 있는 사람이 무척 적었던 것이었다.
동대소(董大銷)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매 속의 건곤(乾坤)에 천명이 숨겨져 있고 주전자 안의 해와 달은 현기(玄機)를 갈무리하고 있더라."
이는 바로 그 일을 가리킨 것이다.
태자를 세우는 일에 은밀한 상주문을 올린 일에 대해서 진종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즉위 후 대중상부(大中祥符) 4년에 분양(汾陽)에서 제사를 올리고 돌아가는 길에 화음에 들러 다행히도 운대관에서 선생의 남겨진 초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운대관의 도지세를 면제해 주고 도사 가득승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한편 무자화(武子華)등에게 자복(紫服)을 하사했다. 그리고 성조(聖祖)와 진종의 본명(本命)과 성관(星官) 그리고 원진(元辰) 세 대전을 다시 짓도록 명하고 또 북쪽 벽에는 살아 생전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였다. 반면 가득승은 하사 받은 건축 자재를 이용하여 북극전(北極殿)과 무극궁(無極宮)을 더 지어 참 도를 갈고 닦는 곳으로 삼았다.
이 모든 것은 무론 진종이 선생의 덕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후계자를 정하는 일로 태종의 호감과 신임을 크게 얻게 된 선생은 그 일이 결정된 이후 간의대부에 앉으라는 태종의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선생은 뜻이 벼슬에 있지 않고 산수 지간에 있었기 때문에 한사코 마다하고 산으로 돌려 보내 줄 것을 간청하다시피 하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시도 올렸다.
"초야에서 우리 황제의 부르심을 받은 바 도남이란 이 박은 성이 진가이오며, 세 봉우리에서 사계절을 노닥거리는 길손이고, 이 세상에서 떠도는 한 한가한 사람이외다. 세태(世態)는 언제나 몰인정하고, 시정(詩情)이야 말로 참을 얻을 수 있으니, 아무쪼록 고라니의 성품을 어디서인들 신하라 칭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시를 보고 태종은
'천자도 그를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제후들도 그를 친구로 삼을 수 없다.'
는 고고한 은사인 것과,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편전에 연회석을 마련하고, 중신들을 참가시키고 시를 지어 그를 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거북과 두루미, 그리고 안장을 갖춘 말 및 피륙을 후하게 내렸다. 그러고도 화양(華陽), 자사(刺史), 왕조(王祚)에게 조서를 내려 수시로 안부를 묻도록 했으니 그 받드는 정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으리라. 선생이 화산에 거처한다는 사실은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기꺼이 지조를 굽히고, 제자가 되어 한 평생 곁에서 모시겠다는 사람이 수없이 찾아왔다. 선생은 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리를 설명해 주고 무(無)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였다.
천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이고, 조화의 기틀이다. 무를 이용할 줄 안다면 복희씨(伏羲氏)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하나의 無가 묘하게도 만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만가지가 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도를 대하게 되었을 때 도를 말하고 사람이 "無"를 지킬 수 있다면 무궁한 조화는 절로 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라는 자의 가르침이 바로 '선천역교(先天易敎)'이며 또한 '노자교(老子敎)'이다.
'무극문' 에서는 무를 본 받을 방법이 많다.
무극(無極)의 상태를 이룰 수 있다면 만물은 모두 나에게서 갖추어지고 우주 역시 나에게서 모두 갖추어 지는 것이다!
선생이 화산으로 되돌아 온 이후 태종은 선생을 보고 싶어 하다가 다시 사자를 산으로 보내 선생을 청했다. 선생은 사신에게 완곡하게 사의를 표하고, 화산에 눌러 살도록 해 달라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사자는 그대로 돌아가 아뢰자 태종도 어쩔 수 없었다.
선생이 볼 때 무릇 도를 닦고 은둔한 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홍진 세상의 때와 속된 기운을 떨쳐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넓고 소탈하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성스러웁고도 신선처럼 되는 도를 닦을 수가 있다고 보았다.
마음이 좁으면 격국(格局)과 안식(眼識) 그리고 기우(氣宇)가 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탈하지 못하면 의식이 無에 극도로 어두워 질 수가 없고,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해탈할 수가 없으며, 사람 자신도 '자유롭고도 한가한 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언제나 부귀공명과 현실 세계에서 부침하며 사람은 영원히 범속한 때와 기운에서 초탈할 수가 없고,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뻗쳐 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사도자(舍道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갈고 닦는 도인은 반드시 산림 속에서 많은 시각을 보내도록 해야 하네. 산림의 기운을 더 마시면 그 만큼 속세의 때를 덜 수가 있고, 속세의 때를 모조리 떨쳐 버려야 성현의 기질이 불현듯 생겨난다네. 수양을 쌓는 도인은 천지의 가운데서 노닐어야만 이 천지와 암암리에 합쳐지게 되네! 그리고 자연의 가운데서 노닐어야만 이 자연과 암암리에 합쳐질 수 있네. 암암리에 합쳐져 간격이 없으면 자연히 천지와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일세!
노자는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아야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고 했네! 이건 또한 부자(夫子)의 '하나로써 관철한다'는 것에 버금가는 공부이기도 하네. 쉽게 포기하면 안되네. 이는 선생께서 다시 산을 나서고 싶지 않는 내적 원인이었다.
그러나 태종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얼마후 사신에게 조서와 차 그리고 약물 등을 갖고 선생을 찾아 뵙도록 하는 한편으로 화산 관할의 태수와 현령에게 명을 내려 편안히 모실 수레까지 동원하여 극진히 선생을 맞도록 했으나, 선생은 상주문을 올려 완곡하게 사양했는데 그 상주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모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조서를 받자옵고 자세한 사정을 한 장에 적어 올리나이다. 꾸불꾸불하고 험난한 길을 무릅쓰고 성은을 베푸시어 만금이나 되는 양약을 하사하셨더군요.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폐하를 배알코자 하니 오히려 송구한 마음만 더할 뿐이군요. 신은 밝을 때 한가한 손에 지나지 않은 당나라의 서생에 불과합니다.
요 임금 때는 도가 흥하여 허유(許由)를 우대했고, 한나라 때는 강성했으며 네 분의 노인, 즉 사호(四皓)를 잘 모시는 등 가상하게 여길 은둔의 인사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소이까. 더군다나 신의 몸이 이미 고목 같고 마음이 재가되어 인의에 맞는 거취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형편없는 연꽃잎으로 옷을 삼고, 몸에는 푸른 털이 자란데다가 발에도 신지 못한 모습으로 폐하가 계신 섬돌 위에 모습을 드러내면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꺼이 돌아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산에서 오래도록 은둔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폐하께서 어진 이를 잘 대접한 점은 옛날에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몇 줄의 열성 어린 부르심의 조서를 번거롭게 채봉(彩鳳)을 시켜 물어 보게 했으나, 한 조각 한가한 마음은 이미 흰 구름에 붙잡혀 있습니다. 옛 개울의 물을 얻어 마시고 소나무 아래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잔뜩 들으면서, 해와 달의 청고함을 비웃는 한편 구름과 노을의 모습을 웃으며 굽어본답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즐기고 우쭐해서 말을 잊곤 한답니다. 정신은 이미 사물 밖으로 벗어나 있고 형체는 구름과 연기처럼 떠다닙니다. 도(道)의 뿌리와 싹에까지 숨어들었으나, 성역의 물과 흙을 소모할 뿐이죠. 삼가 굽어살피시어 못난 신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이 글로써 간청하는 바입니다.'
태종은 상주문에 있는 '한 조각 한가한 마음은 이미 흰 구름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읽게 되었을 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분부를 거두어 들였지만 여전히 때때로 방백 수령들에게 선생의 안부를 묻고 선물을 하사하곤 했다.
그러나 선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에 별천지가 있었던 것이다. '한가해서 노루의 놀이를 하다가 피곤하면 흰 구름을 얼싸안은 채 잠들고, 산 속에는 세월을 알 수 없으니 높다랗게 누워 어느 해인지를 모르더라.'
그리고 '비가 오고나면 산은 윤기를 더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북두의 자루가 옮겨졌더라. 영마루의 매화는 향기를 몰래 풍기고 시를 쓰더라.' 라는 구절은 바로 그 무렵 선생의 산 속 생활의 여실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부귀를 구하지 않고, 제왕을 중시하지 않으며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편안히 산림 속에서 스스롤 즐기는 정신은 자연히 남과 다투는 경쟁을 물리치게 되고, 탐욕스런 욕심을 떨쳐 버릴 수가 있었다.
'해와 달의 조롱 속에 든 새가 건곤(乾坤)의 물위에서 오래 몸을 불리고 있구나.'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으니 '자연히 천지가 도가니이고 두루 육허(六虛)를 떠돌아다니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동빈(呂洞賓)의 '한 알의 조 속에 세계가 숨겨져 있고 반되의 돌솥 안에서 산천을 끓이더라'는 심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부귀가 다 무엇이겠는가!
7. 마음에 신광(神光)이 있어서 만대(萬代)에 통하더라.
희이 선생은 선도(仙道)에 몸을 숨기다시피 하고 산과 물을 찾아 한껏 즐기고 있었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선천역학(先天易學)과 하락이수(河洛理數) 그리고 무극도상지학(無極圖象之學)은 말할 것도 없고 음양방기지술(陰陽方技之術)에 몰입하여 하나를 배우면 열을 터득하니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때로는 상당히 신통하고 묘용이 있는 신기한 자취를 이 인간 세상에 남기기도 했다.
그래서 체도통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컫고 있다.
"선생은 경사에 해박하고, 역학에 더욱 정통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관찰하고 거룩함과 범속한 것을 구별하는데 털 끝 만큼도 오차가 없었다.'
송나라 역사의 진박열전에도 '선생을 사람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고 천기를 먼저 헤아려 냈다' 고 한 것은 마음이 '지극히 비고 정적이 두껍게 깔리게 되었을' 때 자연히 천지와 상응하고 만물과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오, 신과 신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겹쳐지니 '마음에 신광이 있어서 만대까지 통하고, 인간 세상의 일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적이 없더라'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리고 도림잡기(道林雜記)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송 태조와 태종이 용상에 오르기 전에 조충헌(趙忠憲)공과 더불어 장안의 거리를 구경하게 되었을 때 선생은 그들과 함께 술집으로 들어가 약간의 술을 들고자 하였다.
이때 조충헌공이 거침없이 윗자리에 앉는지라 선생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자미제원의 한 조그만 별에 불과한데 감히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소? 그리고 주세종(周世宗)과 송태조 및 태종이 동행하게 되었을 때 선생은 또 한마디하였다.
'성밖에 세 천자의 기운이 뻗치는구나.' 충방( 放)이 처음으로 선생이 계신 곳에 놀러 갔을 때 선생은 평을 한 적이 있었다.
'만약에 밝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름이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 이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그릇이기에 조물주의 꺼리김을 받게 된다. 자네의 이름은 망치는 사물이 있어서 끝내 말년에 남쪽 지방에 은둔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 말처럼 결말이 지어졌다.
충방의 자는 명일(名逸)으로 송나라 낙양 사람인데 천부적으로 자질이 뛰어나고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젊었을 적에는 묵묵히 배움에 열중하였고, 나중에 학문을 강의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충분히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었다. 충방은 선생으로부터 선천도학과 무극도학을 배웠으며, 또한 역학도 전수 받았다.
그는 술을 아주 좋아하여 스스로 운계취후(雲溪醉候)라 일컬었다. 그의 어머니도 선도를 좋아하고, 세상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종남산(終南山)에 은거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의 삶을 누렸으며 한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다.
저서로는 몽서(蒙書)와 사우설(嗣禹說)이 있다. 전운사(轉運使) 송유간(宋惟幹)이 그의 재주를 성상에게 아뢰자 천자는 조서를 내려 그를 좌사간(左司諫)에 임명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성이 나서 말했다.
"제자들을 끌어들여 학문을 가르치지 말라고 당부했고, 은둔한 몸인데 또 무슨 글을 농하겠다는 것이냐 ?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는 편안히 살수가 없으니 너를 내버려두고 깊은 산 속으로 돌아가련다."
충방은 벼슬을 사양하고 병이라 칭탁 자리에 드러누웠고, 그의 어머니는 붓과 벼루를 망가뜨려 다시는 그가 글을 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돌아가게 되었을 때 지은 책들을 모조리 불태웠는데 책을 태우기 전에 도인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제자들을 자리에 모아 차례로 술을 들게 하고 몇 순배 돌게 되자 담소 자락을 하면서 책을 태우며 말했다.
"남겨서 후세의 창생들에게 화를 안겨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정히 앉아서 떠나갔다.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충방은 선생의 전인이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따로히 언급할 참이다.
체도통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충정(忠定) 장영공(張詠公)이 벼슬을 아직 못했을 때 희이는 그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공은 화산을 반반씩 나누어 살 수 있겠냐고 물었고 선생은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생은 헤어질 때 붓과 종이를 주었다. 공은 그 뜻을 알고 자기를 세상일에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선생은 시를 주었다.
'정벌로 촉(蜀)땅을 들어서게 하는 일이 빈번하고, 가마솥에 생(笙)과 노래를 끓여 불끄기에 바쁘더라. 간신히 동남의 아름다운 땅을 얻기는 하겠지만 모름지기 귀밑 뿌리의 머리칼이 서리처럼 변했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과거에 급제하여 천하에 이름을 드날리게 된 그는 검남(劍南)으로 향할 때 선생에게 시를 보내 왔다.
'바탕이 우둔하여 숲이나 개울가에서 살자고 아니했는데 이제 막 청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대에게 글을 올리고자 했으나, 오늘밤을 도와 검남으로 달려가야 하니 화산의 구름을 돌아보기가 부끄렵구려'
그리고 돌아와서도 시에서 가로대
'인생살이 대체로 벼슬길의 영달을 중시하니 동쪽으로 돌아오는 나를 길이 메여지도록 환영을 받더라. 화산의 청고한 인사에게 마땅히 비웃음을 사게 된 것이 천진함을 깡그리 잃고 헛된 명성만 얻었더라'
충정은 만년에 종기가 머리에 난 몸으로 승주(昇州)를 지켜야 했다. 그의 일생을 종합해 볼 때 선생이 준 시가 딱 들어맞은 셈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일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적이 없다'는 한 마디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또한 송나라 역사의 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린다'는 한 마디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재에 커다란 표주박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도사 가휴복(賈休復)은 속으로 욕심을 냈다.
박은 이미 그 뜻을 헤아리고 휴복에게 말했다.
'자네가 찾아온 것은 다른 볼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표주박을 욕심내어 온 것일세' 그리고 시중드는 사람을 불러 표주박을 내려서 건네어 주도록 했다. 가휴복은 깜짝 놀라 박을 신이라 여겼다.
이 일은 화산수은기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내용이 약간 다르다.
'가휴복은 선생에게 반도(蟠桃)씨로 만들어진 술잔을 하나 얻으려고 운대관으로 와 선생을 배알하고 도학의 오묘한 이치를 몇 번 여쭈어 보았을 뿐, 감히 씨로 만들어진 잔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선생이 허락하지 않을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다가 작별을 고하게 되었을 때, 선생은 가로되 자네가 찾아온 것은 도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도씨로 만든 잔을 얻고자 하는데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시켜 하나의 잔을 꺼내 주도록 헸다. 가휴복은 놀라 엎드리며 그를 신처럼 여겼다. 이는 바로 인간 세상에서 히히덕거린 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달리 교묘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극도로 비워지고, 정적이 두껍게 가라앉게 되었을 때 정신이나 생각이 움직이면 대체로 감응하여 통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감응원리 가운데의 "타심통(他心通)"이란 것이다.
대역(大易)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용히 꼼짝하지 않는다면 느낌이 일 때 즉시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으로 정적에 휩싸이게 되고,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천리 밖의 멀리 있을 때도 언제나 '생각을 일으키면 즉시 느끼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즉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도교나 불문에 몸담았던 사람이면 모두 믿는 일이었다. 따라서 '극도로 비워지면 하늘과 사람이 합쳐지고 지극히 조용해지면 신과 통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송나라 열전과 체도통감에서는 곽항(郭沆)의 이야기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곽항이란 자가 있어서 운대관 아래서 밤잠을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선생은 곽항을 불러 깨우시더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곽항은 길이 멀어서 망설이지 선생은 재촉을 하며 같이 가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마장을 못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갈을 하러 오는 사람과 맞딱드리게 되었고, 곽항은 무릎을 꿇고 울기만 했다. 선생은 위로의 말을 하고 약을 주며, 빨리 돌아가 약을 먹이면 나을거라고 했다. 집에 도달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가 아닌가! 그래도 선생이 준 약을 먹이니 깨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은 앞에서든 사례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또 화산수은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박은 소화의 석실에서 시견오(施肩吾) 와 바둑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시중드는 사람에게 명했다. '손님이 멀리서 찾아왔으니 빨리 나가 맞도록 해라' 과연 도사 이수미(李守美)가 촉 땅에서 찾아왔더라."
이수미라는 자는 사천성 아미(峨嵋)의 사람으로 민산파(岷山派)의 사람이면서 선생의 전인이었다. 저술로는 선생도요(先生道要)와 무극문현지(無極文玄旨) 등이 있으며, 알약을 되돌려 준 일을 종종 언급하곤 했다. 무릇 이러한 일들은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화산도사 소무진(蕭无塵)은 선생을 칭송하는 한 마디를 했다.
"마음속에 신광이 있어서, 만대에 통하고 손으로 해와 달이 건곤을 돌리는 것을 받쳐들고 있다."
그리고 그 후 양무위(楊無爲) 도인은 석실에다 시를 새겼다.
"번화한 경성의 황금방(黃金榜)에 고맙게도, 이름이 높다랗게 걸려, 흰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석실로 돌아왔네. 산 위로 천보동(天寶洞)에 은밀히 통하는 길이 있고 눈앞은 바로 땅에서 살고 있는 신선의 집이라네. 때로 맑은 밤에 구름 속의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홍진 세상의 우물안 개구리를 돌아보네. 오백년 전에는 전혀 사람이 와 본적이 없는 이 곳 파초가 우거진 물 머리 위로 연기 같은 노을이 채워져있네."
희이 선생은 화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간혹 화음과 다른 유명한 산의 동굴을 유람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화음에 이르렀다. 화음의 현령인 왕목(王睦)은 평판이 좋은 청백리고 백성을 자식처럼 여겼고, 백성의 재물이라면 티끌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선생이 이르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달려나와 맞았으며 약간의 술까지 내와 대접했다. 선생은 그가 갱년기 이후 큰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나 벼슬을 하면서 많은 음덕을 쌓아 신의 가호로 환난을 면 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먹을 약까지 주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동안에 왕현령은 선생의 거처와 멀리 출타했을 때 도관은 누가 지키는가 하고 물었다. 선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시로써 대답을 했다.
'화산의 높은 곳이 내 궁궐이고, 출타시는 구름과 새벽바람을 탄다네. 정자와 누각은 황금 자물통으로 잠글 필요가 없고, 올적에는 자연히 흰 구름이 있어서 봉해 준다네.'
왕목은 듣고 부끄러워하며 사의를 표하였다. 고맙게도 은자에게는 은자가 즐기는 풍광이 있고, 산 속에 살면 산 속에 사는 자연적인 재미가 있기 마련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운대관의 대문은 일년 열두달 닫히는 때가 없었고 선생이 산을 떠날 때 단실(丹室)도 잠그지 않는다고 했다.
옛날의 석옥대사(石屋大師)는 산에 살 때 그와 같은 정경과 흥미를 시로써 표현하였다.
'사립문은 달아도 닫지 않고, 한가로이 조용한 새들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구경하네. 하얀 벽은 천년의 한을 쉽게 파묻고, 황금으로 일신의 한가로움을 삭이기 힘들더라. 구름이 가셔지는 새벽빛의 벼랑 쪽에서 싸늘한 폭포수 소리 들려오고 잎이 떨어지는 가을 숲속에서 먼 산을 보네. 해묵은 칙백나무는 안개가 사라지면 맑게 영원을 그려내고 시비곡절은 구름 사이까지 미치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산림에 은둔한 인사들의 빼어난 취향으로 가뿐하고도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고 모든 것을 떨쳐 버린 후 걸리는 것이 없으니 그 즐거움이 복받치는 기분은 결코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 만의 하나도 터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은 애오라지 자연에 도취하고 녹아 들어야만 이 자연과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다. 천지를 상대로 가슴을 털어 놓아야만 이 천지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는 것이다. 장자가 나비로 화하고, 나비가 장자로 화하는 것은 똑 같이 하나의 화함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8. 대도(大道)는 무(無)에서 체용(體用)이 생긴다.
운대봉의 운대관은 당나라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해 어느 달 인지는 고증할 길이 없다. 당나라 후기의 시인 정곡(鄭曲)은 바로 이곳에서 그가 화산을 유람하며 쓴 시를 편찬했는데 이를 운대편(雲臺編)이라 이름했다. 모두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풍요로우면서도 사고의 치밀함을 보여준다고 한다.
진양(鎭陽) 용흥관(龍興觀)의 도사인 소징은(蘇澄隱)은 운대관으로 찾아와 선생으로부터 선천무극좌단법(先天無極坐丹法)과 정사연기지술(精思煉氣之術)을 익힌 바가 있었다. 송나라 개보(開寶) 년간에 태조가 선생을 불렀으나 선생이 오지 않자 다시 소징은을 조정으로 불러 섭양지술(攝養之術)을 물었다. 소징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왕의 양생은 실제에 있어 초야나 산 속에 사는 사람의 양생과는 다르죠. 사람들의 주인이 되었으면 노자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백성이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백성들이 스스로 바로잡는다' 는 현묘한 취지를 이용하여 하는 바도 하고자, 하는 바도 없이 신(神)을 아주 차분하게 하여서, 안으로 거룩하고 , 밖으로 제왕의 도리를 다 하여 과오가 없으면 됩니다."
태조는 또 희이선생의 도를 닦는 현묘한 취지를 묻자, 소징은은 대답했다.
"선생은 조화를 아궁이로 삼고 천지를 솥으로 삼아서는 해와 달을 약으로 여기고 선천을 돌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몸이 없는 것을 몸으로 삼고, 삶이 없는 것을 삶으로 삼고, 닦지 않는 것을 닦음으로 삼고,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뜻이 없는 것을 뜻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극이 없다는 무극을 극으로 삼는답니다. 따라서 여느사람은 그 길을 엿볼 수가 없답니다."
태조는 훌륭하다 칭하고 그를 운대관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소징은이 저술한 현문잡습(玄門雜拾)의 기록인데 주고받은 말이 황조통감(皇朝通鑑)의 기술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소징은은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선생은 바로 노자의 진수를 터득했으며, 언제나 하나의 무(無)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나의 이 문중에서는 한 글자도 무이고도 역시 세워지지 않았다. 무가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무 가운데서, 사물이 있게 되고 무가운데서 모습이 있게 된다.'
나중에 소자(邵子) 소요부는 아주 깊은 천기명리(天氣命理)를 언급한 바가 있다.
"갑자기 야반에 들려 오는 한 번의 천둥소리, 수많은 집의 문들이 차례로 열리더라. 만약에 무(無)에 서려 있는 상(象)을 본다면 그대는 복희씨가 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리라!"
이 시도 전적으로 노자와 희이의 일맥에 속하는 것이다.
산 속에서 종종 희이와 같이 노니는 사람들로는 유약졸(劉若拙)과 장허백(張虛白) 그리고 혼돈도사(混沌道士) 등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송나라 계보나 태평흥국 년간의 사람들이었다. 유약졸은 선생으로부터 복기(服氣)를 익혀 90이 넘어서도 동안에 발걸음이 나는 듯 빨랐다. 장허백은 술을 잘 마셨는데 천부적인 재질에, 영악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풍부하여 오만하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다.
선생의 지현편과 조담집에 주해를 단 적이 있는데 견해가 독특하면서도 뛰어난 면이 있었다. 그리고 선생의 '대도는 무에서 체용이 생겨나니 유에서 경륜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구절을 즐겨 읊었는데 그 구절 가운데에 무궁한 철리(哲理)가 내포되었기 때문이었다.
혼돈도사는 태조가 세상을 등진 이후 종적이 묘연해지고 말았으나 그전에 민산에서 20년을 살면서 양박령(羊膊嶺)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간적이 없었다. 오늘에도 희이 선생의 사당 옆에 혼돈도사의 사당 터가 남아 있다. 화산 도사들 가운데 희이 선생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인데, 있다면 정소미(丁少微) 한 사람뿐이었다.
황조통감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송나라 태평흥국 3년 4월 을묘일에 화산도사 진원(眞源) 정소미를 대궐로 불러 들였다. 정소미는 복기로 수명을 늘린 데에 진박과 함께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정소미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에 뜻을 두고 있었고, 진박은 술을 좋아하고, 활달한 편이어서 지척 지간에서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하지 않았다. 정소미는 대궐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금단(金丹), 거승(巨勝), 남지(南芝), 현지(玄芝)등을 바치고 몇 달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정소미는 성격이 차분하고 고독을 즐겨 홀로 앉아서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초서와 예서에 능해 서도경(書道經) 500여권을 남겼으나 그 스스로 선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선생의 서법(書法)에는 선기(仙氣)가 종횡하고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이는 이 세상에서 손꼽힐 정도로 알아주는 도인이기에 내왕하는 사람들 중에 기인이사(奇人異士)들이 많아, 지극히 신기하고 희한한 색채가 풍부한 이야기를 많이 빚어냈다.
체도통감에서 언급하고 있는 송기(宋琪), 여동빈, 종리자(鍾離子), 호공(壺公),적송자(赤松子)등은 여러 차례 희이의 도관으로 찾아와 술을 함께 마시며 글을 짓곤 했다. 그리고 진강숙(陳康肅)과 공요자(公堯咨)의 남쪽 암자에서 있었던 일 등 이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가 지은 책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지현편 81장과 현문비요 그리고 조담집 외에 화산에서 저술한 삼봉우언(三峯寓言), 고양집(高陽集), 하락이수(河洛理數), 속입실환단시(續入室還丹詩), 선천무극도(先天無極圖)등은 하나같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고, 도문의 전적(典籍)으로 손꼽히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희이는 더욱 역학에 정통했다.
송나라 역사에서 극구 칭찬한 것처럼 그가 천지기운(天地氣運)과 세상사의 변천을 미리 알아내고, 미래의 길흉화복이나 재난 또는 이변을 점칠 수 있었던 것은 태반히 역학에 정통한 덕이었다. 가득승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선생은 배움과 수양의 종지(宗旨)를 위해 선천을 체(體)로 삼고 후천을 용(用)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무극을 체로 삼고, 태극을 용으로 삼는 한편 대역(大易)을 체로 삼고, 노장(老莊)을 용으로 삼고 있죠."
이 말은 지극히 요지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원복(李元復)은 시로 읊었다.
"희이를 찾기 위해 거처를 알아야 하고, 선천이 본향이란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백거이(白居易)의 시를 고쳐 쓴 것이지만, 지극히 정곡을 찔렀다고 하겠다.
또 아래와 같은 시도 있다.
"무극선천의 도는 궁색할 수가 없고 주전자 안에는 해와 달이 절로 영롱하고 세 별이 반쯤 세 봉우리 밖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화산이 빗질에 푸르게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 한 수도 현묘한 취향이 무척 풍요롭다.
선천과 후천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역경에서 볼 수 있다. 역건(易乾)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천은 하늘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후천은 하늘을 받드는 때인 것이다."
희이 선생이 전수하는 역학은 '선천역학'이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도는 세상에서 '선천도(先天道)'라고 일컫는 것이다. 소위 선천역(先天易)이란 바로 복희씨의 역이며, 간보주례(干寶周禮)의 태복삼역지법(太卜三易之法)이다. 이 주해는 아래와 같다.
"복희의 역은 소성(小成)을 선천으로 삼고, 신농(神農)씨의 역은 중성(中成)을 중천(中天)으로 삼으며, 황제(黃帝)의 역은 대성(大成)을 후천으로 삼고 있다."
노사(路史)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희씨의 선천은 신농씨가 역하여 중천으로 삼고, 신농의 중천은 황제가 역하여 후천으로 삼았다.
선생은 단도연양(丹道煉養)에 있어서 역시 선천을 중시하고 후천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선천도사'라고 일컫는다. 실제는 노자의 도이기도 하다. 그가 충방에 말한 바도 마찬가지였다.
"선천이란 것은 도의 체이고 후천이란 것은 도의 용이네."
그는 다시 말했다.
"천지의 만물이 형체가 생겨나기 전을 선천이라 하고, 천지의 만물이 생겨나 형체를 이룬 이후를 후천이라 하네." "배우는 것은 쓰자는 데에 있고, 근본을 세우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근본이란 것은 선천이기도 하다.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나고, 도가 생겨나 덕을 갖추는데 덕을 갖추면 만물이 다스려지는 걸세."
다음과 같은 천현자의 현문비요와 똑같다.
성인은 천지 만물과 사람인 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으며, 우주의 겉과 시작 및 죽고 사는 것을 한 가닥으로 보고 있다. 고로 천자와 같을 수 있고, 만물과 합해질 수 있는 한 사람인 나는 우주와 통하고, 끝과 시작을 관철하여 죽음과 생을 합친다. 그리고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 암암리에 무와 합해지고 허(虛)로 돌아가게 된다. 허라는 것은 하나의 남김이고, 무라는 것은 하나의 스스로 생겨난 것이다. 하나라는 것은 태극(太極)이고, 태극이라 하는 것은 천지의 중심이자 조화의 근원이로다. 무는 정말 없는 것이 아니고, 무 가운데 유(有)가 있다. 정말 무라면 천지는 어쩌면 거의 정지되고 말 것이다.
무극(無極)을 말하는 것은 하늘을 밝혀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니, 모두 뿌리를 무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지허지극(至虛至極)은 정(靜)이고, 지정지극(至靜至極)은 무이며, 지무지극(至無至極)은 움직임(動)인데 동하면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라는 것은 태극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극이란 것은 도로 볼 때 태극의 앞에 있으면서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 생겨나게 했으면서도 크지를 않고, 끊임없이 생겨나 묘하게 무형으로 화하면서도 신(神)이 되지 못하고, 시종 천지로 우주를 가닥으로 꿰면서도 오래가지를 못하며, 신통한 변화에 끝없이 묘하게 사용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 희이의 도가 크며 학문을 엿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가에 몸담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노자를 으뜸으로 받들며, 스스로 은둔하여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을 내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도에 누를 끼치게 되고 이득에 급급하면 충분히 몸에 누를 끼치게 되고, 알음(知)에 급급하면 족히 신(神)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누를 입을 것이 없고, 하나도 얽매이는 것이 없다면 얽매일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리하여 속세의 자물통에서 해탈을 얻게 되고, 조롱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고로 백거이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은둔을 익힐 적에는 시각에 등을 돌리고, 이름에 연연하면 도를 갈고 닦는데 방해되리. 몸밖으로는 노자를 으뜸으로 받들고, 사물을 다스림에도 장자에게 배워서 덕을 입더라. 소홀하고 방심하면 천 번의 걱정을 남기게 되고, 우직하면 한 쪽만 지키는 못난 짓을 행하게 되리라."
그는 또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현원(玄元) 황제는 남긴 글을 지었고 , 오각(烏角)선생은 우러러보고 뒤를 따르네. 금과 옥이 마루에 가득하나 내 물건이 아니고, 자손은 허물을 벗었다는 구실로 남이라 하네. 세상의 일들은 모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천하에 이 몸의 피붙이는 없더라. 다만 마땅히 아끼고 지켜야 할 몸뚱이 하나뿐이니 어름과 술이 심신을 덜 핍박하도록 하여라"
이 시는 노자의 최상승의 현지(玄旨)를 터득하지는 못했으나, 이로써 나중에 도를 배우고, 연단(練丹)의 처음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도가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 대체적으로 역시 그런 점을 입문의 곳으로 삼았다. 여기서 들어가야만이 세상 밖에 초연할 수 있고, 사물 밖으로 초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없는 것' 으로부터 다시 '내가 없는 것이 내가 있는 것' 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다시 '모두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으로부터 '현동경계(玄同境界)' 즉 '선천경계' 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범속한 경지에서, 성스런 경지로 들어서고 거룩한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들어서고, 다시 신의 경지에서 화(化)의 경지로 들어서서는 화와 더불어 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또 선생이 평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공부의 차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계에 든 사람은 자연히 홀로 우주 정신과 왕래할 수 있고, 홀로 조화정신(造化精神)과 소식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이 통함을 느끼고 신과 사람이 통함을 느끼기에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고, 신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기까지 모두 반드시 이 안에서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진실로 무를 천지의 시작이요, 만가지 덕의 어머니이고 만물의 기틀이고 만가지 법의 근본으로 삼아야 체와 용을 아울러 가질 수 있고, 조화와 함께 융합이 되는 것이다.
9. 송나라 이학의 선구자(上)
세상에서 희이학맥이라고 일컫는 이들의 전승(傳承)은 비교적 주된 것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무극도학(無極道學)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선천역학(先天易學)이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현문단학(玄門丹學)이라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학문의 요지는 그 요지로 인해서 북송과 남송 이학을 연효시가 되었다. 현문단학은 사실에 있어 무극도와 선천역에서 나온 것으로, 희이 선생이 따로 전한 학문인 것이다.
무극도는 본래 하상공(河上公)으로부터 전해진 것인데, 주렴계(周濂溪)가 얻어서 그 차례를 전도하고 태극도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더 보탰다. 따라서 주자는 비단 송나라 육자(六子)의 거두일 뿐 아니라 개조(開祖)라 떠 받들여지고 있지만 그 도는 사실상 희이 선생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소요부의 선천역학 역시 희이 선생이 전수하고 편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언제나 '진박 역학'이라 일컫는데 청(淸)역사의 왕부지전(王夫之傳)에서 바로 그와 같이 예를 들어 그렇게 칭하는 것이다.
그 전승의 계통은 황종염(黃宗炎)이 회목태극도변(晦木太極圖辯)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고찰해 보면 하상공의 본래 도(圖)의 이름은 무극도였는데 위백양(魏伯陽)이 얻은 후 참동계(參同契)를 저술했고, 종리권이 얻은 이후에 여동빈에게 전수했고, 여동빈은 나중에 진도남과 함께 화산에 은거했다가 진에게 전수했으며, 진은 이를 화산의 석벽에 새겼다. 진은 다시 마의도자(麻衣道者)로부터 선천도를 얻어서는 모두 충방에게 전수했다. 충방은 목수(穆修)와 승수애(僧壽涯)에게 전수했는데, 목수는 선천도를 이정지(李挺之)에게 전수했고, 이정지는 또 소천수(邵天 )에게 전수했다.
한편 무극도는 목수가 주자(周子)에게 전수했고, 주자는 또 승수애로부터 선천지지게(先泉地之偈)를 얻었다. 승수애의 선천지지게 원지(原旨)는 역시 진박과 충방의 일맥으로 이어져 온 것이었다. 무릇 선천의 가르침은 모두 역경과 노자로부터 나온 것이며, 진(秦)나라와 한나라 이후 방사(方士)와 도가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말해 왔지만, 역시 희이가 가장 먼저 그 비밀을 전했다. 그의 선천무극도는 가장 먼저 천치원 근원(根源)을 밝히고 만물의 끝과 시작을 추구하여, 단도의 연양(煉養)을 참고하여 극도로 화육(化育)을 자연스럽게 했다.
황종염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주자가 얻어서 그 차례를 전도하고, 더욱 그 이름을 바꾸어 대역(大易)에 덧붙여서는 유학자(儒學者)들의 비전으로 삼았다."
북송의 이정(二程)은 주자에게 사사한 바가 있었으나 얻은 바가 많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주자(朱子)가 송 이학을 집대성하여 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학(圖學)을 극구 설명하는데에 힘을 아끼지 않았고, 성인의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인정했다.
청나라의 주이존(朱彛尊)은 태극도수수고(太極圖授受考)를 편찬했다. 그 역시 그 그림의 전수는 진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그 원류(源流)를 거술러 올라가 보면 바로 당나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더욱 멀리 하상공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으며,
현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상공은 노자의 학문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무극도까지 전했다. 책은 남아 있는 데 그림은 고증할 길이 없다."
이 그림은 정성들여 전수함에 있어서 구결은 중시했기 글로 된 것은 없다. 선생때에 이르자 오래되어 없어지게 될까 봐 화산의 석벽에 새겼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멀리 퍼지고 끊임없이 후세로 전해지게 되었다.
주씨의 태극도수수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역학에 관해 언급을 했으나 태극도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도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방대동진원묘경(上方大洞眞元妙經)이 있어서 태극삼오지설(太極三五之說)을 저술했다. 그리고 당나라 개원(開元) 년간에 명황(明皇)이 서문을 썼다. 그런가 하면 동촉(東蜀)의 위기(衛琪)가 옥청무극동선경(玉淸無極洞仙經)에 주를 달고 무극과 태극의 여러 그림을 붙여 놓았다.
진자앙(陳子昻)이 보고 느낀바를 시로 읊었다.
태극에서 천지가 생겨나고 삼원(三元)은 더욱 폐해졌다가 일어났으며 가장 정묘한 생각이 이곳에 있는데 그 누가 삼오(三五)를 징벌할 수 있을까?
삼원은 본래 율력지음양지정지수(律曆志陰陽至精之數)이고, 위백양의 참동계이다. 초일(初一)은 현빈(玄牝)의 문이라 하고, 다음 이(二)는 정을 달구어 기로 화하도록 하고, 기를 달구어 신으로 화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삼은 오행(五行)이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오기조원(五氣朝元)이라고 한다. 다음 사는 음양의 배합으로 감(坎)을 취하고, 이(離)를 메꾸는 것이라 한다. 가장 위쪽은 신을 달구어 도리혀 비도록 하여 무극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무극도라 하며, 방사의 수련지술(修煉之術)인 것이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진박은 여암(呂 )에게 전수 받았고, 여암은 종리권에게 전수 받았으며 종리권은 위백양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위백양은 그 요지를 하상공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도가에서는 아주 거룩한 비전지학(秘傳之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원공이 취득하고, 바꾼 것 역시 둥글게 네 위치에 다섯줄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가장 윗쪽은 무극으로 태극이라 하고, 다음 이(二)는 음양 배합으로 양동음정(陽動陰靜)이라, 다음 삼(三)은 오행이 위치가 정해지는 것으로, 오행이 각기 하나의 성(性)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 사(四)는 건도성남(乾道成男)과 곤도성녀(坤道成女)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만물화생(萬物化生)이라고 한다. 이름은 태극도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무극의 요지를 없앤 것은 아니었다.
여러 유학자들이 헤아리고 넓혀 가는 등 설(說)이 많기에 남헌(南軒) 장(張)씨는 원공이 스스로 터득했다는 말을 하고, 직접 두 정(程) 선생에게 전수한 사람은 맹(孟)씨이래 없었다고 했다.
회암(晦菴) 주자(朱子)는 선생의 학문이 오묘한 점은 모두 태극이란 한 그림에 있다고 했다. 주자(周子)의 태극도설을 주자(朱子)는 특별히 주해를 달고 극구 칭찬해 마지않았으며 '천 명의 성인들의 비전지학을 얻은 것으로 공자 이후에는 다시없는 사람이다' 라고 까지 했다.
전조망(全祖望)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염계가 진실로 성인의 반열에 들 수 있으며, 두 정자(程子)는 그 학문을 전수받지 못했다."
허백운(許白雲)은 손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태극도는 원래 역경에서 비롯된 것이나, 앞서의 성인들이 그 뜻을 미처 밝히지 못한 점이 있었는 데, 주자는 대도(大道)의 정묘한 점을 탐색하여 붓을 들고 이 책을 완성한 것이다."
현진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자의 태극도는 원래 희이의 무극도에서 나온 것이고, 희이의 무극도와 선천수는 똑같이 원래는 역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자는 희이선생의 도서(圖書)의 전인이고, 소자는 수학(修學)의 전인이다. 희이의 학문은 이들 두사람에 이르러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 후세에 끊임없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적절한 표현이다. 역학은 중화 문화의 근원이고, 역도(易道)에 깊이 파고든 사람은 도가의 사람들이 으뜸이다. 희이 선생은 홀로 천고이래 도가의 비전지학을 얻어 전수했으니 유교와 도교에 문화적으로 이바지한 그의 공은 실로 얕거나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희이에게서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진 소자의 선천역수에 관해서 비단 도가의 책에서 많이 기록되어 잇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 역사의 소옹본전(邵雍本傳)에도 기록이 있다.
소옹은 자가 요부인데 그의 조상은 범양(范陽)사람이었다. 부친이 작고하자 형장(衡 )으로 이사갔다가, 다시 공성(共城)으로 이사를 갔다. 소옹의 나이가 30일 때 그는 하남(河南)을 유람하다가 선친을 이수(伊水)에다 장사를 지내게 되니 그때부터 하남 사람이 되었다. 북해(北海) 이지재(李之才)는 공성의 현령으로 있다가 소옹이 향학열이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소옹의 집으로 찾아가 물었다.
'자네는 물리성명(物理性命)의 학문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았는가?
소옹은 대답했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지재에게 사사했고, 하도낙서(河圖洛書) 복희(宓羲) 팔괘 육십사괘도상을 전수 받았다.
이지재의 전수에는 멀리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소옹은 가려진 부분을 탐색하고, 신계(神契)를 오묘하게 터득하여, 철두철미하게 심오한 점을 통달하고 익혀 바다와 같이 넓혀가 해박하게 된 것은 대체로 그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북해 이지재는 바로 앞에서 말한 이정지이다. 이정지는 목백수(穆伯修)에게 전수를 받은 것이고, 목백수는 충방에게 전수 받았으며, 충방은 희이 선생에게 전수 받았다는 것이 이 학맥의 원류이다.
황백가(黃百家)에서도 소자의 '선천괘도(先天卦圖)는 진박으로부터 전해진 것인데, 진박은 충방에게 전수하고, 충방은 이지재에게 전해진 것인데, 진박은 충방에게 전수하고, 충방은 이지재에게 가르쳤으며, 이지재는 선생( 소자, 소요부를 가르킴)에게 가르친 것' 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의 학문을 거슬러 올라가 그 사승(師承)을 캐어보면 실로 희이 선생이 전수한 것이다. 도문잡기(道門雜記)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희이의 정묘한 역학은 문왕(文王)의 후천 역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희의 선천역을 주장하고 있다. 거기다가 하락이수를 배합하여 선천상수지학(先天象數之學)을 열고 깊이 천지의 운화(運化), 음양의 줄어듬과 불어남, 기운(氣運)의 차고 비움 등의 세상 변화의 대수(大數)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금의 미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귀신처럼 모두 알아맞혔다. 그리고 선천도와 무극도마저 함께 충방에게 전수를 했고, 충방은 선생의 상수지학(象數之學)을 이지재에게 전수했으며, 이지재는 소옹에게 전수했는데, 모두가 불세의 빼어난 인재들이었다."
소요부는 맡은 일이 없었기에 두 번이나 추천을 받아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락선생(安樂先生)이라 호를 지어 자칭했다. 선천괘위도(先天卦位圖)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극경세(皇極經世), 이천계양집(伊川繫壤集), 관물편(觀物篇), 어초문답(漁樵問答)등의 작품을 지어 세상에 펴낸 바가 있다.
염계와 이정(二程), 횡거(橫渠), 회암 다섯 선생들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송육자(宋六子)로 받들여지며, 북송과 남송 이학의 커다란 줄기를 이루어, 유교와 도교를 한 도가니에 융합시켜 새로운 유학을 열고 세웠는데 그 근원을 따지면 실로 희이선생은 북송과 남송 이학의 비조(鼻祖)로 모셔져야 할 것이리라!
10. 송나라 이학의 선구자(中)
태극도를 전수하고 전수받은 원류에 관하여 이상의 여러 설 이외에도, 송나라 역사 유림전(儒林傳)의 주진전(朱震傳)에도 기록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주진은 경학(經學)에 깊은 연구를 하여 한상역해(漢上易解)가 있다. 그의 경연표(經筵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박은 선천도(先天道)를 충방에게 전수했고, 충방은 목수에게 전수했다. 그리고 목수는 이지재에게 전수했으며, 이지재는 소옹에게 전수했다. 반면에 충방은 하도낙서를 이개(李漑)에게 전수했으며, 이개는 허견(許堅)에게 전수했고, 허견은 범악창(范 昌)에게, 범악창은 유목(劉牧)에게 전수했다. 그런가 하면 목수는 태극도를 주돈이(周敦 )에게 전수했다."
목수가 태극도를 주자에게 전수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름까지 바꾸었는지는 고증할 길이 없지만 그 차례를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 것은 주자의 태극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은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자가 전수한 태극도의 그림은 희이 선생이 전한 무극도와 똑같다. 다르다면 설명뿐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도장(道藏)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도장의 상방대동원묘경품(上方大洞元妙經品)가운데의 선천태극도는 희이의 그림과 똑같았으며, 그 경(經)에 당 명황의 어질로 작성된 서문이 있는 것을 보면 당나라 시대의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동시에 도장 가운데 여순양의 팔품선경도(八品仙經圖)중의 제일품도(第一品圖) 역시 이 그림과 같다. 따라서 여동빈이 화산에서 희이에게 전수했다는 말은 당연히 믿을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동빈의 팔품선경도 중의 제일품도와 상방대동원묘경품 가운데 선천태극도를 현문단종(玄門丹宗)에서는 역시 무극도라 부르고 있다.
진치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천 태극이란 것은 바로 무극이다. 태극이 형태를 이루기 전의 흐릿하고 몽롱하여 아무런 판가름도 할 수 없고, 음양도 나누어지지 않는 혼원일기(混元一 )의 상태에서 형체도 없고, 모양새도 없으며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바로 무극이란 것이다. 또한 태극이라 할 수 있으니 그림은 그림이라 할 수 없고, 모양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없이 그저 한 무더기의 둥근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때 무극에서 태극으로 벋게 되었을 때 음양은 이미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 그림도 음을 등지고 양을 얼싸안게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태극이며, 또한 후천 태극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라 때의 위백양이 저술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상공으로부터 전수 받았다.'
백가(百家)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자(周子)의 태극도는 하상공으로부터 창시되었고..... 하상공 본래의 그림은 무극도라 이름했다."
하상공은 하사한 노자로부터 전수 받았고, 노자의 주가 달린 책자에는 지금까지도 편찬된 도본(圖本)이 남아 있으나 하상공이 주를 단 도덕경주(道德經註)에는 그림이 없다. 위백양의 참동계는 세상에서 단경왕이라고 칭하는데 원래 그림이 있었으나, 오늘날 거리에서 유행하고 있는 책에는 하나같이 삭제되었는데 누구에 의해 삭제되었는지 고증할 길이 없다.
모기령(毛奇齡)의 태극도유의(太極圖遺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동계의 여러 도안은 주자(朱子)가 주를 단 이후 많은 학자들이 삭제해 버렸다, 오직 팽본〔彭本ㅡ즉 팽사본(彭邪本)〕만이 수화광곽도(水火匡廓圖) 삼오지정도(三五至精圖) 등이 있다. 주염계의 태극도 가운데 제이도(第二圖)는 바로 참동계의 수화광곽도를 취한 것이다. 제삼도(第三圖)는 바로 참동계의 삼오지정도이다."
사실에 있어서 염계 선생의 태극도와 희이 선생의 무극도는 똑같아 지금도 바꾸어진 점이 없다. 다른 것은 다만 설명문에 있어서 그 차례를 전도했을 뿐이었다. 황백가에서는 무극도의 뜻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거슬러서 성단지법(成丹之法)을 밝히자는 것이다.
주렴계의 태극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며, 순리적으로 생인지설(生人之說)을 밝히자는 데에 있다니 가타부타 논할 수가 없다. 다만 궁극적으로 따질 때 희이 무극도의 오묘한 뜻은 천도(天道)를 밝히는데 있다는 것이다. 천도로 단도(丹道)를 가까이 하고, 거꾸로 갈고 닦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역(易)이란 바로 역수(逆數)이다. 노자의 철학 '반(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반환을 중시하여 모두 역용원리(逆用原理)《반용원리(反用原理)이기도 함》를 취하고 있으면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 받고, 하늘은 도를 본 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 받는다'는 말은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며 갈고 닦는 기본 원리이다.
주염계의 태극도는 인도(人道)를 밝히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인도를 바탕으로 해서 천도와 합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성사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단가(丹家)의 수련지설(修煉之說)을 모조리 버리고 도가의 상승지요(上乘之要)와 달리함으로 작은 술수에 속하는 것이지 대도(大道)가 아니다. 이는 황백가에서도 개탄하여 말한 바가 있다.
화산수은기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목수는 어릴 적에 충방을 따라 산으로 선생을 뵈러 온 적이 있으며, 한켠에 시립해 서는 등 태도가 무척 공손했다. 선생은 그를 보고 말했다.
'대체로 부귀를 추구할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신선이 될 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충방에게 말했다.
'용이 바다 밑으로 잠수하게 되면 오히려 낚시질을 걱정하나, 학은 구천(九天)으로 날아올랐을 때 어이 그물을 걱정하겠는가' 그리고 목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훗날의 그릇이로다. 모름지기 도를 가르침 받겠구나.' 나중에 목수는 끝내 충방의 전수를 받을 수 있었다.
목수로 말하면 송나라의 혼주(渾州)사람으로 자는 백장(伯長)인데, 진종때 진사출신으로 벼슬이 영주(潁州) 문학참군(文學參軍)에 올랐으며 나중에 채주(蔡州)로 이사갔다. 성품이 강직하고 박학다식하여 충방으로부터 도를 전수 받았으나, 명리를 모조리 떨쳐 버리지 못하고, 깊은 산 속으로 은둔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가 갈고 닦은 것은 충방만치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다. 희이는 관상을 잘 보았으며, 그의 말에도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고문(古文)을 깊이 파고들어 공부한 사람으로 한 때 글을 농하는 사대부들은 꼭 목참군을 내세웠고 목참군이 편찬하고 저술한 책들이 널리 보급되기도 했다. 도에 있어서는 다만 이지재에게 전수되었고 임종시에 당부했다.
"전수받은 바를 조신해서 갈무리해라. 너는 유명한 벼슬아치이나 이 도를 크게 일으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지재는 나중에 소요부의 이름을 듣고 몸소 찾아가 보고서는 기재라 놀라워했다. 그리고 전수받은 바를 모조리 전수했다. 소요부는 더욱 하나를 듣고 열을 헤아렸고, 현묘함을 깊이 파고들어 조예를 쌓았기에 언제나 홀로 오묘한 이치를 많이 터득할 수 있었다. 이개는 스스로 산원도인(散原道人)이라 서명했으며 충방과 함께 종남산에 은거하여 하락이수를 익혔다. 성격은 온화하면서 조용한 것을 좋아했고, 말이 적으면서 잘 웃지를 않았으나 선천(先天)대수(大數)를 헤아리는데 능했다. 한 때 허견에게 진박노조가 한 말을 비친 적이 있었다.
'하도(河圖)의 운행은 그 차례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왼쪽을 향해 돌면서 순리적으로 나가며 상생하고 있으나 그 맞은편의 위치와는 상극하고 있다. 상생하는 가운데 언제나 상극을 내포하고 있다. 무릇 조화의 오묘함은 새에 반드시 극이 있다는 것이고, 생하면서 극하지 않으면 생겨난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낙서의 운행은 그 차례가 북쪽에서 서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역행을 하고 또 상극을 한다, 그 맞은편의 위치와 상생한다.상극 가운데 항상 상생을 내포하고 있다. 무릇 조화의 묘는 극함에 반드시 생이 있는데 극하고서도 생하지 않으면 극한 것은 반드시 절멸하고 말 것이다." 또 다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지지간에는 무릇 모든 일이 상대상생(相對相生)하고 상생상극하면서 서로 의존하거나 굴복한다. 이득은 폐단에서 생겨나고, 해는 은(恩)에서 생겨나고, 화는 복에서 생겨나며, 복은 화에서 생겨난다. 한이득과 한 해는 순환하면서 되풀이하여 생겨나며, 멈추지를 않는데 성쇠와 질서 확립 여부 그리고 존망(存亡)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물(物)은 극에 달하도록 하면 안된다.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反)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이다."
희이의 이와 같은 3단계의 전수는 실로 하락과 역수(易數)의 정묘한 점들이 쌓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소자가 서술한 선생의 하락이수의 대체적인 요지도 마찬가지로 천도와 인도를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갖추자는 것이다.
하도낙서의 순행 역법과 상생상극한다는 점은 우주간의 일대 불멸의 진리요, 법칙이다.
일순일역(一順一逆), 일정일반(一正一反), 일동일정(一動一靜), 일생일극(一生一剋), 일음일양(一陰一陽), 일소일장(一消一長)등등은 서로 상대적이면서, 서로 의지하거나 굴복하는 것이다. 만물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상대적이면서 생겨나고, 서로 맞서면서 존속하고, 서로 잠기면서 체(體)가 되고, 그리하여 서로 반드시 용(用)이 되는 것이다. 순리적일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스를 때가 있고, 정면이 있으면 반면이 있기 마련이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심지어 하나의 '반우주(反宇宙)'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주는 '정우주(正宇宙)'라는 것이다. 순행하는 정우주가 있으면 반드시 역행하는 반우주가 있어야만이 제압과 평형의 효과를 무형으로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생극(生剋)과 동정(動靜)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만 하락의 정묘한 점은 특히 수(數)에 있다. 무극과 태극이란 학문은 이치를 밝히고, 하도낙서의 학문은 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염계는 도서(圖書)를 전했고 소자는 수학을 전했다. 두 사람은 북송과 남송의 이학에 하나같이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기상까지 엿보이게 했다.
이는 소자가 읊은 시와 같다고 하겠다.
"텅 빈 심경(心境)은 무엇에 비할 수 없이 큰데 진정 이와 같은 규모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의 성(性)은 하늘이고, 하늘은 나이니 조그만 곳에서 경륜을 일으키지 말 지어라."
이는 그 자신이 도를 닦는 중에 체득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읊을 수 없으리다.
도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크게 보고, 크게 지키기 때문에 자연히 부귀공명에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천지간에는 종종 마음을 안정시켜 신(神)이 한가하도록 하여 지극히 비고 정적만이 감돌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순후(純厚)를 기른 사람은 자연히 꼼짝하지 않고 맑게 텅비면서도 영검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리하여 천하의 사리를 똑똑하고 분명하게 보면서 미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헤아려 매사에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조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자연(自然)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결코 남 모르는 가운데 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나의 성(性)은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나이다.' 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비단 사람과 하늘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時空)마저 한 덩어리가 되고, 마음속에는 별천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11. 송나라 이학의 선구자(下)
안휘성(安徽省) 구화산지(九華山誌)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진희이 선생과 여동빈, 이기(利己), 장과로(張果老) 등은 때때로 구화산의 명승지인 자운관(紫雲觀)과 절강성(浙江省) 천목산(天目山) 자운관(紫雲觀)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물론 한결같이 희이 선생이 찾아와 머물 때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선생은 천지의 기운의 흐름을 내다보고 선천역수(先天易數)를 변화와 발전을 시켰으며,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대도(大道)를 밝혔기 때문이다. 소강절(邵康節)은 직접 이지재로부터 선생의 대역도술(大易道術)을 직접 전수받고 다시 하락의 원래 뜻에 의거하여 황극경세(皇極經世)를 저술하여 역리를 널리 세상에 퍼뜨리고 그 조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송나라 역사의 진박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화음의 은자인 이기는 스스로 당나라 개원(開元)년간의 중랑관(中郞官)을 지냈다고 했는데 정말 보기 드문 인물이다. 관서(關西)의 은자인 여동빈은 도술을 알고 있어서 백여세가 되었는데도, 동안(童顔)이며 발걸음이 가볍고 빨라 삽시간에 수백리를 갈 수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선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진박의 서재로 여러 번 찾아오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색다른 이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동빈이 진박에게 무극도등을 전수했다는 말은 결코 허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조연보(呂祖年譜)와 여조전서(呂祖全書)가운데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조전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옹희(雍熙)년간에 여조는 유해섬(劉海蟾)과 함께 화산에 놀러 왔다가 희이에게 양신연정출신결법(養神煉精出神訣法)을 가르쳤다..... 화산 높은 곳에 은거하고 사람(희이를 지적한 것임)은 연봉도사(蓮峯道士)로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칩룡법(蟄龍法)을 얻어 언제나 오래 잠을 자며 잘 일어나지 않았다. 여조와 유해섬이 종종 찾아오곤 했는데 여조는 그에게 시를 써 주었다.
'연봉 도사는 무척 고결하신 분으로 연궁(蓮宮)에서 내려오지 않고 세월을 보내더라. 별이 빛나는 밤에 절을 하느라 옥잠(玉簪)이 싸늘해지고 용호가 새벽을 여는데 금정(金鼎)이 뜨겁더라.'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양하여 잠으로 도움을 받는 도사가 되도록 격려했다......"
갑기(匣記)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여조는 화산에서 희이에게 삼원단법(三元丹法)과 선천은결(先天隱訣) 그리고 태상혼원무극도(太上混元無極圖)를 전수했다. 진박은 무극도를 석벽에 새기고 충방이 시중을 들 때 말해 주었다.
'이 도법(圖法)은 훗날 크게 성할 것이나 남(南)을 만나면 멈추게 될 것이지만 수(水)를 만나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은거하다가 밝혀라.'
단경(丹經)에는 태을혼원무극묘경(太乙混元無極妙經)이 실려 있는데 그 저자와 전인은 실전(失傳)되었다. 바로 선생이 전수한 무극도가 아닌지는 고증할 길이 없다. 두 같은 통서(通書)에 희이 선생이 충자(子)에게 한 말이 몇 줄 실려 있는데 뜻이 지극히 정묘하고 온전한지라 특별히 수록했다.
'천지는 무에서 무형무상과 있는 것도 없고, 이름도 없는 데서 시작되었다. 고로 도는 도라 할 수 없고, 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도는 전할 수 없으며, 전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선천에 '무'가 있고, 없을'무'도 없으며, 또한 '무무'도 없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이다. 하나는 바로 태극이다. 하나가 둘로 나누어져 음양이 판가름난다. 음양이 얽혀 셋이 생겨나고, 셋이 생겨나서는 차차 불어나 무궁에 이르게 되고, 만물이 나오게 된다.
무에서 나온 것은 원래 하나에 있었는데, 점점 많아져 만이 되고, 만은 다시 무로 되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만물은 하나로 근본을 삼고, 무로써 몸체를 만든다. 천지의 만물은 무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에서 나누어졌다.
역에는 태극이 있어서 양의(兩儀)가 생겨나니 곧 하나가 둘로 나누어 진 것이다. 양의에서 사상(四象)이 생겨나니 둘이 넷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사상에서 팔괘(八卦)가 생겨나니 넷이 여덟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다시 나누어 육십사(六十四)괘가 되어 괘는 서고 상은 그 가운데있다.
육십사(六十四)는 차츰 나누어져 무궁에 이르게 되니 수(數)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상수(象數)가 변화하니 기(幾)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가 움직여서 차고 비는 것과, 줄고 늘어나는 것이 보이니 이(理)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가 발동하여 길흉 및 인색함이 생겨나니 의(義)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가 드러나고 화복 존망이 두드러지니 문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고 발동하지 않았으매 움직이기 이전에 기는 볼 수가 없으니 신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신이 모지지 않고, 상이 몸체가 없으면 도는 무극이오. 수는 무궁하나 이치가 궁하면서 원래의 시작이 끝나려 하고, 몸체를 밝혀 융통성 있는 변화를 꾀한다면 역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역이 행해지고 선천지(先天地)의 중심이 보인다면 오묘한 조화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고, 몸체의 사물이 유실되지 않고 반응하는 사물이 손상을 입지 않으며 유구하면서도 무한하다면 도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는 희이 선생이 노자의 무자교(無字敎)를 전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노자는 첫머리의 요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는 천지 시작의 이름이고 유(有)는 만물지모(萬物之母)의 이름이다." 또 아래와 같이 말하기도 했다.
"항상 없는 것(常無)은 그 오묘함을 보자는 것이오, 항상 있는 것(桑楡)은 그 돌아다니는 것을 보자는 것이다." 노자의 귀근복명(歸根復命)과 귀진반박(歸眞返樸) 그리고 반박환순(返樸還醇) 등의 뜻은 모두 '무극으로 복귀한다'는 한 마디와 맞아떨어진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유에서 무로 돌아가고 무에서 유가 있게 되는데 유는 다시 무로 돌아간다. 이는 바로 도가의 우주론과 본체론(本體論)의 중심주지(中心主旨)가 있는 곳이다.
염계 선생은 이를 얻어 '무극이면서도 태극' 이라는 것과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로 발전시킨 것이다. 위의 글을 보면 단번에 희이 선생의 학지(學旨)와 일관(一貫)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태극도 설명문이란 한 편의 문장으로 유가의 우주론과 본체를 그리고 인성론을 세웠는데 오묘하게도 딱 들어맞으니 정녕 성인의 제자에 부끄럽지 않다.
따라서 천현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고로 성현의 갈고 닦는 방법은 전적으로 무라는 자에 의지하여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말하기도 했다.
"선천대도인 한 글자 무는 무심(無心)과 무의(無意)가 공부이다."
무심무의라는 것은 진짜 무가 아니라 무심의 마음, 무의의 뜻, 무념(無念)의 념(念), 무신(無神)의 신(神)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일에 응용하면 생각하지도 않는데 알고, 행하지 않는데 이르고, 닦지 않는데 얻어지고, 하지 않는데 이루어진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도법자연(道法自然)에 있으며 그 가운데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절로 알고, 저절로 이르고, 저절로 얻어지고, 저절로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화산수은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은 어느 날 명일(名逸 바로 충방)과 득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 한적이 있다.
'성인은 언제나 무심(註:각 도덕경에는 성인이 무상심(無常心)이라 되어 있음)하며 백성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는다.' 이는 바로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도인은 무상심하고 천지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는다' 고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의 욕심이 일어나기에 반드시 그 즉시 잘라야 한다. 천지를 보대 천지가 없고, 만물을 보대 만물이 없고, 사람과 나를 보대 사람과 내가 없고, 세상을 보대 세상이 없으면 이 마음은 절로 조용해져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유심이라 하더라도 무심과 같으니라!'
이는 도문의 무심법요(無心法要)이다.
도심(道心)은 바로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맑으면서도 두터운 마음이 무심의 마음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바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헤아리고, 일정하지 않게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오, 유심의 마음이다. 성인의 마음은 언제나 조용하고 반응을 해도 조용하며, 언제나 반응해도 언제나 조용하니 바로 참마음을 일에 쓰는 것이다. 범인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는데 반응할 때도 흔들림은 물론이고 반응을 하지 않는데도 흔들리니 바로 망령되이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마음의 머리를 자르데 바로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상념의 머리가 이는 곳에서 잘라 버려야 한다. 또한 희노애락이 발생하기 이전에 잘라 흔들리지 않고, 일으키지 않으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천경지(先天境地)라 무극경지(無極境地)인 것이다.
수행(修行)을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르면 공문(孔門)의 극기와 복례(復禮), 그리고 귀인(歸仁)으로부터 행해야 하는데 시작은 안자(顔子)의 사물(四勿), 즉 예의가 아니면 보지 말 것, 예의가 아니면 말하지 말 것, 예의가 아니면 듣지 말 것, 예의가 아니면 동(動)하지 말 것 등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경계하고 조심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히 어기지를 않고, 속에 접어두면 절로 지선(至善)의 경지에 머물러 순수한 한 조각의 천리가 흐르도록 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천심이기도하다. 고로 도를 닦는 사람은 여느 사람의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 것을 극력 피하고, 반드시 도심(道心)을 위주로 하여 먼저 그 도심을 밝히고 다시 그 도심을 간직하면 여느 사람의 마음이 가셔지게 되고, 여느 사람의 마음을 없앨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하기를 오래 하면 자연 순수하고 익숙해져 여느 사람의 마음이 가셔지면서, 도심으로 일에 임하게 되어, 절로 종종 반응하면서도 조용해질 수 있고, 항상 써도 항상 무가 될 것이다. 이는 바로 대성대신(大聖大神)에 안팎으로 하나가 되는 도인 것이다. 이 안팎이 하나가 되는 도는 또한 동(動)과 정(靜)이 하나로 합쳐지는 도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공부를 이러한 점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손을 쓸 곳이 없다. 거기다가 식색지성(食色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변화시켜 본연지성(本然之性)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여서는 위로 천지지성(天地之性)과 합쳐져서 오랫동안 조물주와 거닐겠다면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12. 서도(書道)는 천고의 신필(神筆)
가득승은 화산에서 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저희 선생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초인적이기 때문에 천지와 함께 클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나같이 붓의 기세가 엄청나고, 날카로우며 힘찬데다가 풍격(風格)이 험준하면서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선생님의 서화는 힘차서 뇌정만군(雷霆萬軍)의 기세가 있어서 붓이 오악(五嶽)을 뒤흔들어 놓은 기운이 있죠. 천지가 성실을 주입하지 않고 조화가 영기를 모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고금을 통털어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낳기가 어려웠을 것이오'
희이 선생의 서화는 유명하지만 그림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글씨도 지극히 드물다. 황룡산인(黃龍山人) 역시 '서법(書法)은 천고에 걸쳐 신품이라고 일컬어진다'고 선생을 칭송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생의 서법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확실히 진(秦)의 이사(李斯), 한(漢)의 채옹(蔡邕)과 장지(張芝), 위(魏)의 종요(鍾繇), 진(晋)의 왕희지(王羲之)와 왕헌지(王獻之) 부자, 당나라 초기의 구양순(區陽諄)과 우세남(虞世南) 그리고 저수량(저수량)( 遂良) 당나라 중기의 이옹(李邕)과 장욱(張旭) 그리고 안진경(顔眞卿) 등 여러 명필과 비교해서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다.
역대 명필의 서법은 하나같이 익혀서 도달할 수 있으나, 희이의 글은 신공(神功)을 얻었는지 독특하게 선인(仙人)의 운치가 있어서 배워 도달할 수가 없다. 근래의 인물인 강유위(康有爲)는 북위(北魏)의 명필들을 깊이 파고든 바가 있고, 한 때 선생의 서체를 배워보았으나 겨우 4, 5 푼 정도의 흉내만 냈을 뿐이었다.
선생의 서법 가운데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 남아 있어서 어떤 모양인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형산(衡山) 조항은(趙恒恩) 선생이 보존하고 있는 일련(一聯)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기에 구경하기가 어렵다.
경술(庚戌)년 가을로 접어들 무렵에 장대천(張大千) 마수화(馬壽華) 장유한(張維翰) 양한조(梁寒操) 하충한(賀庶寒) 등 십여명이 '진희이사당'을 건립키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갖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까스로 복사품을 이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으나 그 수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그 대련(對聯)은 다음과 같다.
개장천안마(開張天岸馬) 기일인중룡(奇逸人中龍)
보는 사람마다 감탄해 마지않았으며 확실히 성공신화(聖功神化)에 천조지설(天造地設)의 극치를 갖추고 있었다. 거기다가 커다란 기운이 맴돌고 기세가 용사(龍蛇)처럼 뻗쳐나니 천고의 신품이라고 칭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대련의 옆모서리에 명(明)나라 성조(成祖)때 국사(國師)인 불문의 도연(道衍)이 '희이선적(希夷仙跡)'이란 네 글자를 써 놓았다. 그리고 북송의 대서가(大書家)인 석연년(石延年)이 구경을 한 후 쓴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희이 선생은 사람들 중에서 용과 같은 인물이라. 하늘가에서 꿈에 동쪽으로 왕공(王公)을 쫓더라. 깊이 잠들었다 갑자기 깨어날 때 뼈마디까지 영험하여 손목과 손가락에서 갑자기 하늘 바람이 불어오더라. 난새는 넓은 사막에서 춤추고 봉황은 하늘을 누비는데 내려보니 왕희지나 왕헌지 모두 용렬한 일꾼이더라. 붓을 던지고 절을 하며 재간을 다 써먹었다고 말하고 태화와 소화라는 봉우리는 흰 구름이 가렸더라.'
시의 서명은 강정(康定) 경진(庚辰)년 12월 14일로 원래는 희이가 쓴 대련의 윗쪽에 붙여 있었다.
왕희지는 당나라 시대에 서성(書聖)이라 일컬어졌고, 왕헌지는 그의 일곱 째 아들로서 역시 서도에 능했다. 당나라의 장회관은 서예가들을 품평하여 차례를 정한 바가 있는데 초서에 있어서는 왕헌지를 왕희지 위에 올려 놓았었다.
그런데 석연년은 '굽어보니 왕희지와 왕헌지는 용렬한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지 말하니 이로써 어는 정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석연년은 자가 만경(曼卿)이고 송나라 송성(宋城) 사람인데 성격이 활달하고 의리와 지조가 있으며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는 한편 얼버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필력이 힘차고 명성이 드높기도 했다.
진종때 벼슬이 대리사승(大理寺丞)이었고, 인충때는 태자중윤(太子中允)으로 옮아갔다. 서법의 지위는 지극히 숭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왕씨를 희이 선생의 아래로 평하는 언사를 아첨으로만 볼 수 없다.
주문장(朱文長)은 묵지편(墨池編)에서 그의 서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경의 정서(正書)는 오묘한 경지에 들었고, 벽에 쓰는 글씨는 더욱 능하며 붓이나 종이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웅장하면서 수려하다'
진계유(陳繼儒)는 그의 큰 글씨는 천하에서도 오묘하다고 극구 칭찬하고 있다. 왕씨의 직방시화(直方詩話)에서 그의 서법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큰 글씨는 더욱 더 오묘하다고 했다. 더구나 구산사(龜山寺)에서 쓴 삼불명방(三佛名榜)이 가장 웅대하고 기이하다 했다.
이 방은 뚤뚤 말은 담요를 먹물에 찍어 쓴 것인데 글자가 크고 네모지며 일필지하에 쓰여졌다고 하여 사람들은 절필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소동파(蘇東坡)도 다음과 같이 평했다.
"만경의 큰 자는 클수록 더 기요하다"
장문잠(張文潛)은 시로써 칭송했다.
"빛나도다 삼불(三佛)의 방(榜)이여, 무쇠가 금석으로 만들어진 단추를 꿰뚫었네. 화려하고 우아한 방을 활짝 열리고 뭉뚝하니 실한 것이 산악처럼 두텁구나. 우물물은 용을 놀라 엎드리게 만들고 개미는 도관을 봉하고 천리마가 달려가는 것을 구경하더라."
정녕 글씨의 오묘함을 드러낸 시라 하겠다. 석연년이 죽자 범중엄(范仲淹)은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년의 필체는 안(顔)의 힘살에 유(柳)의 뼈를 하고 있으며 이 인간 세상에 흩어져 있으나 실은 신물(神物)과 같은 보배이다" 구양수(毆陽修) 역시 시로 읊었다.
"연년이 술에 취해 붉은 분가루를 칠한 벽에 썼고 벽의 분가루는 이미 바래지고 매연에 그을렸는데, 냇물은 기울어져 곤륜산의 기세가 꾸불꾸불하고 눈은 태화라는 높고 뾰족한 산봉우리를 누르는구나."
그의 명성이 자자한데도 희이 선생의 서법에 경도되고 승복하는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황룡도인(黃龍道人)이 '서법은 천고에 드문 신품'이라고 한 것도 결코 과찬이 아니다.
축가기학사(祝嘉嗜學史)에서 송나라의 서학(書學)을 논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희이의 책은 별로 퍼지지 않았지만 『개장천안마 기일인중룡』이란 바위에 새긴 글은 크기가 한 자 남짓한데 정말 석문과 비슷하여 산골짜기가 그 글을 볼 수 있다면 역시 저만치 피했으리라.' 석문의 글귀에는 본래 '용(龍)'자가 있었는데 본 받아서 쓴 '농( )'의 오른쪽에 있는 용 용자는 그 적필( 筆)이 정말 훌륭하여 절묘하다고 하겠다.
송나라 시대의 서예가들 가운데 그 정도로 신통광대(神通廣大)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드물다." 평한 말이 정말 그럴싸하다.
이 또한 선생의 글씨가 유독 산수의 맑음과 운치 및 천기의 영기를 특별히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용이 하늘에서 춤추듯 할 수 있었고, 조화를 능가할 정도가 될 수 있었다.
염로(髥老)는 계속해서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물건은 이문결(李文潔)이 얻었는데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소장하고 있던 건륭(乾隆)때의 비단으로 잘 꾸며서는 희(熙)에게 자세한 품평을 써 달라고 했다. 한 달이 되어 강장소(康長素)가 휴가를 떠났는데 고심해서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결이 죽자 그제야 돌아오게 되었으나 희의 대나무 상자 안에 또 2년간이나 방치되었다. 끝내 옥매화암(玉梅花庵)을 건조하는데 자금이 모자라 그만 오랜 친구인 이우(彛牛)에게 양도해 주게 되었다. 이 물건으로 말하면 문결과 장소 그리고 희가 보물처럼 여기고 애지중지 했다. 아무쪼록 친구가 잘 비장해 주기 바란다."
앞에 서명된 날짜는 계해 8월이고 이 발문의 서명 날자는 계해 10월로 되어 있다. 발문에서 언급된 문결은 바로 매암(梅 )으로 자는 홀정(笏定)이며 스스로 호를 천악초부(天嶽樵夫)라 하였다.
장소는 바로 강유위로 자는 경생(更生)이며, 장소는 바로 그의 호이다. 이우는 형상의 조항은 노선생이신데 종종 이우(夷牛)나 염우(炎牛)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위인됨이 담백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데 만년에는 더욱 노화순청의 경지에 접어들어 표일(飄逸)에 모습이 때 묻지 않은 자태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선풍도골이라 칭찬했다. 예서(隸書)에 능통하며 당대의 거자이었다. 희이선생의 이 대련이 쓰여진 서예폭을 국보처럼 여기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간직하고 있다. 경술(庚戌)년 봄에 이우 노선생은 희이 선생의 이 대련을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아 자금을 만들어 진희이 사당을 짓는데 기금으로 삼고자 했다.
그리하여 몸소 제(題)를 쓰고 기다란 발문을 작성했는데 옛날 빛이 깊고 힘차며 근엄하면서 수려한가 하면 날카로우면서도 빼어난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이치가 서려 있어서 오묘하기 이를 데 없는 듯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어딘가 붓놀림이 신들린 것 같다고나 할까!
그 발문은 아래와 같다.
"개장천안마 기일인중룡이란 붓글씨는 송나라의 진희이가 쓴 것이다. 이 대련을 보면 약 세 군데 기묘한 점이 있다.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송태조 조광윤(趙匡胤)이 용상에 않기 전에 화산에서 희이와 바둑을 두게 되었다. 이때 희이가 무엇을 걸겠느냐고 물었다. 태조는 농담삼아 화산을 걸면 어떻겠냐고 대답했다.
태조가 바둑에 지고 얼마 후 제위에 오르자 희이를 위해서 화산 일대의 세금을 면한다는 영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화산에서한 판의 바둑을 이겼노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기이한 점이다.
송나라의 서예가 만경 석연년이 『굽어보니 왕희지와 왕헌지가 모두 용렬한 일꾼이더라』라고 말했고, 청(淸)나라의 서예가 증농염(曾農髥)이시고, 어른이신 희는 더욱 『바로 고금의 서예가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라고 썼으니 서법이 기묘한 점이다. 그리고 대련의 글귀가 호기로워 가히 바위를 깨뜨리고 하늘을 놀라게 할 지경이니 말투가 기이한 점이다. 어쩌면 이보다 더 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강성한 나라가 서면 언제나 고인이사(高人異士)가 나타나 그 왕조를 점철하고, 강산을 빛내기 마련이었다. 말하자면, 한나라 광무(光武)황제의 엄자릉(嚴子陵) 당태종(唐太宗)의 규염객(?髥客)이 모두 그러하다.
이 대련은 나의 대나무 상자에 보존되어 온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래에 들어 장악군(張岳軍) 선생이 누차에 걸쳐 복사를 하도록 재촉을 하는 바람에 내 아들 불중(佛重)이 그 명을 받들어 인쇄를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반격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 대련을 내놓았으니 밝은 빛과 빼어난 기운은 마치 엄자릉 이나 규염객이 다시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것 같다. 이로써 국토를 되찾고 태평성대를 여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송나라 초기의 유명한 대련이 오늘날 다시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것을 희이 선생께서 아신다면 그분 역시 빙그레 웃을 것이다.
13. 화산처사의 잠자는 법
희이 선생은 무당산에 있을 때 녹피처사(鹿皮處士)로부터 수단결(睡丹訣)을 얻어 종종 한 번 잠들면 달포 남짓 일어나지를 않았다. 화산으로 은둔처를 옮긴 이후에는 다시 여동빈으로부터 '칩룡법(蟄龍法)'과 '구복계수단결( 復契睡丹訣)'을 전수받게 되었다. 따라서 잠자는 공력이 크게 증진하여 천고 이래를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화산수은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은 산에서 언제나 자는 것으로 은둔을 삼았다. 적게는 몇 달이고 크게는 일년 내내 일어나지를 않아 세상에서는 장수선옹(長睡仙翁)이라 불렀다."
어느 날 호공(壺公)이 선생을 찾아왔으나 선생은 한창 자고 있는 때라 오랫동안 만나 볼 수가 없었다. 여동빈은 그에게 말했다.
'박은 공을 만나고 싶지 않아 잠을 잠으로써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오' 그리고 다시 설명을 했다.
'박은 오래 자면서 깨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자면서 은둔을 하자는 것인데 아울러 내양(內養)을 수련하는 것으로 정말 자는 것이 아니오. 다만 구복계수단결( 復契睡丹訣)을 손에 넣은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잠 속에서 세월을 잊고 꿈을 꾸지 않아 많은 시름을 풀 수가 있다.
잠자는 지인(至人)은 꿈이 없다고 했고, 단(丹)을 수련하려고 잘 때는 꿈이 있을 수가 없으며, 잠을 잠으로써 영근(靈根)을 크게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몸을 안정시키고 다음에 그 마음을, 그리고 차례로 식(息)과 신(神)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거기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없고, 의(意)와 염(念)이 없으며 생(生)과 멸(滅)이 없어야 만이 반박전진(返樸全眞) 할 수 있다. 다만 단가(丹家)에서는 내련공부(內煉工夫)가 있기 때문에 선종(禪宗)의 선정(禪定)과 크게 다르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승입정(老僧入定)과 비교할 수 없으며, 소위 '구복계수단결( 復契睡丹訣)'도 선천태식법(先天胎息法)으로 풀이할 수 있는가 하면 '칩룡법'을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동물의 동면법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서양의 과학자들은 인류도 어떻게 하면 동물을 본받아 동면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창 연구 중이며, 동면과 같이 잠자는 법이 인류의 장생불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잠에 잘 빠져드는 것을 그저 신비하고 허무맹랑한 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동면에 비해 천지 차이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소요부 선생의 '천근월굴(天根月窟)'이란 시도 어쩌면 선생의 이와 같은 천고비전의 도맥(道脈)에서 유래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시를 살펴보자.
'이목이 총민하고 밝은 사내의 몸으로 태어났고 크고 더 높은 천부를 받아 가난하지 않더라. 달의 굴을 탐색하다가 가까스로 사물을 알았고, 천근(天根)을 밟아보지 못했으니 어찌 사람을 아랴. 건(乾)이 손(巽)을 만날 때 달의 굴을 보고 땅이 우레를 만날 때 다시 천근을 보더라. 천근의 달의 굴을 한가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니 서른 여섯궁(宮)이 모두 봄빛에 묻혔더라.'
이 시는 가장 풍부한 현기(玄機)와 신리(神理)를 담고있는 데다가 어둡고 난삽한 아름다움을 담뿍 지니고 있다.
역대에 걸쳐 풀이를 한 사람이나 집안(家)이 수백 수천이 넘었고, 제각기 멋진 풀이를 하고 있다. 만약 이 시에서 契入할 수 있다면 선생의 '구복계' 석 자에 실려 있으나 전수되지 않은 뜻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구복계수단결은 취적기에 그 이름이 남아 있으며 칩룡법과 함께 여조로부터 선생이 전수 받았다고 말했으나 요결은 실전되어 고증할 길이 없다.
칩룡법은 도가의 서적에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법은 다음과 같다.
'용이 원해(元海)로 되돌아가고 양(陽)이 음(陰)에 잠기니 사람들은 움츠린 용이라 말하지만 나는 움츠린 마음이로다. 묵묵히 건곤(乾坤)을 갈무리하고 참다운 숨쉼의 그침을 깊이 깊이 하니 흰 구름은 높다랗게 누워 있는데 세상에는 음(音)을 알아주는 이 없더라.'
여조는 희이를 '수선삼매(睡仙三昧)를 참으로 터득한 사람'이라 칭하면서, 한 수(律)의 시를 제하여 표시한 바가 있는데 여조전집(呂祖全集)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다. 시는 다음과 같다.
'높다랗게 베개 베고 종남산에 누웠으니 온갖 시름 쓰러지고, 수선(睡仙)은 흰구름속에 깊게 누웠더라. 꿈속의 혼은 몰래 크고 몽롱한 구멍으로 들어가고 참다운 숨쉼은 몰래 조화공(造化功)을 펼치네. 현묘한 요결에 혼돈이 갈무리 된 것을 뉘라서 알꼬. 도인은 먼저 바보와 귀머거리 되는 것을 배워야 하네. 화산의 처사가 잠자는 법을 남겼으니 오늘날 그 법을 제창하고 밝혀서 뭇 인사들을 깨우겠네.'
명나라의 육서성(陸西星)선생은 이를 위한 발문을 썼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혹자는 희이 선생이 따로히 이 세상에 전한 잠자는 요결이 있다고 말하나 전해진 것은 모두 가짜이다. 상사(象辭)에 따르면 '군자는 어둠의 안내로 즐거운 안식으로 들어간다' 고 되어 있는데 어둠의 안내로 즐거운 안식은 덮어두고, 즐거운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을 말해 보자. 그 묘한 점은 바로 들어갈 입(入)자에 있다. 입(入)은 바로 자는 법이다. 신(神)을 기혈(氣穴)로 들어 보내면 앉든 눕든 수공(睡功)을 취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높다란 돌멩이를 베고 자야 하는 것일까? 서른 두 자의 칩룡법은 더욱 더 사람으로 하여금 확연히 깨닫게 한다. 여옹(呂翁)이 보여준 것은 자비의 마음으로 바로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따로히 잠자는 비결이 세상에 전해졌다고 말하나 모두 가짜라고 단정한 것은 실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칩룡이란 한 방법은 확실히 지극히 현묘하다 할 수 있다.
화산수은기에서 현문오룡반체수공결(玄門五龍蟠體睡功訣)을 언급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다섯 마리의 용이 웅크린 채 잠잔다는 요결을 전한 사람의 성명이 남아 있지 않지만 모름지기 진희이선생의 칩룡법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취적기에 수록된 그 방법은 문장이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고, 방법은 간단하여 행하기가 쉬워서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많이 익히고 있다. 사천의 민산파 나문(羅門)에서 전수한 선천도수공(先天道睡功)은 구결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뿐 대체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나문이란 바로 희이의 법맥(法脈)에서 시작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선생이 전수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 구결은 아래와 같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되, 옆으로 누워 용이 똬리를 틀고 개가 웅크리듯 해서는 한 팔을 구부려 베고, 다른 한 손으로 배꼽을 어루만진다. 한 발은 뻗고 다른 한 발은 움츠린 채 건곤을 전도하여 신(神)을 가다듬어서 정적을 비춘다. 마음이 잠들기 전에 먼저 눈을 재운다. 성의를 앞세우고 그 후에 상념을 멈춘다. 마음을 극도로 비우고 정적을 두텁게 지킨다. 신기(神 )는 자연히 뿌리로 돌아가고 물과 불은 자연히 조화를 이룬다. 조식(調息)을 하지 않는데도, 숨은 저절로 조절되고 기(氣)는 굴복시키지 않는데도 기가 절로 굴복한다. 세차례 운행되어 돌고 돌아 극으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이 갈고 닦게 되면 칠조(七祖?)에서 복이 있게 된다.
진희이는 이미 형체를 화산에 남겼고, 장청하(蔣靑霞)는 왕옥산(王屋山)에서 허물을 벗었다. 장청하는 한때 백옥도인(白屋道人)으로 행세했으며, 남송시대의 종남산 사람이라 종남초부(終南樵夫)라고 서명하기도 했다. 종남산에 앉아 도를 삼십년이나 논했으나, 시나 글로 이름을 날리지 않으려고 원고를 대부분 태우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왕옥산의 접천단(接天壇)에서 우화(羽化)했다.
왕옥산은 산서성(山西省) 양성현(陽城縣)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가의 명승지이다. 산은 삼중(三重)으로 집처럼 생겼는데 전해지는 바로는 황제(黃帝)가 도를 묻던 곳이라고도 한다. 동쪽으로는 일정봉(日精峰) 서쪽으로는 월화봉(月華峰)이 있고, 가운데 흑룡동(黑龍洞)이 있으며 동굴 앞에는 태을지(太乙池)가 있다. 접천단은 산의 최고봉에서 구름을 찌를 듯 솟아잇다. 온 산은 풍경이 아주 훌륭한데 선인암(仙人巖)이라는 절벽은 천길이나 되고, 또 깊은 계곡을 굽어보게 되어 있어서 더욱 고즈넉하니 사람을 사로잡는다.
장청하는 희이에게 전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똑같이 여옹에게 전수를 받았는지를 알 길이 없다. 위의 글 끝부분엑서 두 분의 성명을 마구 부르는 점으로 미루어 두 분의 문인으로서 직접 전수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나문의 구결은 무극으로 되돌아간다는 한 마디로 끝난다. 이 밖에도 세상에는 또 다른 전해지는 글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실로 취적기에 실린 구절처럼 비교적 상세하면서 깊이 파고들지를 못하고 있다.
체도통감에 따르면 희이가 서화(西華)에 거처할 때 대체로 산 아래에 사는 최고(崔古)와 왕래를 했다. 금려(金礪)라는 자가 있었는데 최고의 소개와 추천으로 선생을 만나 뵙게 되고 잠자는 도를 듣게 되었다. 선생은 속세의 사람들이 대체로 '명리(名利)와 성색(聲色)에 그 정신과 분별력(神識)이 어지러위지고, 달짝지근한 술과 기름끼 많은 비린 것들로 마음과 뜻이 혼란되어 입도(入道)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말도 했다.
"만약에 지인(至人)의 잠이라면 그렇지가 않다. 금식(金息)에 보류하고 갈무리하며 옥액(玉液)을 마셔서 넣어둔다. 금문(金門)은 튼튼하여 열리지 않고, 토호(土戶)는 닫혀져 열 수가 없다. 창룡(蒼龍)은 동쪽 궁(宮)을 지키고, 청호(靑虎)는 서쪽 실(室)에 누워 있으니, 진기(眞氣)는 단지(丹池)에서 운행되고, 신수(神水)는 오장육부에서 순행하는지라 갑정(甲丁)을 불러 그 시각에 당직을 서도록 하고 허령(虛靈)을 불러 그 실(室)을 지키도록 하더라. 더군다나 한 번의 상념으로 빛을 되돌려서는 신혈(神穴)을 비추도록 한다. 마음과 상념을 잊음으로써, 마음과 상념을 끊게 되고 마음과 상념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절로 성공신화(聖功神化)의 경지로 초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시를 내렸다.
지인(至人)은 본래 꿈이 없고, 그 꿈은 바로 유선(遊仙)이니라. 진인(眞人) 역시 잠이 없고, 잠이란 뜬구름이오, 연기니라. 화로 안에는 언제나 약이 보존되어 있고, 주전자 안에는 별천지가 있으니 꿈속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인간이 가장 현묘하더라."
이 외에도 수단결(睡丹訣)을 말하는 시나 구결이 적지 않지만 미처 모을 수가 없었다. 다시 체도통감의 기록을 살펴보자.
단공(端拱) 원년의 어느 날 문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년 중원(中元)이후 아미를 유람할 것이다. 이듬해 문인들을 장초곡(張超谷)으로 보내 바위를 뚫게 했다. 그리고 태화의 바위를 찔렀으나 이 골짜기가 더욱 아름다우니 내가 이 곳에서 돌아갈 것인가? 하고 말했다.
그 즉시 죽기 전의 마지막 상주문 초안을 잡았다. 내용은 대략 신하인 자기의 수명이 다해 거룩한 황조(皇朝)에 연연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어느덧 금년 섣달 스물이틀날 연화봉 아래에 있는 장초곡에서 화형(化形-둔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상주문의 초안을 잡았으나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득승을 보내되 거북과 두루미 그리고 안장을 갖춘 말을 끌고 대궐 안으로 들여보냈다. 위에서 홀로 오랫동안 상주문을 읽었다.
예전에 선생에게 내렸던 유물들을 다시 가득승에게 내리고 자색 옻까지 보태어 오진(悟眞)이라는 호까지 하사했다. 뿐만 아니라 오백만 전의 돈을 내려 북극전을 준공토록 해서는 선생의 유지(遺志)를 완수하도록 했다.
선생이 우화하게 되었을 때 기이한 향기가 석실 안에 감돌았으며, 때가 되자 왼손으로 턱을 고인 채 임종하였다. 이레가 되어도 그 안색이 변하지 않았고, 지체(肢體)에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거기다가 오색 구름이 그 골짜기 입구를 막아 버렸으며 한 달이 차도록 흩어지지 않았다.
향년 1백 78세로 그 도관의 일을 승계 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정의 사자가 아미산으로 가서 여전히 선생을 뵈올 수 있었다는 일은 역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기하고 전설과 같은 업적은 각 종교사에서도 비슷하게 다 나오는 이야기인지라 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終
출처 : http://egloos.zum.com/butte11/v/853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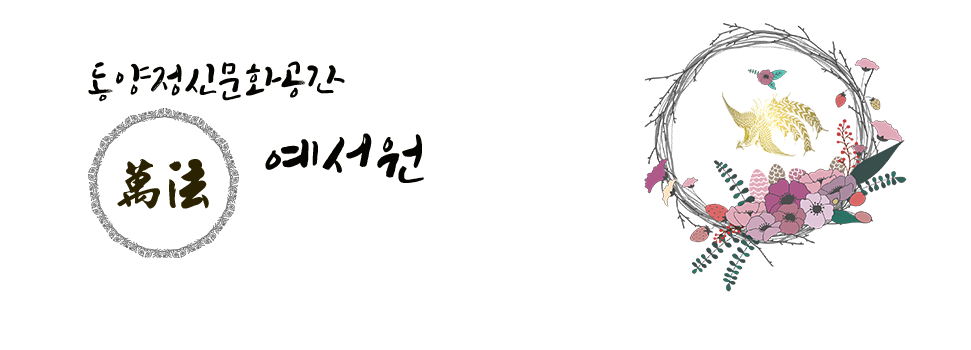
'기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천도룡기 2019 로 보는 불교 가르침의 포인트 (0) | 2020.02.14 |
|---|---|
| 삼경법의 홍연기문둔갑 태을옥녀법(太乙玉女法) (0) | 2020.02.13 |
| 티벳에서 전해지는 12지 생년에 따른 타고난 칠요일의 길흉(吉凶) (0) | 2020.02.08 |
| 바즈라다카 금강공행화공정장법(金剛空行火供淨障法) (0) | 2020.02.07 |
| 까르마파의 기초 사가행강의 (0) | 2020.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