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시설(三尸說)과 수경신(守庚申) 신앙
Ⅰ. 머리말
도교와 관련되어 전파된 민간 신앙 가운데 守庚申 信仰이 있다. 이 수경신 신앙은 三尸說에 바탕을 둔 司過信仰의 한 형태이다. 삼시는 三彭 또는 三蟲이라고도 부른다. 삼시는 사람의 몸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죄상을 낱낱히 기록하였다가 두 달 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 밤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그간에 인간이 지은 죄를 낱낱히 고해 바쳐 그 죄과 만큼 수명을 감하게 한다는 신적 존재이다. 그런데 이 삼시는 반드시 사람이 잠든 뒤라야 몸을 빠져 나갈 수 있었으므로 아예 삼시가 하늘에 올라가 죄과를 보고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신일 밤을 뜬눈으로 새우는 수경신의 습속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이 수경신 신앙에 대한 민속 방면의 연구 성과는 과문의 탓이겠으나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헌 기록만으로도 고려 이래로 조선조까지 왕실에서 민간에 걸쳐 널리 행해졌던 민속 신앙의 한 형태였음은 분명하다. 본 발표는 이 삼시설, 또는 수경신 신앙의 연원과 삼시의 실체, 옛 사람들의 이에 대한 인식을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행해진 수경신 신앙의 구체적 모습을 역사 자료와 문집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경신 신앙의 존재양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성립도교가 존재치 않았던 한국도교사의 전개상에서 민간도교의 잠재적 영향력을 가늠해 볼 마련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삼시설의 유래와 수경신 신앙
후한 葛洪의 《抱朴子》에 이런 기록이 보인다.
어떤 이가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장생의 도를 닦고자 한다면 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포박자가 말하였다.
"금해야 할 것 가운데 지극히 급히 할 것은 손상하지 않는데 있을 뿐이다. 《易內戒》와 《赤松子經》및 《河圖記命符》에 모두 말하기를, 천지에는 인간의 허물을 관장하는 司過神이 있는데 사람이 범하는 잘못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그 算을 빼앗는다. 그 算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은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자주 우환과 만나게 되고, 算이 다하게 되면 사람은 죽는다. 算을 빼앗는 것과 관계된 일은 수백 가지가 있으므로 일일이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또 말하기를, 몸 가운데는 삼시가 있는데 삼시라고 하는 것은 비록 형체는 없으나 사실은 영혼이나 귀신의 부류이다. 사람을 일찍 죽게 하려는 것은, 이 三尸가 그래야만 마땅히 귀신이 되어 스스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제사지내는 것을 흠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매번 경신일이 되면 문득 하늘에 올라 司命에게 아뢰어 사람이 행한 바 과실을 말한다. 또 그믐밤에는 부뚜막신[竈神] 또한 하늘에 올라가 사람의 죄상을 아뢴다. 큰 것은 紀를 빼앗는데, 紀라는 것은 3백일이다. 작은 것은 算을 빼앗는데, 算이란 것은 3일이다. 나 또한 이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능히 알지 못한다."
위 인용을 통해 볼 때, 삼시는 귀신의 부류로서 사람의 몸속에 깃들어 산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야만 비로소 사람의 몸을 떠나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서 그 허물을 司命에게 고자질하여 수명을 단축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 기록을 통해 삼시에 관한 언급이 《易內戒》나 《赤松子經》, 《河圖記命符》 등 초기 도교 경전 속에 이미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갈홍이 언급하고 있듯, 이미 한나라 때에는 인간이 지은 죄상을 감찰하며, 그 경중에 따라 수명을 단축시키고 질병과 우환을 가져오는 司過神의 존재를 믿는 司過信仰이 형성되어 있었고, 인간과 司過神의 중간에 三尸와 神, 즉 부뚜막 신 등이 있어 그 과실이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믿었다.
갈홍이 인용했던 《河圖記命符》의 언급을 보자.
三尸의 물건 됨은 실제로는 혼백이나 귀신의 무리이다. 사람을 일찍 죽게 하려는 것은 이 三尸가 그래야만 마땅히 귀신이 되어 스스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제사지내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번 六甲이 다하는 날에는 문득 하늘로 올라가 司命에게 사람의 罪過를 여쭌다. 허물이 큰 것은 사람의 紀를 빼앗고, 허물이 작은 것은 사람의 算을 빼앗는다. 그런 까닭에 신선 되기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三尸를 제거하고 담백함을 즐기며 욕심을 없이하고, 정신은 고요하고 마음은 밝게하여 많은 선행을 쌓고나서, 이에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어 신선이 된다.
三尸의 제거가 신선이 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시를 없애려면 먼저 마음을 담백하게 하고 욕심을 덜어 없애며, 정신은 고요하고 마음은 밝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많은 선행을 행하여 積善立功한 뒤에 마지막으로 服藥을 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여 삼시가 몸에서 제거되고, 마침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河圖記命符》의 이러한 언급은 삼시에 대한 초기의 인식을반영하고 있다. 이는 후대의 경전에서 보다 상세하게 부연된다. 북송의 張君房이 엮은 《雲笈七籤》에도 三尸에 관련한 기록이 있다.
항상 경신일에 밤새 잠자지 않으면 下尸가 서로 맞서 죽여서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 경신일에 밤새 자지 않으면 中尸가 서로 맞서 죽여서 돌아오지 않으며, 그 다음 경신일에 밤새 잠자지 않으면 上尸가 서로 맞서 죽여서 돌아오지 않는다. 三尸가 모두 없어지면 司命은 死籍에서 이름을 지우고 長生錄에 올리고, 올라가 天人과 더불어 노닐게 된다.
守庚申을 세 번 거듭하면 그때마다 각각 下尸와 中尸, 그리고 上尸가 서로 싸워 죽여서 마침내 三尸가 박멸되고, 이에 따라 사람은 死籍에서 이름이 지워져 長生錄에 오르게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天人과 더불어 노니는 신선의 경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그 原注에는 "혹 6월과 8월에는 庚申日이 특히 아름다우므로 마땅히 하루 종일 저녁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한다. 세 번 守庚申을 하면 三尸가 없어지고, 일곱 번 守庚申을 하면 三尸는 영구히 사라진다"고 조금 달리 적혀 있다.
이러한 착종된 언급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년이면 두 달에 한 번씩 여섯 차례나 꼬박 꼬박 돌아오는 경신일마다 밤을 새우기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守庚申을 줄곧 하다가도 어느 날 한 번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간의 모든 죄과가 한꺼번에 司命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적지 않았을 터이다. 이에 따라 三尸를 영구 박멸해야 한다는 관념이 생겨나 세 번을 거듭하거나, 일곱 번을 거듭하면 삼시를 영구히 驅除할 수 있다는 의식이 일반화 되어 간 사정을 위 기록은 말해준다.
그렇다면 三尸는 왜 경신일 밤에만 활동하는가? 위 《河圖記命符》에서는 삼시가 단순히 '六甲窮日'에 활동한다고 하였는데, 梁 陶弘景은 그의 《眞誥》에서, "무릇 경신일에는 尸鬼가 마침내 난동을 부려 정신이 산란하고 깨끗치 못한 날이다. 마땅히 깨끗이 齋戒하고 그 날을 경계하여 대비하며 여러 욕심부릴만한 일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즉 경신일 밤은 육갑이 끝나는 날이면서 三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져, 이에 따라 정신이 躁穢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다. 뒤에 전문이 제시된 조선 후기 辛汎의 〈守庚申說〉에서는 術家의 말을 빌어 "庚이란 것은 '更'이요, 申이란 것은 '伸'이니, 때문에 이날이 되면 온갖 귀신들이 하늘에 조회한다."고 적고 있다.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언급인데, 庚申이란 곧 '更伸'의 뜻으로 천상에 올라가 경신일은 온갖 귀신들이 '다시금 펼' 힘을 얻는 날이라는 것이다.
앞서 《雲笈七籤》에서는 三尸를 다시 上尸와 中尸, 그리고 下尸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른 명칭이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구분도 여러 기록에서 찾아진다. 《玉樞經注》에서는 上尸의 이름을 靑姑라 하고, 중시는 白姑, 下尸는 血姑라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도 《中黃經》에서는 上尸는 腦宮에, 中尸는 明堂에, 下尸는 腹胃에 있다고하여 《운급칠첨》과는 조금 다르게 적고 있다. 《太上三尸中經》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上尸는 이름이 彭倨인데 보물을 좋아하고 사람의 머리 속에 있다. 中尸는 이름이 彭質이니 五味를 좋아하며 사람의 뱃속에 있다. 下尸는 이름이 彭矯인데 色慾을 좋아하며 사람의 발 속에 있다.
또 《歷代神仙通鑒》에서는, 삼시라는 것은 하나는 靑姑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을 가로 막아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며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이가 빠지게 만든다. 둘은 白姑라 하는데 사람의 오장을 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기운을 위축되게 하며 잘 잊어 버리고 근심에 빠지게 만든다. 셋은 血尸라 하는데, 사람의 위장을 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뱃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뼈가 마르고 살이 타게하여 의지를 솟아나지 않게하고 생각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끔 만든다.
고 하였다. 또 《太淸玉冊》에서는 위 여러 언급들을 종합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上尸인 彭倨는 이름이 靑姑인데 사람의 눈을 가로 막아, 사람의 머리에 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많게하여 수레와 말을 좋아하게 만든다. 中尸인 彭質은 이름이 白姑이니, 사람의 오장을 해쳐 사람의 뱃속에 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가벼히 성내고 분노하게 한다. 下尸인 彭矯는 이름이 血姑인데, 사람의 위장과 수명을 가로 막아, 사람으로 하여금 색을 좋아하고 살생을 기뻐하게 만든다.
이로 보면 三尸는 단순히 인간의 죄과를 기록할 뿐 아니라, 인체의 특정한 부위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物慾과 食慾 그리고 色慾 등을 부추겨서 죄과를 짓게끔 만드는 魔物이다. 이러한 三尸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논의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활발해져 道士의 수행에 있어 三尸의 驅除 박멸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까지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앞서 守庚申을 세 번 혹은 일곱 번 거듭하면 삼시를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 외에도 삼시를 영구 박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들은 三尸가 사람 몸속의 穀氣에 의지해서 살고 있으므로, 만약 사람이 五穀을 먹지 않고 곡기를 끊게 되면 삼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게 되어 마침내 삼시를 없앨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 도교 수련에서 불에 익힌 오곡을 먹지 않는 辟穀이 장생을 위한 중요한 수련의 하나였는데, 이 또한 三尸의 구제와 관련이 있다. 또 《太淸中黃眞經》에는 "언제나 담박함을 지킨다면, 三尸는 절로 없어진다"고 한 언급도 있어 욕망의 제거만으로도 삼시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 견해도 있다. 이밖에 葛洪의 《抱朴子》에는 三尸를 박멸할 수 있는 단약의 구체적인 제조 방법이 나오는데, 송 葉夢得의 《避暑錄話》에도 服藥의 방법으로 三尸를 죽여 없앤다는 언급이 보인다.
이렇듯 三尸에 대한 언급은 초기 도교 경전에서부터 기록되어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수경신 신앙이 얼마나 폭넓게 숭신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경신 신앙은 漢代의 讖緯思想이 神仙思想과 결합하여 司命과 司過의 개념이 道敎에 전입되면서 생겨난 관념이다. 이른 바 禍와 福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感應의식과 司過信仰이 보편화 되면서 勸善의 목적을 바탕에 깔고 신앙 의례로 자리 잡았다. 수경신 신앙은 특히 당송대에 이르면 도사나 승려, 儒者는 물론이고, 민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유행되었다. 한편으로 守庚申의 의식이 일반화 되면서 점차 遊樂化의 경향까지 나타내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정신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 葉夢得의 《避暑錄話》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나라 말에 조정의 인사들이 종남산 太極觀에 모여 守庚申하는 것을 보고 程紫 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 스승께서 이를 빌어 나쁜 짓 하는 자를 두렵게 하려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침상에 걸터앉아 베개를 달라고 하며 시를 지어 대중에게 보여주고는 붓을 던지고 우레와 같이 코를 골았다.
도사 程紫 의 이러한 일화는 唐末 수경신 신앙이 얼마나 일반화 되어 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부 도사 계층에서조차 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 정도였던 것이다. 정자소가 대중에게 주었다는 시는 다음과 같다.
수경신 하잖아도 또한 의심 없음은 不守庚申亦不疑
이 마음 항상 도에 의지 하기 때문이라. 此心常與道相依
옥황상제 하마 벌써 내 행동 아시거니 玉皇已自知行止
네깟 삼팽 마음대로 시비를 말하려무나. 任汝三彭說是非
옥황상제야 굳이 三尸의 고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히 꿰뚫어 보고 있으니,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지켜 道와 더불어 하나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까짓 三尸 쯤이야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수경신의 습속은 초기에는 도교의 도사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레 행해지던 것이, 당송대에 이르러 민간에까지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것은 勸善의 효과도 있었으므로 불교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守庚申會를 조직하는 등 폭넓게 행하여졌다. 당나라 柳宗元이 〈罵尸蟲文〉에서, 보이지 않는데서 허물을 살펴 사람을 해치는 三尸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음험한 음모로 뜻있는 선비를 해치는 교활한 무리들을 교묘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은 삼시설이 당시 일반에까지 확산되어간 형편을 잘 말해주는 예이다.
Ⅲ. 삼시설의 東傳과 수경신 신앙의 성행
三尸說에 따른 守庚申 신앙의 확산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불교나 神道와 습합되면서 민간 신앙의 중요한 한 형태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존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수경신 신앙은 언제 전래되었을까? 삼국시대에 이미 도교가 전래되었으므로 수경신 신앙 또한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헌 근거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기록을 통해 볼 때, 고려 예종조를 전후하여 도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장려되면서 본격적으로 수경신 신앙이 일반에까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경신 신앙의 성행은 《高麗史》 권 26, 元宗 7년(1266) 4월 庚申日條의 기사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포착된다.
태자가 安慶公을 맞아다가 연회를 열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새벽까지 밤을 새웠는데 그때 나라의 풍속에 道家의 말에 의하여 매년 이 날이 되면 반드시 모여서 밤새껏 술을 마시며 잠을 자지 않았다. 이것은 이른바 守庚申이란 것이다. 태자도 역시 당시의 풍속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인데 당시 여론이 이를 비난하였다
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미 고려 중기에는 왕실 뿐 아니라 온 나라에서 수경신이 행해지고 있었고, 왕실의 태자마저 수경신을 행하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 사실을 적은 것이다. 더욱이 이때는 이미 수경신 신앙의 습속은 다분히 유락화 되어 밤새 술 마시고 즐기는 민속으로 자리잡아 갔음을 위 기록은 보여준다.
논자는 고려 왕실에서 수경신 신앙이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사》 본기에 보이는 경신일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고려사》에는 경신일 기사가 모두 240회에 걸쳐 나타난다.
이 가운데 수경신과 직간접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적지 않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위 240회의 기록 가운데 전후 11회에 걸쳐 나타나는 죄수 재심사 및 석방에 관한 기사이다. 유독 경신일에 투옥된 죄수를 재심사하여 석방 또는 감형해주는 사면 조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이 수경신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삼시충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고자질하는 날인 경신일에 도리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積善立功함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상대적으로 상쇄코자 하는 심리의 반영으로 읽힌다.
또 무려 27회에 걸쳐 경신일에 왕이 사찰로 행차한 기록이 나타난다. 굳이 이날 대궐에서 지내지 않고 사찰로 행차한 기록이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수경신 신앙이 불교와 습합되어 나타나는 한 증좌로 보인다. 三尸가 죄과를 고자질하는 것을 부처의 힘을 빌어 봉쇄코자 한 심리의 반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지어, 경신일 기사 가운데서 대궐 또는 사찰에서 연등회나 각종 도량 등의 법회가 열렸다는 내용이 20차례에 걸쳐 나온다. 八關會 百高座道場 燃燈會 百座仁王道場 摩利支天道場 四天王道場 功德天道場 消災道場 華嚴神衆道場 三界醮祭 華嚴三昧懺道場 등이 이날 열린 각종 법회의 내용이다. 그 구체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지만 대개 자신이 지은 죄과를 참회하고 재앙을 멀리 물리쳐 달라는 바램과 관련된 의식으로 보이며, 이렇게 볼 때 이 또한 수경신 신앙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논자의 판단이다.
이밖에 경신일 기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왕이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이다. 모두 21 차례 보인다. 특히 이날에는 수 만명의 승려들에게 음식을 내리거나, 行旅에게 밥과 국을 먹였으며, 國老와 평민 늙은이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다. 특히 외국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사도 여러 차례 보여 눈길을 끈다. 경신일에 연회를 베풀었다 함은 이날 밤을 새우며 수경신 의례를 행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위 원종 7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태자까지 별도로 연회를 베풀어 음악을 연주하면서 새벽까지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했던 것이다.
《고려사》 경신일 조 기사 총 240회에서 수경신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는 모두 90회 안팎에 이른다. 정리하면, 경신일이 되면 왕은 절로 행차하거나 별궁으로 거처를 옮겨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재앙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법회를 성대하게 열었고, 승려나 행려 및 조정 대신들에게 음식을 하사하거나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였다. 또한 죄수를 재심사하여 석방하거나 감형하는 것도 주로 경신일에 이루어졌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의식이 모두 불교와 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경신 신앙이 불교와 습합되는 양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은 이 방면 연구자에게 미루기로 한다.
《고려사》의 경신일 기록에서, 고려 초기에는 수경신과 관련지을 만한 내용이 별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10대 靖宗 때부터 관련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여, 특히 숙종과 예종 이후로 충렬왕대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후로는 뜸한 편이다. 따라서 고려 왕실에서 수경신 의례가 본격화 되는 것은 숙종 예종 연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예종은 아예 고려를 도교 국가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었고, 중국에 도사의 파견을 요청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교를 장려했던 임금이었다. 이렇듯 《고려사》 관련 기록의 검토만으로도 우리는 수경신 신앙이 고려사회에 얼마나 폭넓게 숭신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왕실의 사정이 이와 같았을진대 민간에서의 성황은 대개 헤아리고 남음이 있다고 본다.
조선조에 들어서도 守庚申의 습속은 계속되었다. 수경신 행사는 점차 유락적 성격을 띄게 되면서 그 규모와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東閣雜記》에는 태조가 庚申日 밤에 鄭道傳을 비롯한 모든 공신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기사가 실려 있고, 또 이러한 행사를 두고 왕과 신하들 사이에 격렬한 논난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 예로 성종 17년 11월 丁巳日에는 경신일을 사흘 앞두고, 왕이 경신일에 종친들과 연회를 베풀며 수경신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사헌부 장령 李季男이 왕에게 불가함을 논하자, 왕은 경신일 밤에 종친을 접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祖宗朝 이래로 있어온 일이니 다시 거론치 말라고 하는 기사가 있다. 또 연산군 3년 11월 경신일 기사에서도 왕이 술과 안주, 虎皮와 角弓 등의 물건을 하사하면서, 오늘이 경신일이니 함께 守夜하며 장난삼아 노름이나 하라 하자, 대사헌 李 등이 여항의 豪俠兒 들이나 숭상하는 수경신을 승정원에서 하게 함이 부당하니 그만두게 할 것을 간하였으나 왕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연산군은 그뒤로도 경신일 밤에 군신들에게 賓廳에 모여 守夜토록 하면서 직접 시를 내려 화작하게 한 일도 있었다.
조선조 궁중에서의 수경신 행사는 영조 때 가서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말하자면 고려 중기 이래로 왕실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진 수경신 행사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행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이 시기에 와서 수경신 의례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이밖에 《조선왕조실록》 경신일 기사만 분석하더라도 우리는 조선조에 들어서도 수경신 신앙이 얼마나 성행했던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미처 여기까지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조선 후기 辛汎의 〈守庚申說〉이란 글이다. 자료제시를 겸하여 전문을 옮겨 본다.
옛부터 속어에 이르기를, "사람에게는 三彭이란 귀신이 있어 해마다 上庚申日 밤이 되면 그 사람이 자는 틈을 엿보아 하늘로 올라가 그 사람의 선악을 옥황에게 고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상경신일을 지키며 잠자지 않는 사람이 많다. 마치 종남산 태일관에 朝士들이 모여 守夜하던 것 같음이 많다. 그러나 程紫 가 홀로 지키지 않고서 시를 지어 말하기를, "옥황상제 하마 벌써 내 행동 아시거니, 네깟 삼팽 마음대로 시비를 말하려무나."고 하였으니 통달한 견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습속은 더욱 심하니, 아아! 학함만을 하늘에 고한다면 혹 두려워 할 만 하겠지만, 선함도 하늘에 고한다면 어찌 두려워 함이 있으랴! 그렇다면 이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악을 지음이 많고, 선을 행함이 적은 자일 것이다.
術家가 말하기를, "'庚'이란 것은 '更'이고, '申'이란 것은 '伸' 즉 펴는 것이니, 그런 까닭에 이 날에는 여러 귀신들이 하늘에 조회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년 여섯 차례의 경신일이 모두 그러한 것이니 상 경신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갖 귀신이 다 그러하니, 한갖 내 몸에 있는 三彭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어찌 반드시 유독 상경신일만을 지키며, 어찌 반드시 홀로 내 몸의 三彭만을 지키겠는가? 先儒가 三尸를 꾸짖으며 논하기를, "달 밝은 밤에는 三尸가 하늘에 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갖 여섯 번의 경신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년 중 달박은 밤이면 庚申이 아님이 없으니, 어찌 능히 모두 지켜서 잠들지 않겠는가? 하물며 천지의 귀신은 어느 날이고 임하지 않은 날이 없다. 내가 올라가면 곁에 있는 이에게 물어보기만 해도 나의 선악은 알 수가 있으니, 경신일의 三彭을 기다릴 것이 없고, 또한 달 밝은 날의 온갖 귀신을 기다릴 것도 없다. 삼백 예순날에 6일이 있다 해도 경신일 아님이 없고, 또 한 달 밝은 날이 아님이 없을진데, 설혹 능히 삼백 예순날을 모두 지킨다 해도 가리워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삼백 예순날 동안 저지른 악을 단 하루 경신일 밤을 지킴으로써 가리워 막고자 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삼팽으로 하여금 나의 선행을 고하게 하여 하늘이 이미 먼저 알게 한다면 내가 기뻐할 것이 없겠고, 내 악행을 고하게 하여 하늘이 이미 먼저 알게 한다면 내가 두려워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어찌 守庚申을 함이 있겠는가?
이 글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단락의 程紫 이야기는 앞서 본 葉夢得의 《避暑錄話》의 기록을 옮긴 것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접어 들면서는 경신일을 모두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번거로움을 피해 上庚申日 즉 한 해의 첫 경신일에만 守夜하는 것으로 관습화 되어간 점을 이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庚申日을 취음으로 '更伸'의 의미로 새겨,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가 조회하는 날로 해석한 것은 흥미로운 해석이다. 전체 내용은 守庚申 의례의 허탄함을 비판한 것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조선 후기까지도 수경신 의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경우, 이 수경신 신앙은 민간 신앙의 일부로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江戶시대에 특히 성행하였고, 平安시대에는 公家貴族들이 '庚申御遊'를 행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일본 전국에 걸쳐 매우 많은 수효의 庚申堂이 현전하고 있고, 신앙 행위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 신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흔히 경신당에는 三猿, 즉 세 마리 원숭이를 모셔 두었는데 이는 일본만의 독특한 수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굳이 원숭이를 그린 것은 庚申日의 '申'이 원숭이인데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후첨 그림에서 보듯이, 이 원숭이들은 각각 눈과 귀와 입을 가려서 각각 不見 不聞 不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간이 지은 죄과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달라는 바램을 여기에 얹은 것이다.
정리하면, 수경신 신앙은 당초 중국 도교가 참위사상과 결합하여 司命과 司過의 개념이 도교에 들어 오면서 생겨난 신앙 형태였다. 이것이 점차 불교와 습합되고, 민간 신앙의 형태로 확산되면서 특정 종교나 계층을 떠나 광범위하게 의례가 일반화되어 신앙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중기 이래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상하간에 널리 성행하였고, 일본에서는 江戶 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민간 신앙의 한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
Ⅳ. 漢詩를 통해 본 守庚申 신앙
수경신 신앙는 왕실에서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널리 행해졌으므로, 제가의 문집 에는 守庚申과 관련된 한시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먼저 고려 말 遁村 李集(1314-1387)의 〈念惜一首呈諸君子〉란 작품을 살펴 보기로 하자.
지난해 山寺에서 庚申日 밤에 去年山寺庚申夜
단란히 모여 흐르는 세월 아쉬워 했지. 團欒共惜歲月流
사경이라 산 달빛 환히 비치고 四更山月照炯炯
골짝에선 솔바람 솔솔 불어 왔었네. 萬壑松風鳴
입정에 든 고승은 묵묵히 말이 없고 高僧入定默不語
사미는 차를 달여 香煙이 자욱했다. 沙彌煮茗香烟浮
함께 놀던 손님들은 모두 儒者들로서 同遊賓客盡儒雅
술 한잔에 시 한수로 즐거이 노래했지. 一觴一詠爲歡謳
그때 있던 두 사람은 兩府에 올라 있고 當時二公今兩府
남은 사람 누에 올라 애오라지 근심 푸네. 餘子登樓聊消憂
돌아올제 바라보니 터럭 아직 검은데 歸來相顧頭尙黑
흰 머리의 나만이 한 언덕을 지킨다오. 白首吾今守一丘
만났다간 헤어지고 기쁘다간 슬픈 인생 聚散悲歡幾時極
언제나 등촉 밝혀 산 속에서 놀아보리. 更期秉燭山中遊
이 시에서 우리는 경신일 밤에 儒者들이 山寺에서 佛僧과 함께 앉아 道敎의 守庚申을 행하는, 말 그대로 三敎合一의 현장을 목도하게 된다. 하지만 一觴一詠하는 遊樂의 거나함이 있을 뿐 여기에서 특별히 신앙적 의미를 찾아 내기는 어렵다. 다음은 徐居正(1420-1488)의 〈庚申夜題寄吳同隣〉이다.
계절 변화 새로워짐 문득 놀라니 入眼偏驚物候新
새해의 즐거운 일, 경신일이로다. 新年樂事又庚申
새벽녘 창가에선 매화 눈을 보내오고 五更窓送梅花雪
하룻밤 술동이 열어 댓닢 봄 맞이하네. 一夜樽開竹葉春
젊은 첩은 잠 안자며 웃고 얘기 다투지만 小妾不眠爭笑語
늙은이는 병이 많아 탐욕과 성냄 끊었노라. 老夫多病絶貪嗔
오늘 밤 이웃의 일 떠올려 생각하면 想知此夕同隣事
부부가 마주 않아 술잔 자주 따르겠지. 相對細君穩酌頻
어느새 해가 바뀌고, 경신일을 맞았다. 3구에서 '五更窓'이라 했으니, 이미 시인은 밤을 꼬박 새우고 해뜰 무렵을 맞고 있다. '梅花雪'과 '竹葉春'이 정신을 쇄락케 한다. 소첩은 곁에서 잠시도 가만 있지 않고 웃고 떠들며 이야기 한다. 깜빡 잠들지 않으려는 안간힘인게다. 그러나 늙고 병든 나는 이미 탐욕과 성냄 따위는 이미 끊어 버려 三尸의 고자질을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웃에 사는 벗 또한 그의 아내와 술잔을 마주 놓고 도란도란 얘기하며 이 밤을 지새우는 광경을 떠올렸다.
아이들 둘러앉아 庚申日을 지키니 兒曹環列守庚申
떡 과일 앞에 두고 웃고 떠들며 장난치네. 餠果前頭戱 頻
곁에서 박수치며 즐거운 일 함께 하니 拍手傍觀同樂事
늙은이도 참으로 그 가운데 사람일세. 老翁眞是箇中人
북소리도 더디어라 오경을 알리는데 更鼓遲遲已五
백년 인생 이와 같이 잠깐 사이 지나가리. 百年如此轉頭過
이웃 닭 홰쳐 울자 숲 까마귀 흩어지고 隣鷄叫罷林雅散
동창에 새벽 날 빛 환해옴이 반갑고야. 喜見東窓曙色多
陽谷 蘇世讓(1486-1562)의 〈庚申夜〉 4수 연작의 첫수와 넷째 수이다. 둘째 수에서 결코 三彭이 두려워 守夜함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경 북소리에 동창이 밝아옴을 기뻐하고 있다. 위 시에서 보듯 守庚申은 점차 老少間에 어우러져 즐기는 同樂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 庚申日은 두 달에 한 번은 어김없이 찾아오니, 守庚申은 말하자면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會飮하는 잔치의 구실로 되었던 것이다.
작은 벌레 어찌하여 상제의 존귀함 어지럽혀 微蟲寧 上帝尊
인간 세상 허탄한 말 떠들썩 하게 했나. 多事人間誕語喧
한 밤중 즐거이 노님 널리 얻어서 博得中宵歡樂地
붉은 등불 곳곳마다 좋은 술잔 마주 했네. 紅燈處處對芳樽
洪聖民(1536-1594)의 〈庚申〉이란 작품이다. 三尸說의 허탄함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도, 곳곳에 紅燈을 밝혀 놓고 술잔을 기울이느라 떠들썩한 광경을 설명하고 있다. 선조조 당시에도 守庚申의 습속은 신앙적 의미가 자못 변질된 채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 또 그는 〈庚申夜病中偶吟〉이란 작품에서
피리 불고 노래하며 병든 몸을 위로하니 兒把笙歌慰病身
오늘밤이 경신일이라 말들을 한다. 人言今夜是庚申
柳宗元의 교묘한 문장 없다고 해도 非關柳子文章巧
늙은 눈 잠이 안와 새벽까지 앉아 있네. 老眼難眠坐到晨
이라 하였다. 병든 몸임에도 오늘 밤이 경신일이란 말을 듣고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앉아 있다. 그러면서도 늙어 잠이 안오기 때문이지 三尸說을 믿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유종원의 문장을 거론함은 그의 〈罵尸蟲文〉을 염두에 둔 것이다. 李 光(1563-1628)도 〈庚申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세모에 멀리 나그네 되니 歲暮遠爲客
하늘가 근심겨운 병든 몸일레. 天涯愁病身
흐르는 세월은 丙午年을 맞이하고 流年將丙午
庚申日 맞이하여 긴밤을 지새운다. 守夜又庚申
곧은 도리 평소에 사모했건만 直道居常慕
홀로 누워 외론 등불 벗을 삼는다. 孤燈臥獨親
三彭이야 까짓것 두려울 것 없도다 三彭何足
내 마음 일 저 하늘이 훤히 아시니. 心事在蒼旻
당시 그는 함경도 안변부사로 임지에 머물고 있었다. 타향에서 병든 몸으로 맞이하는 세모에 두서 없는 시름은 그만 잠을 앗아가고 말았다. 때 마침 庚申夜니 徹夜의 핑계로도 그만이 아닌가. 直道를 잃지 않으려 늘 마음 쏟았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軒冕의 명예 아닌 가물거리는 孤燈 뿐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굳이 자신의 不眠을 三彭이 두려워서는 아니라고 변명한다. 이렇듯 儒者들의 한시에서 三彭을 두려워 함은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자의식이 발로된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듯 守庚申은 거의 관습화 되어 사람들은 별다른 신앙적 신념 없이도 守庚申 의례를 행하였고, 유락화된 守庚申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았다. 金孝元(1532-1590)의 〈守庚申錄懷自嘲兼寄諸生〉은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한다.
경신일 밤 잠 안자고 꼬박 새우니 守得庚申夜
三蟲이 하마 벌써 없어졌더냐. 三蟲已伏不
사람들 삼충을 두려워 하니 人而畏三蟲
생각하매 부끄러움 견딜 수 없네. 思之堪可羞
진실로 그 마음이 거울 같다면 誠使心似鏡
물듦에 꾀이는 바 되지 않으리. 不爲染所誘
설령 103 마리 벌레가 있다해도 縱有百三蟲
또한 장차 어찌 두려워하리. 亦將何所
그럴진대 한밤중에 잠을 푹자고 然則夜而寐
닭 울어도 마음은 편안하리라. 鷄鳴湛心慮
어찌하여 일상 이치 거꾸로하여 胡爲反常理
한밤에 앉았다간 새벽에 자나. 夜坐還晨睡
그대에게 나의 말을 부쳐 보노라 寄語二三子
이제부턴 착한 일에 힘을 쏟아서, 從今勉 切
치우치지 않음을 기약해둘뿐 唯期履不頗
左術은 숭상치 말으시게나. 莫敎崇左術
무심히 남들 하는대로 守庚申을 하다가는 自嘲의 생각이 떠올라 시로 지은 것이다. 마음을 거울같이 깨끗이 닦아 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三尸 아니라 百三尸가 있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데도 마음 닦을 궁리는 않고, 常理를 뒤집어 밤에 안자고 아침에 잠을 자니 이것이 무슨 짓이냐는것이다. 守庚申을 노래한 한시는 매우 많다. 일일이 다 예거하기에 겨를하지 못하거니와, 미처 보이지 못한 시인과 작품명만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成俔(1439-1504), 〈庚申日如晦平佇正叔可畏携酒慰余〉,《虛白堂集》 권 8, 장 38b(《총간》 14-p.298).
李胄(1468-1504), 〈庚申夜〉, 《忘軒遺稿》 장 1a(《총간》17-p. 489).
金安老(1481-1537), 〈庚申日觀兒曹守夜〉, 《希樂堂集》 권 4, 장 69a(《총간》21-369).
嚴昕(1508-1553), 〈庚申夜與隣友會于松堂〉, 《十省堂集》 상권, 장 36b(《총간 》32-p.506).
盧守愼(1515-1590), 〈庚申夜病睡〉, 《蘇齋集》 권 3, 장 13a(《총간》 35-p.201).
金孝元(1532-1590), 〈庚申夜寄諸生〉, 《省菴遺稿》 권 1, 장 2b(《총간》 41-p.336).
李廷 (1541-1600), 〈庚申夜有感三首〉, 《四留齋集》 권 2, 장 14a(《총간》 51-p.260).
沈喜壽(1548-1622), 〈庚申夜書懷示嚴翰林惺〉, 《一松集》 권 3, 장 20a(《총간》57-p.212).
申欽(1566-1628), 〈庚申日寄南 〉, 《象村稿》 권 18, 장 8a(《총간》 71-p.477).
李民宬(1570-1629), 〈守庚申〉, 《敬亭集》 권 7, 장 21b(《총간》 76-p.309).
李民宬(1570-1629), 〈次白沙庚申韻〉, 《敬亭集》 권 7, 장 21b(《총간》 76-p.309).
李植(1584-1647), 〈庚申夜會話戱述〉, 《澤堂集》속집 권2, 11b(《총간》 88-p.206).
李景奭(1595-1671), 〈庚申日口號却寄李汝省令公時 十一月也〉, 《白軒集》 권6, 장 14b(《총간》 95-p.449.).
李景奭(1595-1671), 〈守庚申〉, 《白軒集》 권 12, 장 30a(《총간》 95-p.545).
이밖에도 발표자가 미처 찾아보지 못한 작품들이 더 많을 것이다. 표제에 守庚申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작품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효는 상당하리라고 본다.
Ⅴ. 맺음말
이상 道敎와 관련된 민간 신앙의 일종인 守庚申 신앙에 대해 일별해 보았다. 먼저 三尸說의 연원과 三尸의 실체를 중국 각종 문헌 기록의 검토를 통해 살펴 보았고, 이어 三尸說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되어 신앙화 되어간 경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하는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고려사》의 검토나 각종 문집 자료에 실려 전하는 守庚申 관련 한시의 존재로만 보더라도 수경신신앙이 고려조에서 조선조에 걸친 수백년 동안 위로는 왕실에서 아래로는 지식인, 승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숭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그 자취는 소멸되었지만, 어쨌든 수경신 신앙은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선인들의 인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 여타 문집 자료에 전하는 기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경신일 기사의 확인 작업을 보탠다면, 수경신 신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도교의 영향력은 흔히 간과되거나 지나치게 평가절하 되어 왔다. 그러나 성립도교를 갖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도교는 기층으로 스며들어 세계관, 우주관, 사생관 등 세계 인식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인식 체계로 자리잡아 왔다. 守庚申 신앙만 하더라도 비록 遊樂化 되어 종교적 의미에서 변질을 가져오지만, 이러한 변질은 도교적 신앙 사유가 얼마나 뿌리 깊이 체화되었던가를 일깨워주는 한 방증으로 될 뿐이다. 향후 수경신 신앙과 관련하여 도교와 불교의 습합에 관한 부분 등, 종교학 방면의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연구를 기대해 본다.
(수도자 필독)
* 청장관전서 9책, 47쪽에 보면 삼시의 항목이 있다. 이중 몇 가지는 본 논문 속에 녹여서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
출처 : http://egloos.zum.com/pasj/v/114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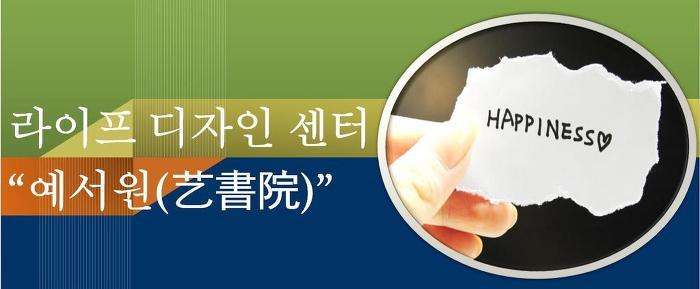
'기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경신일(庚申日) ~ 수경신(守庚申) (0) | 2020.07.28 |
|---|---|
| 수경신에 대해 참고할만한 글 몇가지 (0) | 2020.07.27 |
| 성명규지의 태식결(胎息诀) ~ 태아의 숨쉬는 비결 (0) | 2020.07.25 |
| 간단한 전신지압과 미용기공 (0) | 2020.07.24 |
| 도덕경 독송수행법 (0) | 2020.07.23 |




댓글